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서평입니다.

<괘씸한 철학 번역>은 ‘왜 철학이 어려운가’라는 질문에 대해 남다른 각도에서 답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독자가 철학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철학 자체의 난해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말 번역이 이해하기 쉬운 한국어를 활용한용어가 아닌 기존 일본 학자들이 번역한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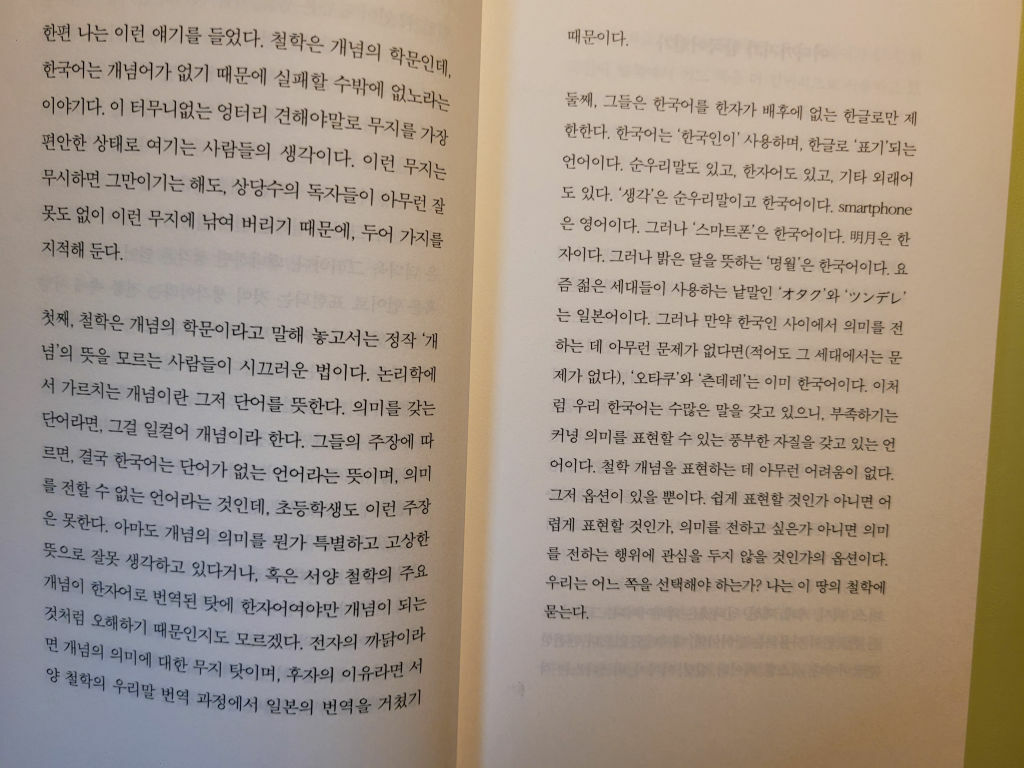

철학 번역은 단어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사유의 구조를 옮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 구조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보여줍니다. sensitivity를 ‘감성’, perception을 ‘감지’라 번역한 관행이 실제로는 철학 개념에 대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은 단어 하나가 사유 전체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실감하게 합니다. 특히 ‘감수성’이나 ‘포착’처럼 일상 언어와의 접점을 늘리려는 제안은 일반 독자 입장에서 철학을 자신의 언어로 끌어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순수이성비판> A판 서문을 기존 철학 용어 대신 평범한 우리말로 번역한 부록은 이 책의 논지를 실감할 수 있는 대표 사례입니다. 독자는 그간 무심코 넘겼던 철학 문장이 새롭게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되며, 철학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실은 ‘낯선 번역’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책은 철학이라는 추상적 영역이 결국 언어를 매개로 이뤄진다는 점 그리고 그 언어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묻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번역이 철학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인문학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여전히 거리감을 느끼는 독자들에게 읽을 만한 문제 제기를 담고 있습니다.
#괘씸한철학번역 #코디정 #순수이성비판 #이소노미아 #북유럽 #북유럽서평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