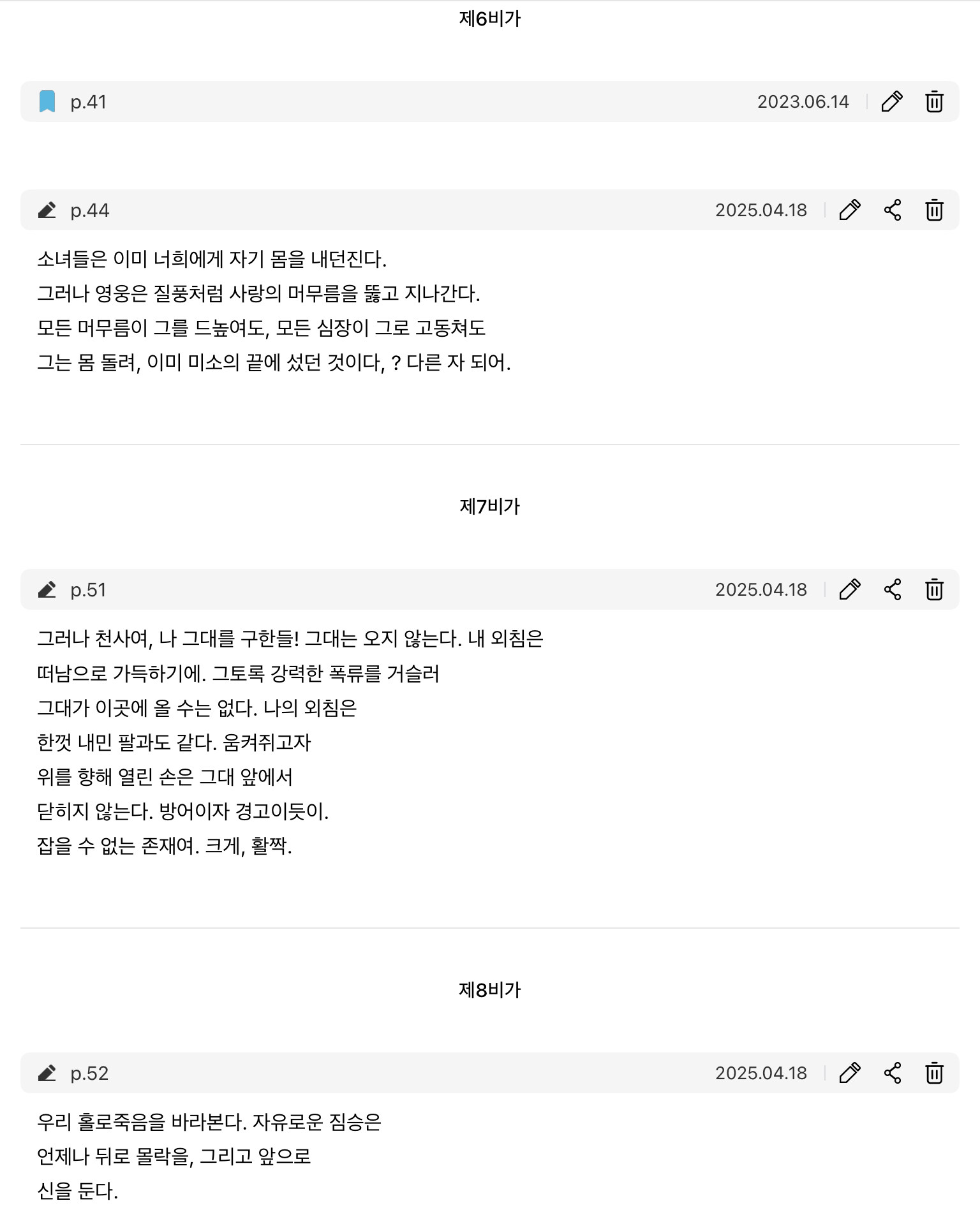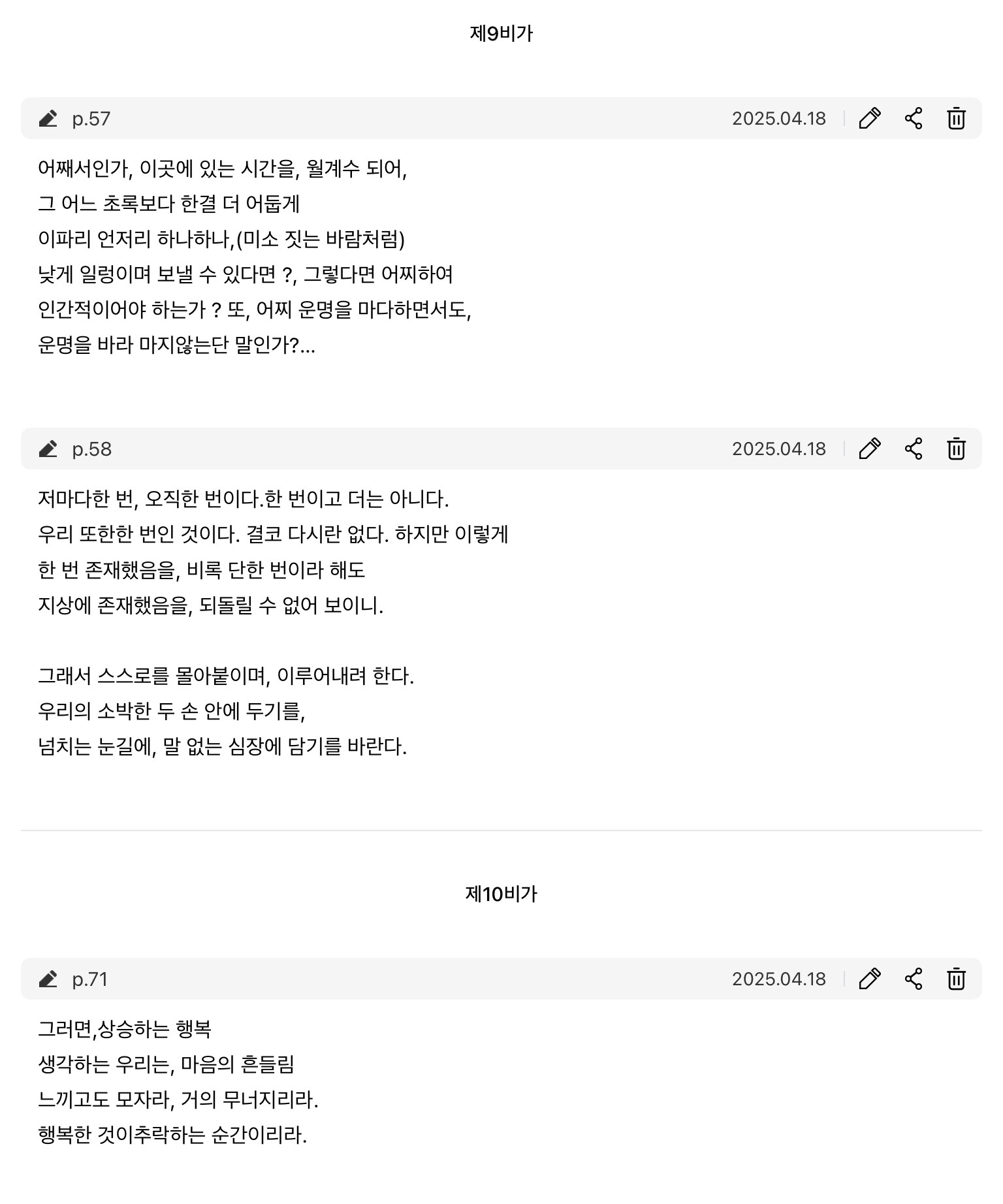-20250418 라이너 마리아 릴케. 최성웅 옮김.
랭보가 에티오피아에서 커피 장사 했던 건 아주 나중에야 다른 책 보고 알았다. 처음 읽은 랭보 한 구절은 무라카미 류의 소설 ‘69’에 인용된 것이었다.
-“지금쯤 모두들 청소를 하느라 바쁠 거야.”
아다마는 바다를 보면서 그렇게 말하고, 웃었다. 나도 웃었다. 아다마는 땡땡이를 치는 재미를 처음으로 만끽하고 있었다. 시집을 다시 한번 보여 줘, 하고 아다마는 손을 내밀었다.
나는 보았다.
무엇을?
영원을,
그것은 태양이 녹아드는 바다.
아다마는 소리내어 랭보의 시를 읽었다. 태양이 빛의 띠를 만들어내며 반짝이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아다마는 시집을 빌려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시집에 덧붙여 크림과 바닐라 펏지의 앨범까지 빌려 주었다.
지금까지 32년의 인생 중에서 세 번째로 재미있었던 1969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우리는 17세였다. (무라카미 류, ’69‘, 20-21)
딱 저 나이 무렵에 지금 나보다 어린 류 할배가 내가 태어나던 해 쓴 소설을, 2000년대 초의 내 또래 겉멋 든 아이들이 서로 칭송하고 권하면서 읽었다. 무라카미는 하루키보다는 류야, 하는 69스러운 마이너 청소년들 대열에(아니 근데 이거 마이너 맞냐 남의 취향은 잘 몰루) 나도 합류했다. 지금 다시 읽으라면 오그라들어서 못 읽겠어…
집에 엄마가 사 둔 랭보 시집 있던게 생각나서 저 시, 통으로 다 읽고 싶네 하고 뒤져 봤었다. 암만 봐도 저런 구절은 못 찾다가 비스무레한 걸 발견했다.
재발견되었다!
무엇이?-<영원>이.
그것은 태양과 섞인
바다이다.
(랭보, ’헛소리2‘ 중, <<지옥에서 보낸 한 철>>, 김현 옮김, 108)
Elle esst retrouvee!
-Quoi-I‘Eternite.
C‘set la mer melee
Au soleil.
원문까지 곁들여졌지만, 나는 제2외국어로 독일어를 선택한(그리고 수능이 끝나는 순간 다 잊어버린) 문과라서 프랑스어를 일본어로, 다시 한글로 번역한 소설 속 시 구절과, 프랑스어를 한국어로 옮긴 시집 사이의 표현의 차이에 조금 충격을 받았다. 한자가 적고 섞인,을 녹아드는,으로 옮긴 소설 쪽 번역이 낫다 싶으면서 랭보 시집은 흥, 하고 덮어 버렸다.
그 기억을 되짚으며 꺼내다 옮기느라 그 소설과 그 시집을 다시 몇 구절 읽고 앉았는데(그때 그 책들은 역시나 아직 있다 내 폐지모음에. 시집 펼치니 기침 나더라) 오, 난 왜 독일어를 선택했을까, 이거나 저거나 까막눈이긴 마찬가지인데 프랑스어를 하나도 안 배운 건 조금 아쉽다.
그런 내가 오늘 다 읽은 시집은 정작 독일어 시를 옮긴 릴케의 ‘두이노 비가’였다… 2023년에 읽다 놓다가 왠일인지 전자책 뒤지다가 2년 만에 시집 파일을 열고서 그냥 다 읽어 보자...하고 읽었다기 보다 눈으로 훑었다. 최성웅 번역가와 그 동료들이 낸 시선집이 마음에 들어서 사 둔 시집이었는데 제3비가 쯤 보면서 후회했었다. 아….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거 전자책이라 못 팔잖아… 절반쯤 봤던 걸 오늘 그냥 다 읽었다. 시는 이렇게 한 번에 우르르 읽는 거 아닌데...하면서 맨날 또 그런다.
말이 다른 말로 건너오면서 가족오락관의 ‘고요속의 외침’처럼 이리저리 바뀔 수 있겠다는 짐작만 한다. 내가 원문 읽을 외국어를 아주 깊이 배우지 않는 한 그저 길잡이들이 먼저 읽고 옮긴 글에 기대 내 본토어로 더듬거릴 뿐이다. 한국어로 처음 쓴 글조차 잘 이해 못 할 때도 많은데 뭐… 번역가들은 옮기는 사람들이라기보다 다시 쓰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다시 쓴 문장이 마음에 드는 번역가 책들은 일부러 모으고 찾아볼 때도 있다. 컴필레이션 앨범 듣듯 이 분이 먼저 읽었으면 읽어볼 만할 것 같아… 이러고…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다.
릴케 시집 독후감인데 릴케 얘기는 왜 이렇게 없어...엄마가 나 어릴 때 화장실 벽에 붙여 둔 윤동주의 시 별 헤는 밤에서나 무수히 보던 이름, 릴케의 시를 이렇게 보긴 봤는데 보기만 하고 읽은 건 아닌 것 같고 뭐가 그렇게 슬퍼서 비가를 10개나 줄줄 주륵주륵 써 놨을까, 그런데 랭보고 릴케고 짐승 타령 월계수 타령 꽃 타령 시인들 생각보다 공유하는 단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천사 영원 거울 소년 사랑 바다 어디서 제일 예쁜 거만 주워모아다 계속 스펠링비 같은 거 한다고 하면 이제 시인들이 떼로 몰려와 또 꼴밤 한 대씩을 맞겠구만… 심심하면 랭보 시집이나 천천히 읽어 봐야 겠다. 조롱의 대가라면 아마 내가 좀 좋아할 거 같기도 하다구… 근데 이 분도 체코 출신이면서 오스트리아 시인이래고 독일어 시 썼는데 카프카도 그렇고 밀란 쿤데라도 그렇고 왜 체코에서 태어난 사람들 체코어로 글 안 써? 독일어나 프랑스어로 쓰는 편이 더 많이 읽힐 거라고, 말 건너가다가 육이오가 오징어가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지레 걱정했을 지도 모르겠다. 나처럼 오징어로 읽는 애들 못 쫓아내니까 더 그랬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