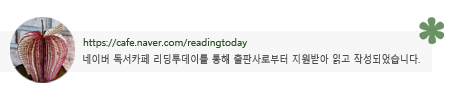국가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실재한다고 국가의 형체를 통째로 담은 하나의 명문화된 문서 헌법이 증명한다.
모든 정상국가가 가지고 있는 헌법, 라틴어원으로 ‘나라를 세운다’는 의미를 가졌고 한 국가의 상징인 동시에 실체이다. 그런데 이런 헌법은 소수에 의해서 작성되고 제정과정에서도 국민의 진정한 동의를 얻은 것일까?
법위의 법, 법중에 가장 기본 법인 헌법, 국가 운영의 기본이고 국민과 국가와의 기본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헌법을 미국학교에서는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교는??
국가가 무엇이고 시민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기위해선 헌법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에 대해서도 배울필요가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