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작은 자비들
데니스 루헤인 지음, 서효령 옮김 / 황금가지 / 2024년 11월
평점 : 



저자의 작품을 접한 독자들이라면 그가 추구하는 장르에서 여러 가지 면들을 들여다볼 수 있다.
추리 스릴이 추구하는 재미와 반전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미국 역사를 토대로 그 안에서 살아가던 인간들의 심리를 파고드는 탁월한 내용들은 이번 신작에서도 독보적인 실력을 발휘한다.
1974년 보스턴 법 결정에 따라 백인 고등학교 학생과 흑인 학생들의 학교를 인종차별 철폐에 대한 사례로 맞바꾸어 등교할 것을 명한다.
일명 '버싱'이라고 불리는 실제 사건을 토대로 그린 배경 속에서는 저소득층의 불안한 백인가정과 흑인가정들이 주를 이루고 사는 곳이란 점과 이 결정이 부유한 교외에 거주하고 있는 백인층들에 의한 아이러니함을 보인다.
베트남전에서 돌아온 아들이 마약으로 사망한 후 두 번의 결혼 실패를 하고 있는 메리에겐 오직 하나밖에 남지 않은 딸 줄스가 있을 뿐이다.
그런 줄스가 데이트를 나간 후 돌아오지 않은 채 지하철에서는 한 흑인 청년이 죽은 채 발견이 된다.
같은 직장동료의 아들이었던 죽음을 접한 메리는 딸의 행방을 찾기 시작하지만 이내 그 지역 내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마티 버틀러에게 암시가 섞인 협박을 받게 된다.
이후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보면 정말 물불 가리지 않는 불도저 같은 여장부(?) 스타일의 모습을 볼 수도 있는 장면들이 읽는 동안 시원하면사도 마음이 너무 아팠다.
보통 스릴장르에서 추구하는 사건의 정당성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처단하는 과정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 주 재미를 주지만 이 작품에서는 같은 동네의 서로가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인종차별로 인한 사건을 매개로 갈라지고 두 사람의 죽음이란 진행으로 이어지면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너무도 공감적으로 그려냈다.

만일 메리가 힘이 있고 잘 사는 백인이었더라면, 드리미가 흑인이 아닌 백인으로서 성실한 직장인으로서 아들을 둔 엄마였다면 이 사건들이 일어날 소재라도 됐을까?
당시 미국의 상황을 지금 글을 통해 읽고 있는 독자로서 그때와 지금의 미국은 얼마나 달라졌는가에 대한 물음이 생긴다.
- 국(동남아인에 대한 멸칭—옮긴이)이라고 불러라, 깜둥이라고 불러라, 카이크(유대인), 믹(아일랜드인), 스픽(스페인계), 웝(이탈리아인), 개구리(프랑스인)라고 불러라. 떠올릴 때 인간의 존엄성을 한꺼풀 벗겨 내는 명칭이라면 뭐든 상관없다. 그게 목표다. 그런 일을 시킬 수 있게 된다면, 당신은 아이들더러 바다를 건너가 다른 아이들을 죽이라고 시킬 수도 있다. 아니면 바로 여기, 집에서 머무르면서도 같은 일을 하게 시킬 수도 있다
순수한 마음에 건네는 말이 위협스럽게 느껴졌다고 행동에 나선 이들, 한순간의 행동이 군중심리 작용으로 한마음이 되어 저지른 일은 경찰 과잉진압으로 생명을 앗아간 일들이 떠오르는 미국 사회의 모습과 겹쳐 보이면서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세상에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엄마란 존재,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란 것이 결국 이런 것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에 다다른 미국 공권력에 대한 허점과 지하세력과 모종의 돈거래로 사건의 진실 자체를 마무리하는 실세들의 비판들을 담아낸 작품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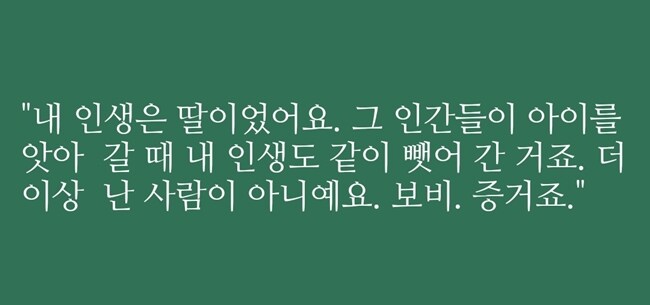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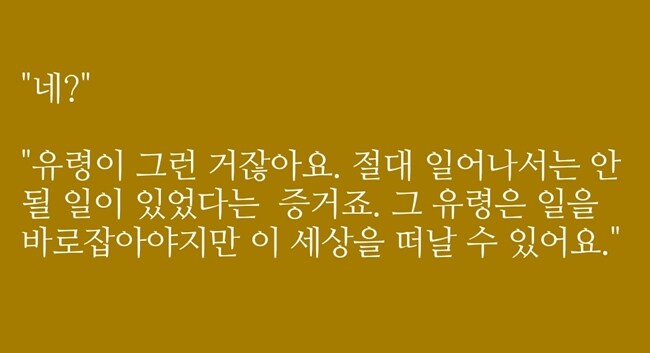
나가 살고 있는 동네는 안 되고 나를 벗어난 곳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잣대를 대는 부유층들의 속셈, 그건 가운데 결국 피해자들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들의 자식이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그려진 소설이라 저자가 한 작품 속에 담아낸 이야기들은 울림을 준다.
(그나마 줄스가 행한 일이 작은 자비였다니... 아이고야...)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저자의 작품 중 '커클린 가문 3부작'을 손에 꼽는데 이번 작품으로 또 한 권 올려본다.
***** 출판사 도서협찬으로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