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화
너무 멀리 왔구나
말이 곧 밥이 되고 법이 되던 땅으로부터
토해내지 못해
안으로 타들어간 말들이 끄는 대로
두 눈 멀쩡히 뜨고 여기까지 흘러왔다
길을 찾지 못해
쌓이고 쌓여 헝클어진 말 덩어리가
쭈글쭈글한 몸 여기저기 불쑥불쑥 찌르며 비집고 나오는데
어두운 몸을 찢고 나온 혼돈의 말들은
화려한 독버섯이 되고 사금파리가 되고
이 땅의 모든 불씨를 사위어버리게 하는 얼음이 되고
너무 멀리 떠나왔구나
말이 곧 목화가 되고 따뜻한 구름이 되던 땅으로부터
구름을 타고 하늘을 만지고 놀던 때로부터 (P.15 )
버들치
중택이는 버들치의 청도 사투리다 중학교 때부터 중택이
란 별호(別號)를 얻은 까까머리 친구가 있다 1급수에만 사
는 버들치같이 맑은 눈을 가졌기 때문인지 중 같은 머리 때
문인지 지금도 청도서 가장 깊은 계곡 버드나무 숲 속에다
집을 짓고 산다 버드나무 숲 때문인지 눈물 많은 중택이 때
문인지 이곳 바람은 눈물처럼 맑고 푸르다 으레 술자리가
막 벌어질 즈음이면 주식 얘기. 군대 얘기 다음으로 먹는 얘
기가 따라나와서 개, 개구리, 뱀 잡아먹던 얘기로 마무리되
지만, 물이 맑고 길이 곧은 청도서 나온 우리들에겐 뻐구리,
송사리, 버들치 얘기로 끝이 난다. 한밤에 차를 몰아, 버들
치같이 해맑은 얼굴로 산림청 서기를 하다가 이제는 진짜로
버들치가 되어버린, 바위틈에 숨쉬고 산다는 중택이를 찾아
가는 친구도 있다 (P.17 )
감자 먹는 사람들
왜정 때 배삼식 씨는 봉화에서 목도질로 먹고 살았다
하루종일 어깨, 허리 무더져라 황장목을 나르고
물감자 한 바케스 받아들고 후들거리며 돌아왔다.
뭄바이에 가면 왼종일 옷을 수 천 벌씩 빠는
인간 세탁기 불가촉천민이 있다.
꿀꿀이죽 같은 카레를 허겁지겁 퍼먹을 때도
허리가 펴지지 않는 청년 핫산이 있다.
야생 히야신스를 닮은 채털레이 부인이 사는
영국 중부에 지옥 같은 탄광촌 테버셜이 있다.
날카롭고 사악한 전깃불 밑에서 말을 잃어버린 광부들이
껍질도 안 깐 돼지감자로 허기를 메운다.
누에넹 들판의 시든 야생화 같은
먼지 자욱한 집 속을 고흐가 들여다보고 있다.
두엄 빛깔 옷차림의 농부들이 갈고리 같은 손으로
설익은 감자를 먹고 있다.
서먹서먹한 내면을 희미하게 가려주는 램프,
지친 얼굴들은 서로 쳐다보지도 않는다.
한겨울에도 난방을 못하는
질퍽거리는 우리 안 돼지보다 못한 노인
라면 하나로 하루를 떼운다.
노인의 흐릿한 촛점 너머로 바퀴벌레들이
말라버린 라면 찌꺼기를 뜯어먹고 있다. (P.29 )
우체부 김판술
고흐가 그려준 우체부 룰랭의 얼굴은 진흙 빛이다
올리브 색깔의 구겨진 제복을 입은 룰랭은
아를르의 포도밭 둑길을 늙고 지친 노새처럼 돌아다닌다
우체부 김판술 씨의 얼굴은 해를 넘겨 삭아버린 상수리
열매 빛이다
보릿짚 색깔의 제복을 입은 김판술 씨는 낡은 자전거로
청도의 복숭아밭 둑길을 헉헉대며 오르내린다
룰랭과 김판술 씨의 좁은 어깨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멍에 같기도 하고 핸들 같기도 하다
경사진 시골길에서 곧 쓰러질 듯 비뚤비뚤거리지만
좌우로 흔들리면서도 중심을 잡아 나아갈 줄 안다
비바람 맞으며 무르익은 나이가 중심이다 (P.39 )
송사리
1급수에서만 산다 개울로 흘러드는 샘물을 먼저 마시며
떼를 지어 욜욜거린다 물정 모르는 어린애들처럼 순진해서
곧잘 낚인다 어망에 갇히면 가슴이 답답해서 곧장 죽어버
리는 녀석들도 있다 성(姓)이 송씨여서 초등학교 때부터 송
사리, 송사리라 불린 진짜 송사리처럼 맑고 여린 친구가 있
었다 탁류 같은 서울은 겁이 나서 못 살고, 대구쯤에서 그
것도 한적한 변두리에서 겨우겨우 숨을 몰아가며 살고 있다
초등학교를 떠나지 못하고 문구점을 하며 커다란 두 눈 껌
벅이고 있다 고향 떠나 잡어가 다 되어버린 친구들 사이에
서 전설이 되어가고 있는 친구. 인터넷에다 '송사리'란 카페
를 열어놓고서 여기저기에다 샘물을 퍼나르는 친구. 나 같
이 눈이 퇴화된 잡어들을 불러모으고 있다 그 방에 들어가
면 누구나 금방 이마가 둥글고 눈이 순한 송사리로 변해버
리고 만다 (P.43 )
고갱 2
물을 갈지 않은 수족관 뒤쪽에
<타이티 풍경>이 빛바랜 채 걸려 있다
길벗다방 까무잡잡한 레베카에게는
남국의 플루메리아 암향이 난다
스쿠터 타고 화산리에 배달 나온 길에
홀로 사는 할아버지 집에서 설거지를 해주고 있다
친정 온 맏딸같이 들깨도 털어준다
플루메리아 가지 모양 낭창낭창한 레베카,
홀아비들 자글자글 금이 간 마음을 휘휘 감아준다
읍내까지 심부름도 마다않는 레베카는
늙은이만 남은 동네에서 맛소금이다
비슬산 정기가 뻗쳐내려온 화산리에서 레베카랑
밤에 은근히 따로 만나자는 할아버지들도 있다
명절날 살짝이 선물을 챙겨주는 딸들도 있다 (P.48 )
참꽃 같은
속이 텅 빈 말의 배를 눌러
시를 게워내게 하고 싶지 않다
사물의 껍질에서 끝없이 미끄러지고 마는 말로
시를 주물럭거리고 싶지는 않다
염통이 팔딱팔딱거리는 말로
구멍투성이 말랑말랑한 말로
참꽃 같은 시를 낳고 싶다
참말로 먹을 수 있는 시를 (P.57 )
-최서림 詩集, <버들치>-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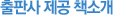
● 편집자의 책 소개
사람 이야기로 쌓아올린 든든한 말의 집서정시의 힘과 아름다움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자신의 시에서 그것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시인 최서림의 여섯번째 시집 『버들치』가 출간되었다. 1993년 『현대시』를 통해 문단에 나온 최서림 시인은 등단 후 20여 년 동안 꾸준히 시집을 펴내며 삶과 말에 대한 관심을 시에 오롯이 담아내왔는데, 이번 시집에 이르러 이러한 그의 색은 절정에 이르렀다.
시인이 바라보는 삶이란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땅에서 조상을 같이 하며 살아온 고향 사람들이나 시인이 살아오면서 직간접적으로 만나온 사람들, 그들의 황폐하고 비루한 삶을 말하는 것이며, 시인은 이렇게 찾아낸 삶의 원형을 바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힘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탐색한다.
이 과정에서 시인이 무기로 삼는 것은 다름아닌 언어, 말이다. 그는 거칠고 폭력적이며 공허한 말놀이에 그치지 않는 세상의 언어를 관찰하고, 그 거친 언어를 감싸안으며 허기진 삶을 채워줄 수 있는 살아 있고 먹을 수 있는 시의 언어를 꿈꾼다. 그리하여 “말이 곧 시가 되고 노래가 되는/ 말이 곧 법이 되고 밥이 되는 때로 돌아가기, 아니/ 말이 곧 목화가 되고 햇콩이 되는 때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물렁물렁한 말의 혓바닥으로/ 깨어진 말의 사금파리에 베인 상처 핥아주기”(시인의 말)에 이르는 것이다.
이번 시집의 해설을 맡은 문학평론가 이혜원의 진단처럼, 최서림 시인은 “서정시야말로 삶의 상처와 비애에 공감하면서도 그 본바탕을 탐구하고 치유와 각성의 언어를 실현할 수 있는 저력을 지닌다고 보고 그 가능성을 추구해나가고 있다.”
중택이는 버들치의 청도 사투리다 중학교 때부터 중택이란 별호(別號)를 얻은 까까머리 친구가 있다 1급수에만 사는 버들치같이 맑은 눈을 가졌기 때문인지 중 같은 머리 때문인지 지금도 청도서 가장 깊은 계곡 버드나무 숲 속에다 집을 짓고 산다 버드나무 숲 때문인지 눈물 많은 중택이 때문인지 이곳 바람은 누물처럼 맑고 푸르다 으레 술자리가 막 벌어질 드음이면 주식 얘기, 군대 얘기 다음으로 먹는 얘기가 따라나와서 개, 개구리, 뱁 잡아먹던 얘기로 마무리되지만, 물이 맑고 길이 곧은 청도서 나온 우리들에겐 뻐구리, 송사리, 버들치 얘기로 끝이 난다 한밤에 차를 몰아, 버들치같이 해맑은 얼굴로 산림청 서기를 하다가 이제는 진짜로 버들치가 되어버린, 바위틈에 숨쉬고 산다는 중택이를 찾아가는 친구들도 있다
-「버들치」 전문
표제작 「버들치」는 “말이 곧 법이 되고 밥이 되는 때로 돌아가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로 읽을 수 있다. 시인이 꿈꾸는 시의 언어는 “버들치”처럼 1급수에만 사는 순수하고 깨끗한 자연의 언어이다. 그리고 그 속엔 유년의 순수한 기억이 함께 자리한다. “버들치같이 맑은 눈을 가”진 친구도 그 언어 안에서 다시금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 편집자의 책 소개
사람 이야기로 쌓아올린 든든한 말의 집 서정시의 힘과 아름다움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자신의 시에서 그것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시인 최서림의 여섯번째 시집 『버들치』가 출간되었다. 1993년 『현대시』를 통해 문단에 나온 최서림 시인은 등단 후 20여 년 동안 꾸준히 시집을 펴내며 삶과 말에 대한 관심을 시에 오롯이 담아내왔는데, 이번 시집에 이르러 이러한 그의 색은 절정에 이르렀다.
시인이 바라보는 삶이란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땅에서 조상을 같이 하며 살아온 고향 사람들이나 시인이 살아오면서 직간접적으로 만나온 사람들, 그들의 황폐하고 비루한 삶을 말하는 것이며, 시인은 이렇게 찾아낸 삶의 원형을 바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힘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탐색한다.
이 과정에서 시인이 무기로 삼는 것은 다름아닌 언어, 말이다. 그는 거칠고 폭력적이며 공허한 말놀이에 그치지 않는 세상의 언어를 관찰하고, 그 거친 언어를 감싸안으며 허기진 삶을 채워줄 수 있는 살아 있고 먹을 수 있는 시의 언어를 꿈꾼다. 그리하여 “말이 곧 시가 되고 노래가 되는/ 말이 곧 법이 되고 밥이 되는 때로 돌아가기, 아니/ 말이 곧 목화가 되고 햇콩이 되는 때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물렁물렁한 말의 혓바닥으로/ 깨어진 말의 사금파리에 베인 상처 핥아주기”(시인의 말)에 이르는 것이다.
이번 시집의 해설을 맡은 문학평론가 이혜원의 진단처럼, 최서림 시인은 “서정시야말로 삶의 상처와 비애에 공감하면서도 그 본바탕을 탐구하고 치유와 각성의 언어를 실현할 수 있는 저력을 지닌다고 보고 그 가능성을 추구해나가고 있다.”
중택이는 버들치의 청도 사투리다 중학교 때부터 중택이란 별호(別號)를 얻은 까까머리 친구가 있다 1급수에만 사는 버들치같이 맑은 눈을 가졌기 때문인지 중 같은 머리 때문인지 지금도 청도서 가장 깊은 계곡 버드나무 숲 속에다 집을 짓고 산다 버드나무 숲 때문인지 눈물 많은 중택이 때문인지 이곳 바람은 누물처럼 맑고 푸르다 으레 술자리가 막 벌어질 드음이면 주식 얘기, 군대 얘기 다음으로 먹는 얘기가 따라나와서 개, 개구리, 뱁 잡아먹던 얘기로 마무리되지만, 물이 맑고 길이 곧은 청도서 나온 우리들에겐 뻐구리, 송사리, 버들치 얘기로 끝이 난다 한밤에 차를 몰아, 버들치같이 해맑은 얼굴로 산림청 서기를 하다가 이제는 진짜로 버들치가 되어버린, 바위틈에 숨쉬고 산다는 중택이를 찾아가는 친구들도 있다
-「버들치」 전문
표제작 「버들치」는 “말이 곧 법이 되고 밥이 되는 때로 돌아가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로 읽을 수 있다. 시인이 꿈꾸는 시의 언어는 “버들치”처럼 1급수에만 사는 순수하고 깨끗한 자연의 언어이다. 그리고 그 속엔 유년의 순수한 기억이 함께 자리한다. “버들치같이 맑은 눈을 가”진 친구도 그 언어 안에서 다시금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시인은 유년의 기억으로 천진하고 충만한 삶의 원형을 재현하는데, 그것은 동시에 그때로 돌아갈 수 없는 현재의 자리를 다시금 실감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시인은 현재를 낙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말이 곧 목화가 되고 햇콩이 되는 때가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년의 순수한 기억의 말뿐 아니라 현재의 아름다운 삶의 말도 그의 시에 담겨 있다.
한편 이번 시집에서는 고흐, 고갱, 마티스, 렘브란트의 그림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와 결합하고, 옛 대중가요에 기대어 내밀한 감성을 드러낸 시편들을 한데 볼 수 있다. 최서림 시인에게는 예술의 경계가 따로 없고, “삶의 비애를 간파하고 어루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좋은 예술의 기준이 된다.”(이혜원)
시인이 이번 시집뿐 아니라, 자신의 말이 나아갈 방향을 끊임없이 모색하며 시인으로서 마침내 이루고자 하는 경지는 “물렁물렁한 말의 혓바닥으로/ 깨어진 말의 사금파리에 베인 상처 핥아주기”이다. 유년의 친구, 황폐한 삶을 절실하게 건너는 사람, 명화와 대중가요 속의 이야기와 맞닿은 지점에 놓인 사람…… 『버들치』는 그들의 이야기를 최서림 시인의 “물렁물렁한 혓바닥으로” 쌓아올린 단단한 말의 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인이자 시론가로서 서정시의 뿌리를 탐색해온 그는 말의 위력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무서운 상처를 낼 수도 있고 크나큰 위안이 될 수도 있는 말을 다루는 데 있어 이제 그는 누구보다도 뚜렷한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외롭고 굶주린 이웃에게 한마디의 위로와 한 그릇의 밥이 될 수 있는 말로 시의 집을 지으려 한다. 그것은 화려하고 공허한 말들이 일으킨 신기루가 아니라 상처와 사랑으로 다져진 견고한 집이다. 서정시의 견고한 뿌리가 자리잡고 있는 핍진한 삶의 거처이다. _이혜원, 해설 「삶과 서정의 뿌리」에서
말이 곧 시가 되고 노래가 되는
말이 곧 법이 되고 밥이 되는 때로 돌아가기, 아니
말이 곧 목화가 되고 햇콩이 되는 때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물렁물렁한 말의 혓바닥으로
깨어진 말의 사금파리에 베인 상처 핥아주기
2014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