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부장제의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아넵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22년 9월
평점 : 


살짝 낯설기도 하고 왠지 모를 거부감이 느껴져서 나는 유튜브를 꽤나 늦게 보기 시작했다. 몇년 전 회사에서 요즘 애들은 네이버에 검색 안하고 유튜브에 검색해요, 라는 막내 팀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더 그랬던 같다. 알고리즘의 노예가 된 지금도 나는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니다. 좋아하는 몇몇 유튜버의 채널을 구독하면서 챙겨보는 정도인데, 주로 동물 채널이거나 평화로운 일상 브이로그 채널이 많다. 구독하고 있는 일상 브이로그들은 상황이며 연령이 중구난방이지만, 나랑 개그코드가 맞고 뭐든지 과하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
유튜브가 주는 안좋은 영향도 많겠지만, 나에게는 꽤나 좋은 영향을 많이 줬다. 여명이를 처음 데려왔을 때 초보 집사에게 많은 수의사 채널들이 도움을 줬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뭘 해먹고 사는지 뭘 읽는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보며 동질감을 느끼기도 했다. 유튜브에서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연령도 환경도 성별도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만) 볼 수 있다는 게 별세계 같았다.
처음으로 아넵의 영상을 보게된 것은 이혼 브이로그라는 독특한 제목 때문이었다. 몇편 봤더니 소소한 일상도 보기 좋았지만 과하지 않게 웃기는 자막도 너무 재미있었다. 나랑 개그코드가 거의 같은 동생한테도 공유해주고, 지금은 둘 다 아넵의 구독자가 되었다. 어느날부터인가 브이로그 속 아넵은 글을 쓰고 있었고, 새벽까지 잠을 못이루면서 키보드 앞에 앉아있었다. 나는 그 글이 어떻게 완성되어 세상에 나올지 기대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먼저 책을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너무 기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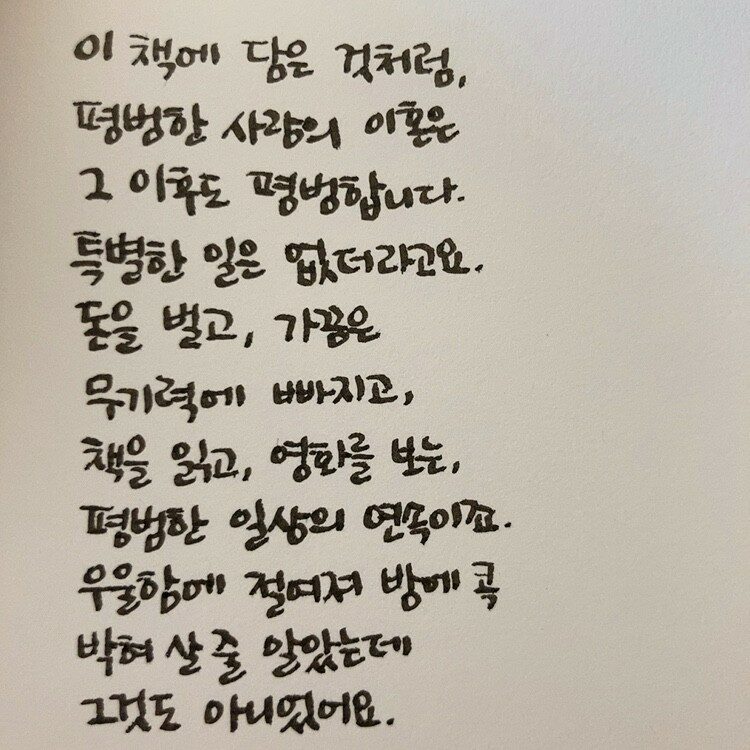
아넵의 브이로그들이 그렇듯이, 이번 책에서도 평범한 사람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 들여다볼 수 있었다. 이혼을 조장한다거나,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일상과 생각을 담고 있다. 평범한 사람이 이혼을 한다고 해서 하늘이 두쪽나거나 평범한 삶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평범한 생활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읽으면서 결혼도 이혼도 하지 않은 내가 왠지 안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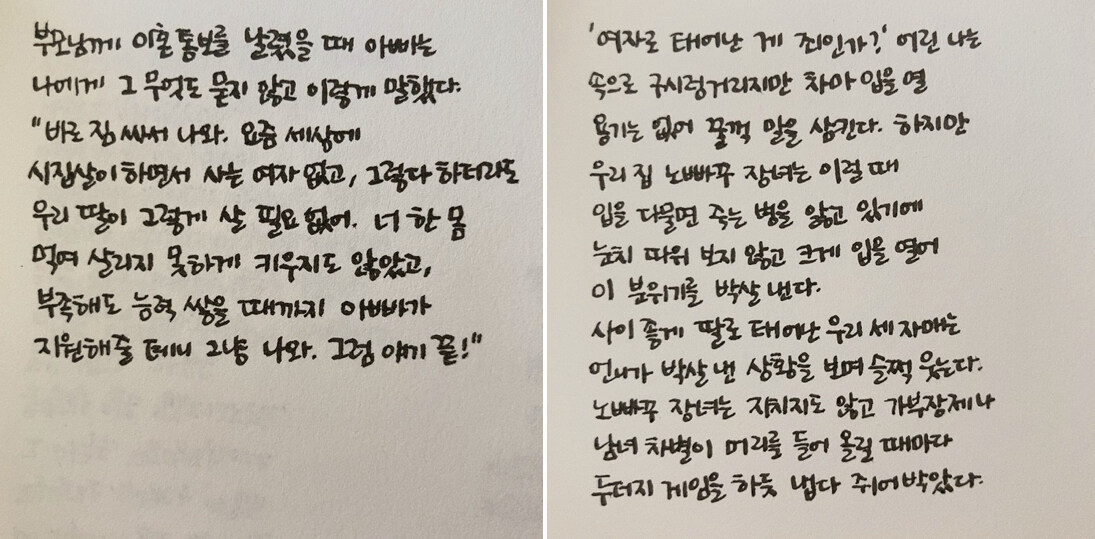
남의 아빠가 하신 이야기를 듣고 나까지 이렇게 감동할 일인가 싶었다. 물론 책에 나온 시집살이를 읽고 있으면 내가 아빠거나 언니라도 그랬을 것 같기는 한데, 가족의 무조건적인 지지가 이렇게 든든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 든든한 부모님과 노빠꾸 큰언니, 늘 투닥투닥하지만 마음이 넓은 작은 언니가 곁에서 꾸준히 아넵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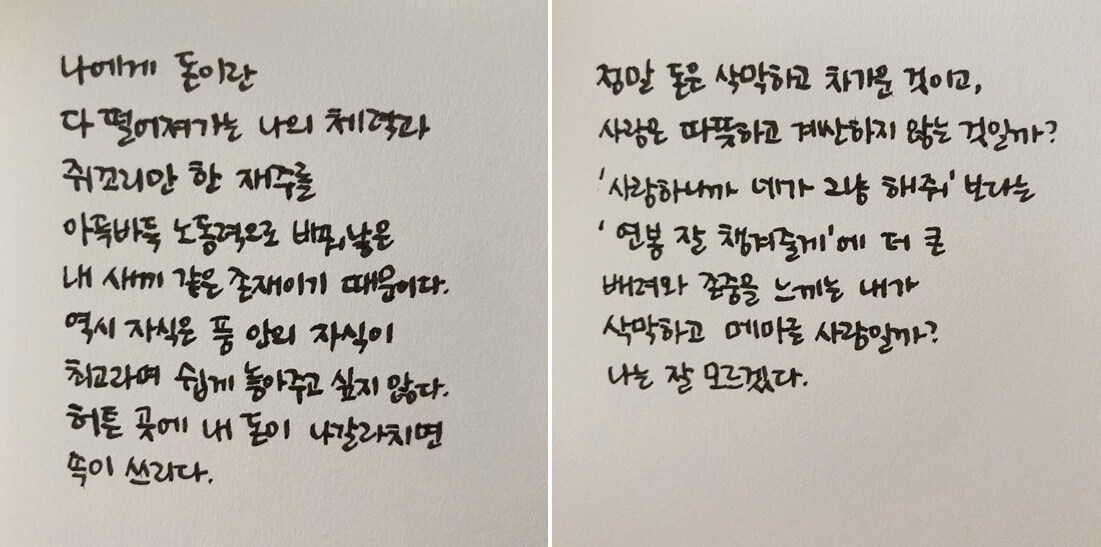
이 부분도 공감하며 읽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는 말보다는 급여나 보상을 잘 챙겨준다는 말에서 더 큰 배려와 존중이 느껴진다. 나에게 아넵의 시집살이가 더 가혹해보였던 이유는 가족이나 사랑이라는 말을 앞세워 한 사람의 노동력과 정신력을 착취에 가깝게 휘둘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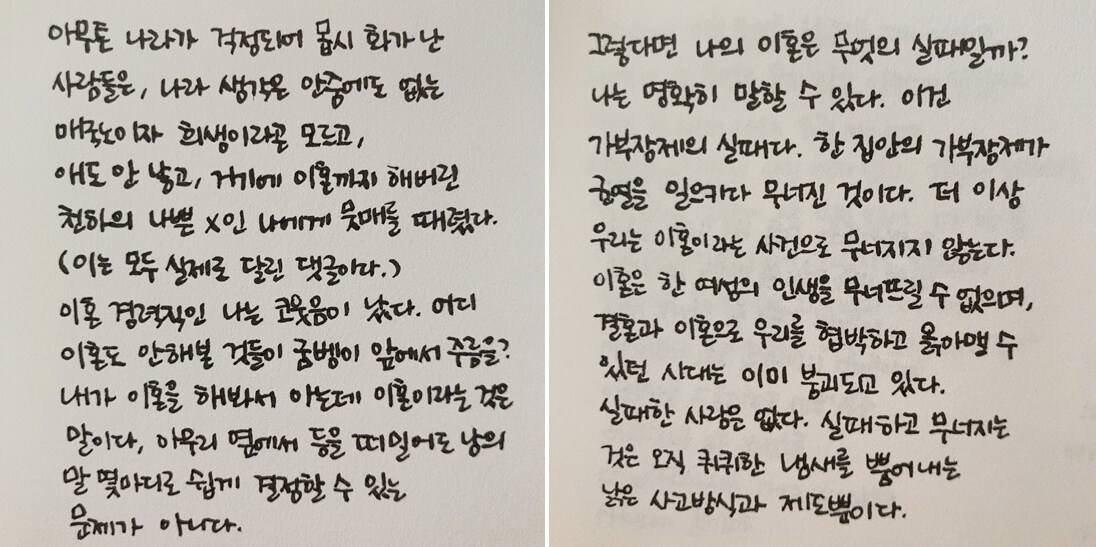
내가 처음 아넵의 브이로그를 봤을 때 왜 그런지 1편부터 3편까지는 없는 상태였다. 4편부터 시작되는 브이로그를 보면서 의아했는데, 왜 그런지는 4편에 나와있었다. 이혼 브이로그의 '이혼'이라는 말에 발작 버튼이 눌린 전국의 가부장제 지키미들이 다 아넵의 채널로 몰려와서 무근본 비난을 쌓아올린 것이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추석 특집으로 1편부터 3편 영상이 공개(동생이랑 나는 알람을 맞춰두고 바로 감상했다)되었는데, 영상 내용을 보고 나는 좀 허탈해졌다. 이걸 보고 그렇게 욕을 했다고? 싶어서. 이혼을 장려하거나 이혼 만세를 담고 있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냥 이혼한 사람이 이혼 이후에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똥이라는 댓글까지 달렸구나 싶어서 참담한 기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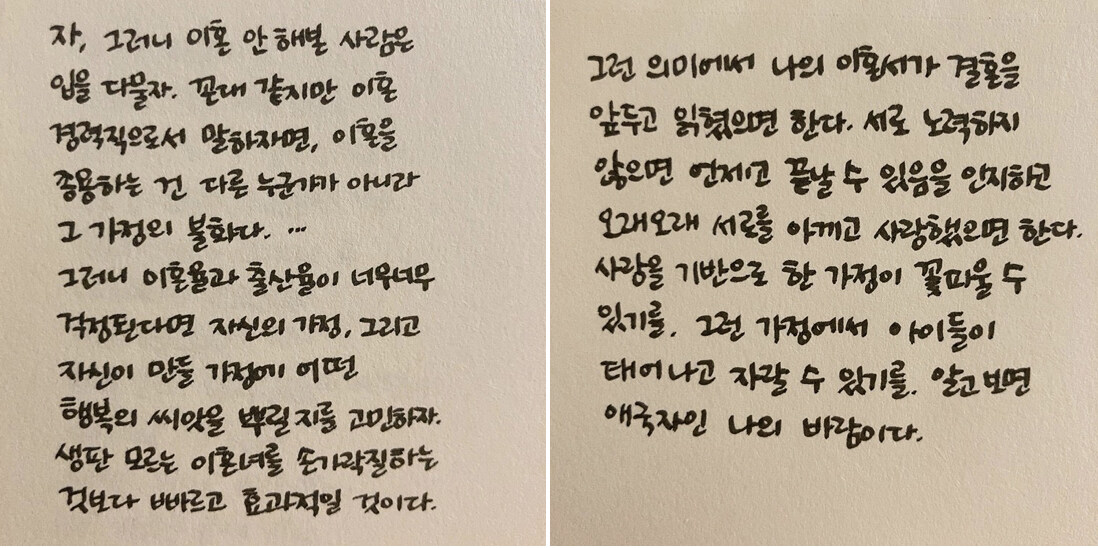
내 나잇대가 그럴 시기기는 하지만, 주위 친구들을 보면 정말 제각각이다. 결혼을 한 친구, 안한 친구, 했다가 다시 빛이 나는 솔로가 된 친구, 아이를 많이 키우며 행복하게 사는 친구, 아이를 낳지 않고 남편과 즐겁게 사는 친구 등 정말 다양하다. 각각 다른 형태로 살고 있어도 지지고 볶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고, 친구들도 나도 그 삶의 형태에 대해서는 입을 대지 않는다. 나는 결혼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혼자 살든 누군가와 함께 살든 나에게는 내가 최우선이다. 범죄가 아니고서야, 결혼이나 출산은 개인의 의견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이어갈지 끝낼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책에 나온대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가정을 쥐잡듯이 잡을 일이 아니라 내 가정이나 내가 꾸려가게 될 가정에 더 집중하는 것이 건강하게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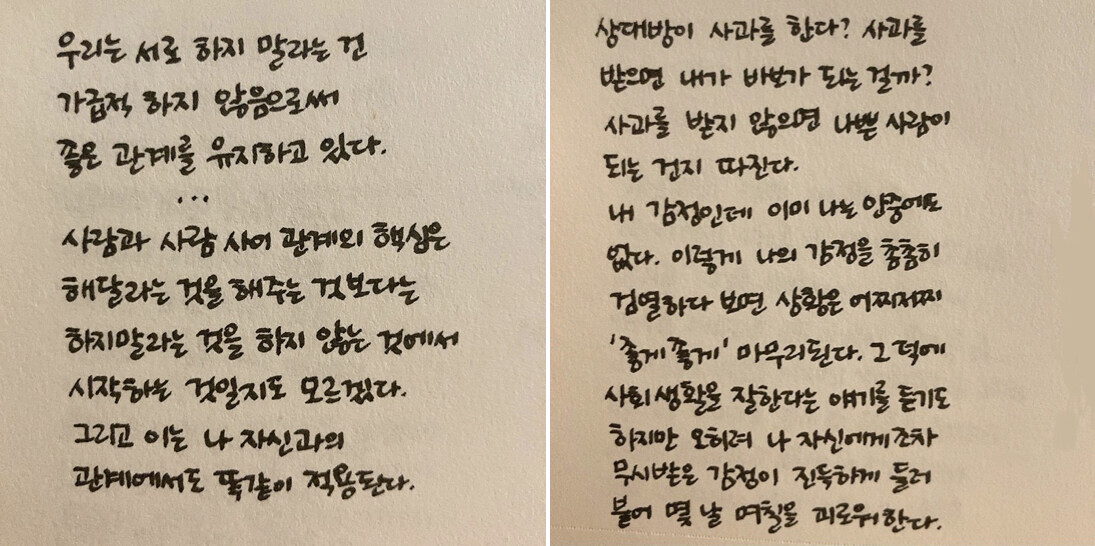
동생은 나랑 자매기도 하지만 제일 친한 친구이기도 하다. 우리가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데는, 서로 넘지 말아야할 선을 알고 있고 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로 싫어하는 건 가능하면 하지 않고, 서로 그럴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마음의 부담이 없어서일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해달라는 걸 해주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는 걸 안하는 게 더 중요한데,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게 인상적이었다. 그러고보니 나는 요즘 내가 싫어하는 행동은 나한테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반성을 곁들이며 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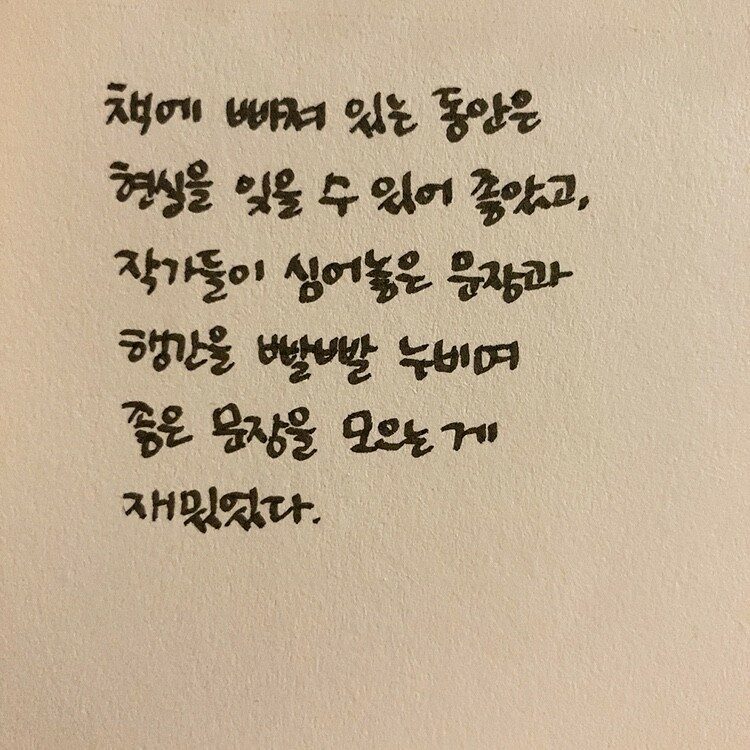
같은 아넵의 브이로그를 보고 있는데도 동생과 내가 좋아하는 장면이 서로 다르다. 나는 주로 아넵이 차를 몰고 나가서 빵과 커피를 즐기면서 일을 하거나 경치를 보는 장면을 좋아한다. 동생은 아넵이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고, 빌리고, 반납하는 장면을 좋아한다. 그런 장면을 보고 있으면 동생도 열심히 살고 싶어진다고 했다. 나는 왠지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다. 아넵의 도서관 장면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다. 도서관에서의 실패는 기껏해야 빌린 책이 재미없는 정도의 수준이니, 도서관에서 실패를 해보는 것을 장려(!)하는 내용이었다. 정확한 대사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말들이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았다.
제법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도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쾌하다. '지금이니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내용들도 더러 있지만, 읽다 보면 사람의 일상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평온하게 흘러갈 수도, 거기서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래도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건 브이로그를 보며 알고 있었지만, 힘든 시기에 한 달에 20권 가까운 책을 읽었다는 아넵 작가님의 내공이 책에 그대로 녹아있었다. 문장들이 술술 읽히고, 재미있었다.
책을 읽는 동안 나에게 뭔가 중차대한 인생의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나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 줄 사람들(주로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하지말라는 걸 안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가까운 주말에 동생이랑 서점이나 도서관에 놀러갔다가 아넵의 브이로그를 보며 깔깔대고 싶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