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설이 국경을 건너는 방법
정영목 지음 / 문학동네 / 2018년 6월
평점 : 


이 책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책의 역자가 정영목 님이라고 하면 무조건 사들이고 봤으니 제법 읽었을 줄로 알았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꽤 돼도,
읽은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 그건 취향에 문제인 것도 같다.
내가 정영목 님을 번역가로 알고 있으니 책에 관한 걸로만 생각했었고,
정작 정영목 님은 음악으로, 영화로, 분야를 확장시켜 나가시니,
님이 번역하신 책 몇 권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안다고. 그를 좋아한다고 설레발 칠 일도 아니지 싶다.
거기다가 이 책에선 님이 번역하신 책 뿐만 아니라 읽으신 책들에 대해서도 소신을 엿볼 수 있었고,
그러고 나서 바라보니 이 분을 '번역가 정영목' 님이라는 테두리에 가두기에는 좀 큰 분이란 생각이 든다.
보통 번역을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당신 나름대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양의 균형이 아니라. 나 지신의 어떤 균형, 을 염두에 두고 소설만이 아니라 인문학 등 소설 외의 책들도 번역해 왔다(6쪽)고 하신다.
한군데 모아놓고 보니,
필립로스는 이제 시작이고 주제 사라마구는 좀 읽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를 정영목 님이 번역하셨으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고,
존 업다이크는 읽어보지도 못했고 가지고 있는 책도 없다.
이창래 같은 경우는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왠지 정이 가지 않았는데,
정영목 님도 그 부분을 언급하신다.
'소설의 서사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개성적이고 우아하며 유려한 문체로 높은 문학적 평가를 받고 있는데다가,
설익은 희망적 메시지 대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나오는 극복의 에너지에 집중해 왔다'고 하니 한번 시도해 봐야 겠다.
알랭드 보통은 젊은 시절의 치기가 좀 맘에 안들었는데,
정영목 님의 말씀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보통다움을 회복하고 일상의 철학자로 거듭났다고 하니,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그 외에도 오스카 외일드, 존 밴빌. 코맥 매카시, 윌리엄 트레버, 커트 보니것,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등이 있는데,
윌리엄 트레버는 요즘 내가 흥미를 갖게된 작가이기도 하다.
아무래도 필립 로스라고 하면 유대인과 미국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가 번역한 책 속에서는, 역자후기를 통하여서도 언급하지 않았었는데,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던 일을 배경으로 하였음을,
사람이 삶을 견뎌내는 방식을 중요시 하였음을, 명확히 집어내고 있다.
존 업다이크와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것도 흥미로웠다.
번역이야 물론 훌륭하니 말할 것도 없고 이분이 마음에 들었던 것은 '주제 사라마구'에 대한 이런 코멘트를 보고나서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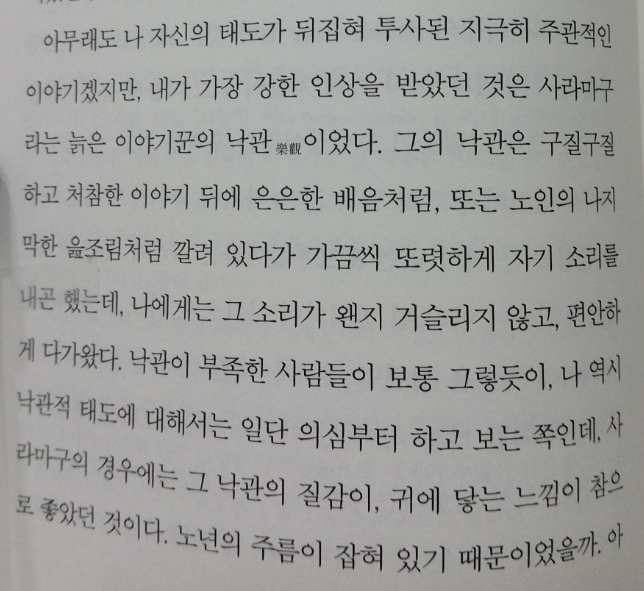
헤밍웨이 편에서 이런 구절을 보고는 헤밍웨이 단편집을 당장 사들이기로 마음 먹었다.
마치 묵언 수행 과정을 묘사한 듯한 이 단편에서 걷기와 낚시는 남성성의 과시가 아니라 치유의 과정이 되며, 자연은 대상의 수준에서 벗어나 인물과 일체를 이룬다. 아마도 헤밍웨이는 늘 이런 상태가 그리웠을 것이다. 다만 거기에 이르는 것이 지난했을 뿐(61쪽)
완전 멋진 문체다.
그동안 번역한 저자를 앞에 드러내느라고,
역자의 문체는 묻혀있어서 몰랐었다.
존 밴빌의 '바다'같은 경우는 언젠가 책을 읽고 리뷰(==>링크)를 쓸때도 밝혔지만,
정영목 님의 번역이 아니라면 끝까지 읽기 어려웠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좋다고 상찬하는데(역자 정영목 님까지도),
실상 나는 공감하기 좀 힘든 상황이었고,
그건 역자의 해석을 보고난 지금도 그렇다.
그동안 번역가 정영목으로만 우리에게 알려져 있었다면,
'번역가인' 정영목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소신을 가지고, 이런 취미생활을 하면서...자신을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번역가란 다른 작가의 삶을 번역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말이다.
괜히 숙연해지고 경건해지는 것이 저절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