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복 같은 소리 - 투명한 노동자들의 노필터 일 이야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기획 / 동녘 / 2023년 5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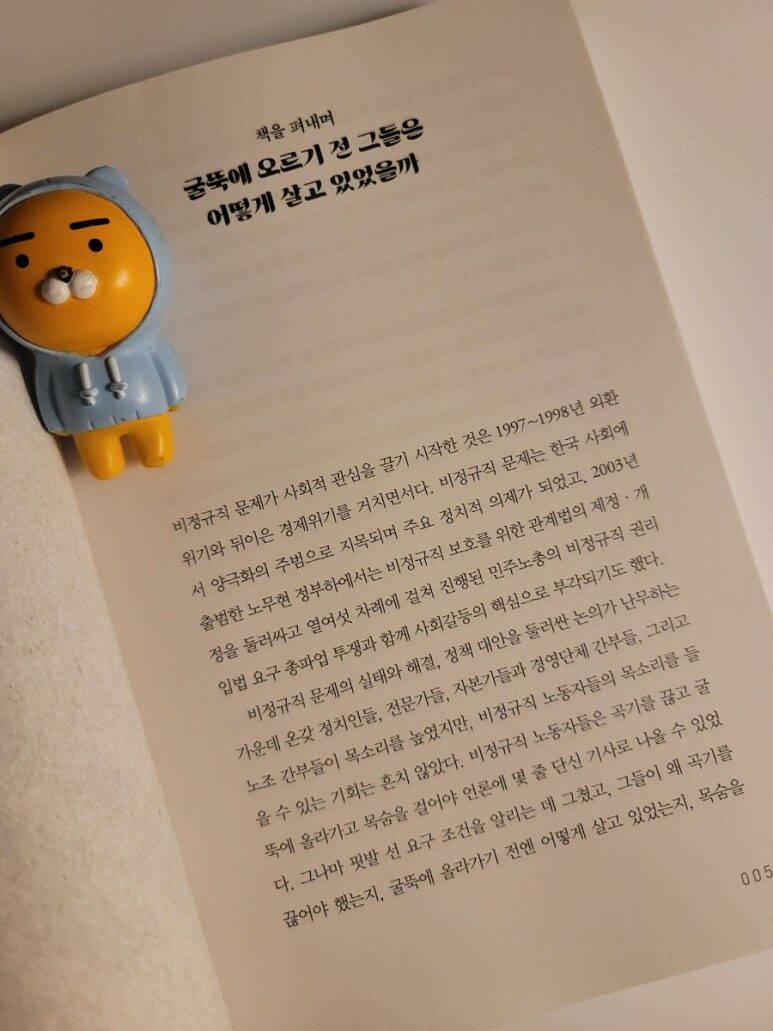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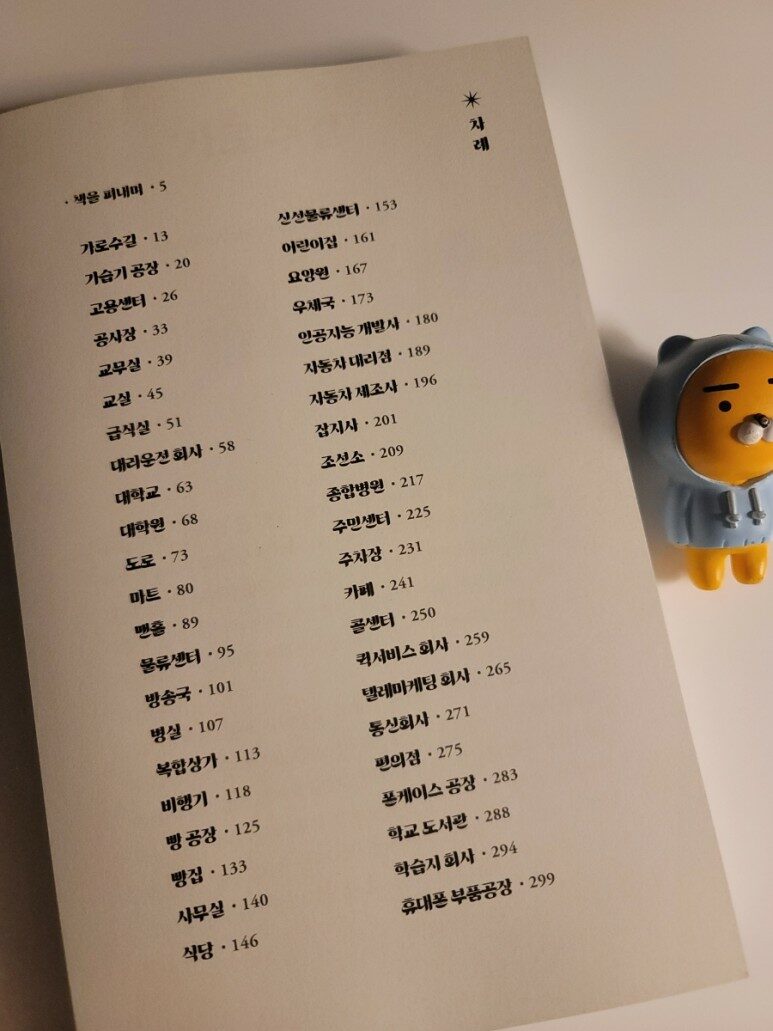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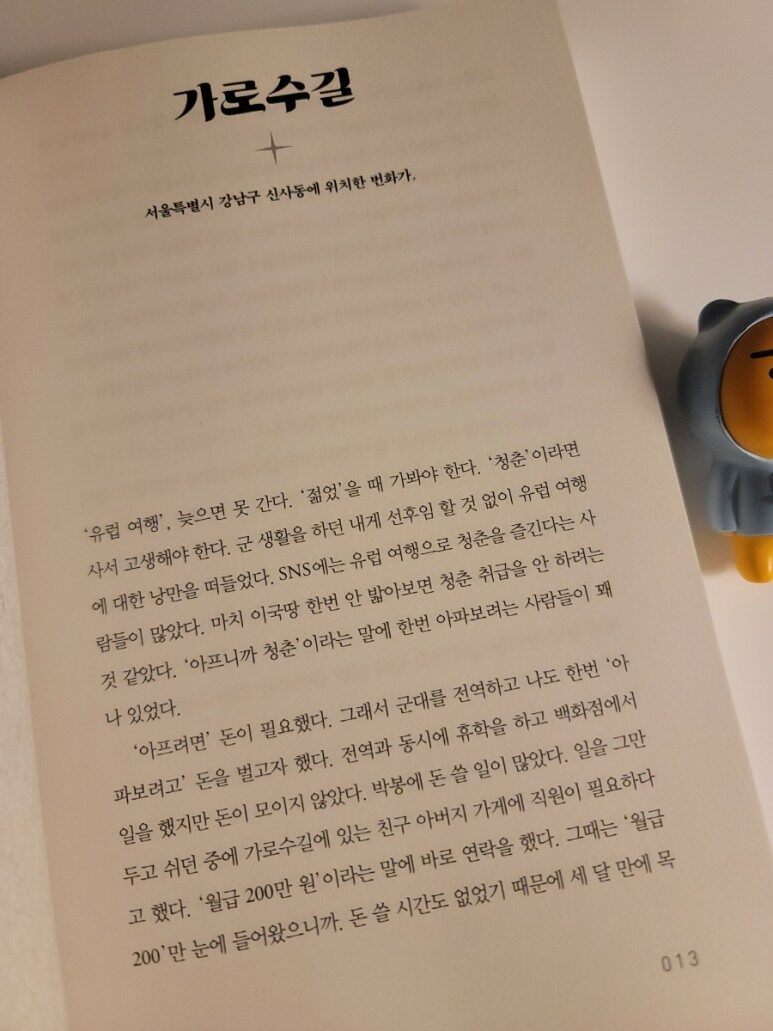
올해 노동절에는 쉬었다. 쉬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쉬게 되어 정말 좋았다. 쓰고 보니 초등학생이 쓴 일기의 마지막 문장 같다. 쉬어서 좋았다는 문장이면 다 일 것 같다. 다른 이유가 무엇 있을까 싶다. 직장인 열 명 중에 세 명은 노동절에도 일을 한다는 통계를 알려주는 뉴스를 보았다. 쉬는 7인에 속하는 나는 운이 좋은 것 같다. 생각해 보면 그다지 운이 나쁘지도 좋지도 않았다. 일 년에 넉 달은 제외하고(왜 넉 달이냐면 중간/기말고사가 있는 달) 주말과 공휴일에는 쉬었다. 추석이나 설에도 쉴 수 있었다. 이건 운 좋은 일.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다. 당연히 4대보험도 들지 않았다. 2년 후에는 월급을 올려줄 거라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초과근무수당은 받지 못했다. 한 달에 한 번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면서도 임금 계산법을 몰라 그러려니 했다. 정말 바보같이 일했다. 이건 운 나쁜 일. 포악하게 굴지도 정색하지도 않기에 계속 다녔다. 나중에야 알았다. 법을 지키지 않는 이 모든 일이 포악하게 군 것이라는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던 건 행운이 바닥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44인이 지은 『일복 같은 소리』는 프리랜서, 무기계약직, 기간제, 촉탁직, 파트 타이머라고 불리는 이름만 다르게 불리는 비정규직인들의 현장 노동 기록을 담은 책이다. 알라딘 독자 북펀드에 참여한 계기는 책의 목차 때문이었다. 목차는 일하는 공간별로 구분되어 있었다. '가로수길, 가습기 공장, 고용센터' 등으로 말이다. 내가 일했던 곳도 있었고 일하진 않았지만 현장이 궁금한 곳도 있었다. 놀라운 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느 공간에나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니 놀라운 일이 아닌 건가. 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센터에도 비정규직이 있었다. 내일배움채움카드를 신청하고 일자리 상담을 받으러 간 적이 있었다. 상담사는 자꾸 교육 신청을 하지 말라는 쪽으로 유도했다. 왜 그랬는지 『일복 같은 소리』를 읽으니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차도 없고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지라 지금 일하는 곳에서 그만두면 나 역시도 비정규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건 자명한 일이다. 최대한 집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데 그런 곳은 거의 파트 직원을 뽑는다.
평화시장의 전태일 열사는 분신하기 전 일기장에 자신에게도 대학생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썼다. 근로기준법에는 한문이 많고 내용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8시간 근무에는 한 시간의 휴게 시간이 법적으로 주어지고 휴일에 일을 시킬 시 초과 수당을 줘야 하며 노동자는 단체행동권, 교섭권,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는 법 조항을 공부를 많이 한 대학생 친구와 이야기하고 싶었던 전태일 열사의 소망이었다. 그 대학생 친구들은 이제 법을 알면서도 법에 이용당하는 처지가 되었다. 대학을 나온 게 오히려 죄가 되는 세상이다.
『일복 같은 소리』에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일단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주 5일이라고 했지만 가게 스케줄 때문에 근무 시간은 불규칙하고 한 달짜리 근로계약서를 쓰며 초단기 계약으로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서 일을 한다. 언제 그만둬야 할지 몰라 불안하다. 일 년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자격증을 따며 근무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정규직 티오가 없다는 말이었다. 좌절의 언어가 『일복 같은 소리』에 산재해있다.
나이가 들어도 일하고 싶다는 건 나이가 들어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한다는 한탄이 깃든 소망의 말이다. 어른들은 말했다. 지 먹을 복은 가지고 태어난다고. 이 말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무수저들은 지 일할 복은 가지고 태어난다고로. 먹을 복 대신에 일복을 가지고 태어난 이들에게 제대로 된 일복이 주어지기를. 다치지 않고 화장실을 자유롭게 가고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똑같이 커피를 타 먹을 수 있는 그나마의 정상의 일복을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