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리는 사랑 아니면 여행이겠지 - 당신과 문장 사이를 여행할 때
최갑수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15년 12월
평점 : 
구판절판


" 인생은 그다지 의미가 없으며,
나의 사랑과 당신의 사랑은 일치하지 않으며,
세상의 모든 구원은 거짓임을 알게 된 어느날.
문득 여행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희미한 즐거움으로 삼는다."

시인 최갑수님의 신간, '우리는 사랑 아니면 여행이겠지'의 뒤표지 안쪽 문장이다. 문득 여행이라는 희미한 즐거움만이 스스로를 구원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스스로를 의미한다. 이런 즐거움과 사랑과 의미. 어쩌면 이것이 나와 당신의 구원할 것처럼 한 때를 여행하는 것은 아닐까.
이처럼 그의 문장은 감성의 씨줄과 날줄로 직조되는 그의 책이다. 이제는 그를 시인이라고 부르기 보다는 광범한 여행작가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더 어울릴 지경이다. 어느 시인은 사진가로 곁들이며 나가고, 어느 시인은 화가로 붓을 곁들이며 나가고, 어느 시인은 여행 작가로 지구를 떠돌며 나간다. 한결같이 시에만 안주하지 않고 시를 벗어난 넓이를 한 뼘 더 보태어 결국 시에게 더 탄탄한 주단을 깔고 있는 셈이다. 특히 그의 시적인 문장과 사진. 이 사이에서 독자는 노닐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는 시를 벗어남으로써 시에 더욱 천착하는 역설을 사진으로 다정다감하게 보여주고 있다.

어느 외골수같이 시에 전부를 다 바치고 시 이외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시로써 만에 세상을 아우를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시인들이 많은데, 시인이 시를 배신하듯 사진과 여행에 더 몰두하는 모습을 나는 전혀 지적하고 싶지는 않다. 오히려 더 열렬한 옹호자가 된다. 시가 되었던지 사진이 되었던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저 그의 감성 덩어리가 무엇으로 펼쳐지든지 간에 관여할 바도 없다.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그의 문장은 시보다 더, 사진가의 사진보다 더한, 문장의 응어리를 만나고 휘휘 젖고 풀어 내며 그 응결의 색깔을 볼 수 있어 즐겁다는 사실이면 이것 이상으로 무얼 바랄까 싶었다. 한편으로 등단한 시인이 시보다 여행에 더 집착할 때, 같은 시인들이 얼마나 아쉬워 했을지, 아쉬워 했던 만큼 또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시도 물론이거니와 시를 통한, 여행을 통한 그의 여행기에서 나오는 언어의 문장과 사진의 이미지는 서로를 제한하지 않고 사진으로도 제한하지 않는다. 읽고 보는 독자는 이것이든 저것이든 그의 글과 사진으로 느낄 수 있는 감성의 이입과 이입을 통한 정서의 반향과 여운이 길게 남는 것이라면 그의 책에서 받는 포만감이라면 충분하기 때문이었다. 이게 그가 지향하는 목표의 도달 방식이었던 것이다.
그의 산문인지 시 인지도 경계를 구분하지 않는 넓은 범주의 에세이와 사진으로 단행본이 나온 책은 거의 다 봤다. 루앙 푸라방의 여행 책부터 나오는 그의 주옥같은 문장이 펼쳐진 글과 사진에서 그의 시인다운 감성은 그의 문학적이기도 하거니와 여행이라는 낯섬에 대한 깊은 감정이 똘똘 뭉쳐져서 펼쳐진다. 탄탄한 시의 문장처럼 감성 덩어리는 이내 말랑말랑한 문장으로 건너고 사진으로 이어지면서 양념처럼 뿌려져 있다. 만약에 시인의 책에서 사진이 보이지 않았더라면 나는 굳이 그의 감성 언어에 대한 빠돌이가 되지는 못했을지도 모른다. 여행기의 사진에 더 목적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시에 대한 나의 특별한 주목도는 끌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진을 만나고 그의 여행 에세이를 만났을 때 비로소 시인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역시나 시적인 감성은 고개를 꺼덕이게 하였던 탓일 테다. 나는 그의 문장과 사진에서 일종의 감성적 시너지 효과를 느꼈다. 글이 글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많다. 또한 사진도 마찬가지로 사진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섞어 놓음으로써 융합의 사이즈는 커지고 복합적인 교집합은 결국 전체의 느낌에 대한 길고 긴 잔여감이 내내 가슴에 맴도는 증상을 겪게 한다.
시인에게 있어서 사진은 무엇이며, 사진에서 시는 무엇일까. 또한 시와 문장과 사진의 이미지가 합쳐지고 섞여서 나타내는 비빔밥 같은 조화는 또 어떤 뉘앙스의 감성으로 의미되는 것일까?
나는 이런 질문에 있어서, 사진을 찍어 오면서 느꼈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이었다. 감성의 넓이와 깊이를 서로가 보완하고 서로가 보듬고 서로가 안아주는, 그래서 합쳐지며 손뼉처럼 소리를 더 진하게 내고 여운으로 도출하게 된다. 시적인 감성도 없이 사진의 감성만으로는 어설픈 느낌을 시의 문장이 든든한 지지대 역할을 해준다고 믿었고 실제 작가의 책에서 이런 사진이 글의 지지대가 되고 있음을 목격하기 때문이다. 하나라서 홀로가 아니라 양립된 수레가 감성의 레일 위를 오롯이 달려가는 의미는 아니었겠는가 싶었다. 없어서 좋았다기보다 있어서 더 감칠 되는 기분은 작가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선명한 감동을 주고 받는다. 그들은 시의 토대가 강고한 디딤돌이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시어에서 나오는 은유와 대유와 비유를 이미지의 직접적이고도 직관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사진의 감칠 맛은 그래서 더 선명하게 직관적으로도 와 닿는 묘미를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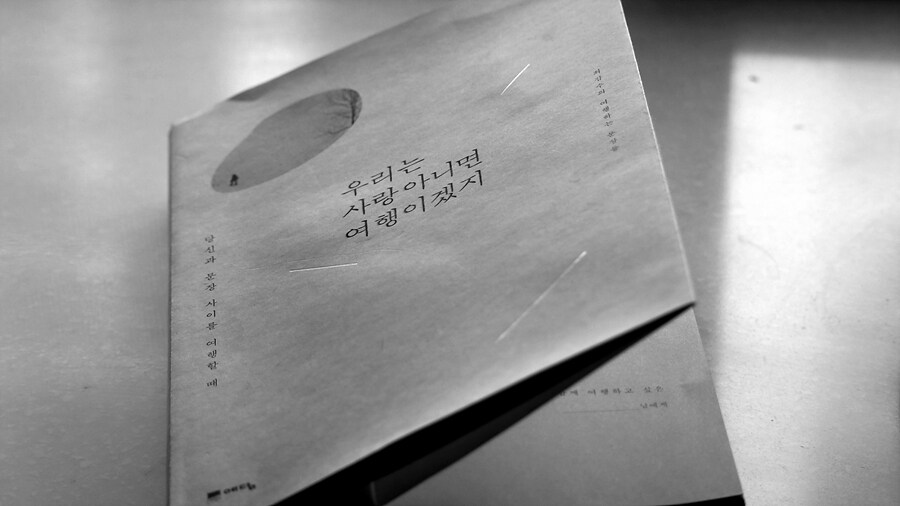
책에는 여행과 인생이라는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한 관조가 있다. 이 관조가 사진의 스타일로 나온다. 나는 흔히 아마추어 여행기와 사진을 보려 하지 않는다. 재미가 없기도 하거니와 글과 사진이 너무나도 뻔한 흐름을 가지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유명한 관광성 멘트는 하나같이 개성도 없고 관조도 없어 보였다. 여기서 뭐 했고 뭐 먹었고 뭐 봤서 어떻게 갔다 왔다 하는 식의 상투적이고 식상한 이야기는 이미 누군가는 벌써 다했던 이야기의 재탕일 뿐이다. 여행기를 보고 그대로 답습하는 식의 여행은 여행이 아니라 관광이다. 최갑수의 사진은 일상에서 흔하게 본듯하지만 또 다른 사진이었으며 일반적인 재탕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자기만의 색채가 드러나는 삶의 여행기는 그래서 그가 프로임을 증명한다. 낯선 곳으로 자신을 던져 놓고 나를 낯섬에서 돌아보는 것. 그럼으로써 자신에게서 피어 오르는 사유의 줄거리가 곧 여행이란 이야기의 맥락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관광성 여행이 그저 눈요기 거리로 그치고 마는 스타일의 여행기는 굳이 봐서 재미는 없다. 이미 많이 봤던 것이고 이미 읽었던 스토리가 뻔한 재방송 드라마 같아서 시간 낭비인 이유이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가더라도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시인의 시 한 줄이라도 먼저 보고 갔더라면 어떤 영감이 떠 오를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그러지를 못한다. 관광 기술은 늘어날 지언정 여행의 심화된 기술은 정체되어 있는 까닭은 아닐까. 여행도 세계를 방랑하는 인문학의 노마드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워낙 작가의 팬인 독자인 내가 이책을 보고 약간은 실망했던 부분이 있었다.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책의 편집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글씨 크기가 너무 작다. 눈이 나쁜 사람은 어떻게 보라고? 돋보기를 대고 읽을 피로감이 밀려왔다. 요즘 들어 일부 책들의 편집 스타일이 책 두께는 두껍게 나가면서도 당최 책이 문고판처럼 작게 만들어진다. 가방에 넣어 다니며 읽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읽기가 불편했다. 책 사이즈 좀 크게 하고 두께를 줄이고 글씨를 좀 키우면 안 될까? 아무리 좋은 내용이더라도 책이란 그릇이 작아 내용물이 넘쳐나니 어렵게 주워 담는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 사진도 1.5배는 더 크게 편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내용의 심도를 자꾸 방해하기도 했다. 출판사도 객체지향. 즉 읽는 독자 입장에서 서 책을 만드는 아량을 좀 배풀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된다.
PS : 이 책은 2015년 12월에 알라딘의 이웃으로 계시는 Cy***님의 선물로 받은 책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가분이 신간을 냈는데 주문하려는 찰나에 이 책을 보내 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특히 최갑수님의 책에는 사진이 많아서 오래전부터 좋아했었거든요. 이 리뷰를 빌어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