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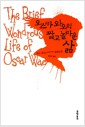
-
오스카 와오의 짧고 놀라운 삶
주노 디아스 지음, 권상미 옮김 / 문학동네 / 2009년 1월
평점 : 


흥미진진 눈을 반짝이며 신나게 읽다가, 독재자의 손아귀에서 고통받는 도미닉 사람들때문에 잠시 마음이 아프다가, 벨라시아와 룰라 모녀 아귀다툼에 휩쓸려 어지럽다가, 뚱뚱한데다 마음까지 여려 동네 왕따도 모자라 대학까지가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오스카에게 연민을 느꼈다가, 딸을 지키려다 몰락한 아벨라르의 운명에 안타까워 하다가, 도미닉의 저주 이름이라는 "푸쿠"의 존재에 대해 미심쩍어 하다보니 어느덧 마지막 장에 다가와 있었다. 그리고 끝장을 넘기면서 든 생각 "엥? 이게 다야?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게 다라고? 그럴 리가." 책을 탈탈 털어 보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찜찜했다. 소설 중반까지만 해도 좀 더 근사한 결말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아니, 정말로 근사할 줄 알았다. 하지만 중반에서부터 이야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하더니, 결국 허무함만 남긴 채 끝을 맺고 말더라. 책을 덮고 잠자리에 드는데 이런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아무리 별 볼일 없는 인생이라하지만, 총각 딱지 떼려다 죽음을 맞는다는건 좀 웃기지 않는가 하고. 오스카 와오의 죽음을 대하는 저자의 태도에 미뤄 그것이 심각한 생명 낭비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던데. 음, 섹스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지. 참, 설득력 넘치는 결말(?)이구만. 입이 썼다.
재미 도미니카계 가족인 레온가의 삼대,31년에 걸친 가족사를 풀어놓고 있는 소설이다. 40년대 도미니카는 독재자 트루히요의 공포정치속에 살고 있었다. 나라의 여자들이 다 내거라는 신조로 살고 있는 트루히요에게 딸을 바쳐야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던 외과의 아벨라르는 결국 그의 비위를 거슬려 감옥에 갇히고 만다. 그에 이은 집안의 몰락은 세째 딸 벨라시아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다. 고아처럼 떠돌며 학대를 당하는 그녀를 간신히 찾아낸 라잉카는 그녀를 제대로 양육하려 최선을 다하나 청춘의 혈기를 이겨내지 못한 벨라시아는 트루히요의 심복의 정부가 되버린다. 본처의 사주로 죽을 정도로 폭행을 당한 벨라시아는 사랑에의 미련을 버리고 미국으로 떠난다. 미국에 정착해 낳은 룰라와 오스카 남매를 잘 키우려 애를 쓰는 벨라시아, 하지만 자식마저 그녀의 뜻대로 되어주진 않는다. 뚱뚱한 거구의 소심한 오스카는 사랑 한번 해보는 것이 소원이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자 우울해 한다. 가족들과 함께 떠난 고향으로의 여름 여행에서 오스카가 옆집에 살고 있는 전직 창녀 이본에게 반해 버리자, 그녀의 남자친구가 질투심많은 경찰임을 알게 된 가족들은 그의 사랑에 결사반대하기 시작한다. 과연 이번엔 행운의 반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중남미에는 싱글 마더들이 넘쳐난다고 들었다. 남자들이 씨만 뿌리고 다닐 뿐, 아이들을 책임질 생각을 아예 하지 않기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이 책을 읽다보니 정말 중남미 사람들은 아랫도리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인갑다 했다. 나라의 모든 여자들이 자기 것이라 생각했다는 트루히요부터, 광포한 호르몬의 영향으로 14살때 이미 학교에서 섹스하다 쫓겨난 것도 모자라 부모의 원수의 정부가 되는 벨라시아, 총각 딱지 떼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창녀의 애인에게 죽음을 맞는 오스카 와오까지...도미니카 사람중엔 아랫도리가 아닌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냐, 의문이 들었다. 저자는 오스카 와오가 트루히요와는 전혀 품격이 다른 고매한 인간성의 소유자로, 마치 순결한 사랑의 순교자처럼 보이도록 만들던데, 내가 보기엔 변태적 성향이란 면에서 둘은 오십보 백보였다. 섹스에 모든 것을 올인한 사람들로 별 다를게 없었으니 말이다. 왜 저자는 모든 것을 섹스의 문제로만 해석하는지 이 작품의 완성도를 생각하면 안타까웠다. 깔끔한 이야기 전개와 재치있는 장면 묘사, 감정 이입 어렵지 않는 노련한 문장들이나 개성 뚜렷한 등장인물들, 적절한 설명등 장점들도 많은 책이었는데 말이다. 칫, 이게 다 가문에 내린 푸쿠(저주)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웃기고 있네. 이봐, 그건 푸쿠가 아니야, 아랫도리 단속이나 잘하라고, 이 사람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