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월간 문학잡지 <릿터>(44호) 밀란 쿤데라 특집에 실었던 글을 옮겨놓는다. 밀란 쿤데라 작품에서 '정체성'이 내가 맡은 주제였다.



릿터(2023년 10/11월) 정체성
정체성은 철학과 정신분석학의 주제이면서 밀란 쿤데라 소설의 성찰 주제다. 정체성에 대한 쿤데라의 관심은 소설 <정체성>(1998)에 국한되지 않는다. 단순하게는 ‘프랑스로 망명한 체코 작가’라는 쿤데라의 이력에서부터 정체성은 질문거리가 된다. 그는 프랑스 작가인가? 체코 작가인가? 1975년에 프랑스로 망명한 쿤데라는 1979년 체코 국적을 박탈당하고 1981년에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다(2년간은 무국적 상태였다는 것이 된다). 이후 꽤 오랜 기간 쿤데라는 체코 정부와 불화관계였고, 1989년의 벨벳혁명 이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2019년에 가서야 쿤데라는 40년만에 체코 국적을 회복하고 다시금 체코 작가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 정확히는 ‘체코 작가이자 프랑스 작가’다.
하지만 ‘체코 작가이자 프랑스 작가’라는 이중적 규정은 편의적인 것이다. 쿤데라의 경우에 그것은 ‘체코어와 프랑스어로 작품을 쓴 작가’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프랑스어로 발표한 첫 에세이 <소설의 기술>(1986)에서 그는 자신이 가장 집착하는 대상이 신이나 조국, 민족, 혹은 개인 따위가 아니라 ‘세르반테스의 절하된 유산’, 곧 소설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바꿔 말하면, 쿤데라에게 가장 합당한 정체성은 ‘소설가’이고 그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과연 그에게 소설이란 무엇이었으며 그는 소설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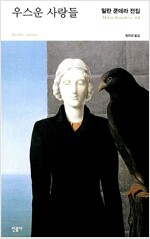
“나는 내 영혼을 증명하러 떠난다.” 죄르지 루카치가 <소설의 이론>에서 제사로 삼은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구대로 소설(우리말의 모호성 때문에 굳이 밝히자면 여기서 ‘소설’은 ‘근대장편소설’을 가리킨다)은 근대적 개인의 자기 발견, 자기 입증의 형식이다. 정체성이란 말을 가져오자면, 소설은 ‘자기 정체성의 서사’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자아가(마르트 로베르의 표현을 빌리면, 소설의 주인공은 ‘업둥이’이거나 ‘사생아’다) 안정적인 자기에 이르는 발견과 성장의 서사가 소설의 표준형이다. 하지만 쿤데라에게 소설의 용도는 ‘증명’보다는 ‘질문’과 ‘발견’에 놓인다. 그의 소설에서 정체성은 결과로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회의와 해체의 대상으로 제시된다. 비유컨대 쿤데라 소설의 여정은 하나의 영혼으로 통합되는 여정이 아니라 불안정한 분열의 상태로 귀결되는 여정이다.
초기 단편집 <우스운 사랑들>(1969)에 실린 <히치하이킹 게임>을 보자. 한 젊은 커플이 있다.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고 또 질투한다. 남자는 그런 여자의 순수함을 높이 산다. 그들은 휴가차 떠난 여행에서 우연히 히치하이킹 게임을 시작한다. 잠시 남녀가 자신의 평소 성격과는 다른 배역을 연기하면서 몰입한다. 수줍음이 많았던 여자는 히치하이킹하는 대담한 여자를 연기하며 해방감을 맛본다. 여자의 순수함을 숭배했던 남자는 그녀를 창녀로 취급하며 새로운 성적 흥분을 느낀다. 하지만 게임이 중단되지 않고 이어지면서 여자는 당혹감과 고통을 느낀다. 이야기는 비참한 정사가 끝나고 여자가 “나는 나야”를 되뇌며 흐느끼는 장면으로 끝난다. 정체성의 딜레마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성관계는 없다”는 라캉주의의 명제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사례담이다.



정체성의 혼란과 딜레마는 쿤데라가 즐겨 다루는 소재다. <농담>(1967)에서 제마넥에 대한 루드빅의 복수는 왜 실패로 돌아가는가? 대학생 시절 사소한 농담이 빌미가 돼 당에서 쫓겨날 때 이를 주도했던 제마넥을 루드빅은 15년만에 찾아와 복수하고자 한다. 그는 제마넥의 아내 헬레나를 고의로 유혹하지만 제마넥과 헬레나 커플은 이미 별거중인 상태이고 제마넥에게는 젊은 애인이 따로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다. 루드빅이 간과한 것은 15년간의 세월이다. 쿤데라는 루드빅의 오류를 기억과 영속성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것을 고쳐보겠다는 믿음에서 찾는다. 모든 것은 잊혀지며, 고쳐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진실을 루드빅은 간과한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루드빅은 중년의 제마넥이 더 이상 청년 제마넥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의 정체성이란 유동적이며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무시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토마시가 보여주는 모습도 이중적 정체성 내지는 정체성의 혼란이다. 짧은 결혼생활 끝에 아내와 이혼하고 아들에 대한 책임에서는 벗어난 토마시는 자유분방한 바람둥이 의사로 살아간다. 그는 여자를 갈망하면서도 두려워해서 ‘에로틱한 우정’ 이상의 관계는 피하고자 한다. 한 여자를 짧은 간격을 두고 만날 때는 세 번 이상 만나서는 안 되며, 수년 동안 길게 만날 때는 최소 삼주 이상씩 간격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3의 법칙’이다. 그랬던 그가 한 작은 마을에서 만난 카페 종업원 테레자와 동거하게 되자 토마시의 ‘에로틱한 우정’ 파트너인 사비나는 바람둥이 토마시에게 트리스탄의 모습이 겹쳐 있다고 말한다. 토마시는 바람둥이(돈후안)인가, 충직한 연인(트리스탄)인가? 두 가지 역할 혹은 정체성 사이에서 진동하는 토마시의 모습을 통해서 쿤데라는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환상을 유쾌하게 무너뜨린다.
<느림>(1995)에 이은 두 번째 프랑스어 소설 <정체성>에서 쿤데라는 좀더 직접적으로 정체성의 위기와 혼란을 다룬다. 쿤데라가 보기에 안정적이고 확실한 정체성이란 착각이거나 환상이다. 정체성의 구성조건이 고정돼 있지 않고 변화하는 한, 정체성 또한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정체성>의 주인공 샹탈은 남편과 이혼하고 연하의 연인 장마르크와 동거중인데 자신이 늙어간다는 사실에 상심한다. 남자들이 더 이상 자신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샹탈의 정체성 위기다. 그녀의 정체성을 떠받치는 데 있어서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연인의 존재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소설은 장마르크가 익명의 존재를 가장하여 연인 샹탈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벌어지는 일들로 엮어진다. 가볍게 전개되는 연애편지 소동극이지만 쿤데라는 정체성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도록 한다.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혹은 갖고 있다고 간주하는 안정적인 자아 이미지이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한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다. 반대로 정체성에 대한 고집과 맹신은 우리를 진실에 대한 몰이해와 오류로 이끌 것이다. 쿤데라와 함께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질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