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이면 내가 일어날까봐 조바심내며 텔레비전을 보는 옥찌들. 오늘, 지희는 피곤했는지 감기 때문에 코를 골며 자고, 민은 냉장고를 척 열어 빵을 가져와 선심 쓰듯이 할머니에게 드시라며 줬다고 한다. 내가 반송장이 되어서 방밖으로 기어나올 즈음엔 옥찌들의 텔레비전 시청은 거의 끝나가고, 슬슬 소꼽놀이 준비를 시작한다. 반쯤 감긴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면 요놈들은 '너는 애기할래?'란 표정으로 나를 힐끔거려준다. 그러면 짐짓 텔레비전 본걸 모른척하고선 신나게 청소나 한번 해볼까라며 아이들을 부추기고, 잽싸게 아침을 먹은 다음 밥을 차리기 시작한다.(나 졸면서 페이퍼 썼나봐. 아침 먹는데 또 밥 먹는대. 본래 하고싶은 말은 아침을 먹은 다음 청소 시작?) 옥찌는 여전히 맛이 있네 없네 타령이고, 민은 무엇이든 오케이다. 거기에 칭찬까지 곁들여지면 사정없이 먹어주신다.
청소를 하고, 순식간에 몸이 늘어져선 뒹글대며 책을 보고 있는데 옥찌는 심심한 표정으로 방안을 몸으로 슥슥 휘저으며 다니고 민은 블럭을 자꾸 방안에 던져댔다. 그래서, 산에 갈까 했더니 눈들이 반짝인다. 옷빨리 입기 시합을 해서 정신없이 준비를 끝내고 바깥으로 나갔는데 웬걸, 날씨가 코끝이 얼어버릴 정도로 추웠다. 볕은 참 좋았는데... 계획 수정! 전에 딱 한번 버스를 타본적이 있는 옥찌들. 다시 탄 버스가 역시나 신기했나보다. 잔뜩 신이나선 창문 밖을 둘러본다. 그런데 옥찌가 나를 쳐다보며
-이모, 그런데 왜 어디 가는지 말 안 해?
한다. 그래서
-응, 칼국수 먹으러 갈거야. 거기에 맛있는 대추차도 있어. 불도 피워서 분위기도 좋아.
이랬더니
-아니, 아저씨한테 왜 말 안 해?
아, 택시타면 목적지를 말하는데 버스 아저씨한테 어디 가는지 말을 안 하는게 이상했나보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버스는 아저씨가 맘에 드는 곳을 들르는데 우리가 내리고 싶을 때 벨을 누르면 된다고 말을 해줬다. 옥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곤 민이랑 창밖을 둘러봤다. 커텐을 쳐도 창문을 닫아도 겨울은 코끝에 쨍하고선 와 있었다.
예인촌은 주말인데다 바람이 차가워서인지 손님이 많았다. 불가 쪽에 앉아서 낚서장에 그림을 그리며 음식을 기다렸다. 무슨 볼펜을 쓸건지로, 볼펜을 주네 안 주네로 민은 깨어난지 몇시간도 안 됐건만 벌써 몇십번째 삐졌다 토라졌다 다시 다시 좋아졌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잘 타일러야는데 아주 날 잡아서 삐지는 것 같아 안 데리고 다닌다, 밖에 세워둔다며 참 어른스럽지 못하게 협박을 했고, 삐짐의 원인제공을 담당한 옥찌께서는 짐짓 모른척을 해댔다. 민의 삐짐 얘기를 하다보니 오늘 발견한 민의 면모 중의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든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것. 저녁에 뭘 만든다고 부산스럽게 움직이는데 민이가 하얀통에 있는걸 보고선 그건 뭐냐고 물었다. 양파라고 했더니 양파? 양파? 이러더니 금세 조용해지는거다. 불현듯 불길한 예감이 들어 뒤돌아봤더니 양파를 꼭 자기 눈으로 확인하려고 통을 낑낑대며 열고 있는게 보이는거다. 이런 민인지라 온갖 말짓의 각 분야를 두루두루 담당한게 아닐까란 생각. 사실 옥찌의 사전 지시와 은근한 부추김이 한몫하긴 했지만.
먹음직스러운 깍두기와 김치, 칼국수와 수제비. 민과 나는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다. 옥찌는 뭐가 맘에 안 드는지 맛있다고 하면서도 어거지로 먹는 기색이 역력했다. 민은 거의 나랑 같은 양을 먹고선 배가 터지려고 한다고 한번 만져보라며 헤헤거렸다. 그러다 뻥터지면 큰일이겠다고하자 그런것쯤 문제없다는 듯 씩 웃는데 녀석, 삐질땐 언제고. 에이, 귀엽잖아. 밥 먹고 난 후의 후식으로 쌍화차와 대추차를 먹었다. 먹어보라니까 옥찌는 질색을 했고, 민은 역시 한번에 다 먹어헤치울 기세로 덤벼들었다. 주인 아저씨가 서비스로 레모네이드를 주셨는데 옥찌는 오늘 먹은 것중에 처음으로 화색을 지으며 맛있어 했다. 얜 왜 한두차례 가공된 음식만 좋아하는지, 이런 식습관은 어떻게 바꿔야할지 모르겠다.
배를 든든하게 한 다음 작은 도서관에 갔다. 아, 아이들도 많고, 아이들 책도 많고, 도서관도 따뜻했다. 옥찌들은 한자리씩 차지하고 자동차와 만화로 된 책을 보기 시작했다. 나는 밥 먹었으니 한숨 자야겠어 엎드려 있었는데 민의 징징 소리에 꺠고 말았다. 민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주의를 주다 머리를 콩콩, 아... 너무 두서없이 여러 얘기가 한꺼번에, 걷잡을 수 없이, 말에 굶주린 것처럼 이러고 있다. (읽기 좀 지겹죠? 여기까지 안 읽었을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쓰다보니 좀 지겨워졌어요. 이런 글쓰기는 좀 지양해야는데,
오늘 들었던 생각,
도서관에서 계속 물을 먹는 아이가 있었다. 작은 컵이지만 계속 먹는게 예사롭지 않아 물어봤다. 왜 그렇게 물을 많이 먹는건지, 아이는 매워서 그런다며 손을 내미는데 거기엔 라면 스프가 들려 있었다. 아, 점심을 안 먹었니? 여차하면 뭐라도 사다줄 생각으로 물어봤는데 아이는 그건 아니라고 했다. 나도 안다. 라면 스프 정말 맛있다는 것. 그런데 몸에 안 좋을텐데(정말 안 좋은걸까? 이건 몇세대가 지난 후의 전수조사로 밝혀지지 않을까란 생각인데, 가공이니까 무조건 나쁘다였나?) 양육자는 아이가 라면 스프를 먹고 다니는줄 알까? 아까 보니까 과자도 먹던데. 아이는 혼자 도서관에 오는게 낯설어 보이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재미있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양육자와 떨어져 있어서 불안할까?그럼, 나는 그래도 옥찌들을 어쨌든 잘 데리고 다니니 책임있는 양육자일까? 책임이란게 그저 옆에 있어서 뭔가를 감시하는 협의로 본다면 책임이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이란 좀 부정적인게 아닐까? 여러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그 중에 제일 맘에 걸렸던건, 다른 아이의 건강까지 염려하는 주제에 실은 옥찌들에게도 내가 귀찮거나 옥찌들이 너무 원하면 아무거나(정성을 안 들였거나 정성을 들였어도 별로 안 좋을게 뻔한 음식, 너무도 편하게 바로 먹을 수 있는 조리식품, 달기만 하고, 배만 부른 영양가와는 무관한 식품) 먹이는데 이건 좀 기만적인게 아닐까란 생각. 그건 여러 측면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인 것 같다. 예컨대 나조차 취업을 못했으면서 20대 실업률에 대해 고민한다는거나, 나조차 지역성이나 애국심에 호소하는 판촉이 구리다고 생각하면서 때론 나 자신의 정체성을 그런 쪽으로 위치시켜 호소하고 있다는 식의 생각. 이건 좀 더 생각을 해볼 밖에.
옥찌들은 무려 두시간이나 도서관에서 자고, 나는 시사인을 보다, 철학책을 보았다. 그리곤 요새 재미를 붙이기 시작한 아이들 그림책을 보고선 그림을 그렸다. 이걸로 아이들이랑 그림 그릴 때 써먹으면 완전 대접받는다. 돌아오는 길에도 추웠지만, 우리 그래도 방에서 뭉기적대다 서로 아귀처럼 안 싸우고 이번 주말도 잘 보내고 있다는 뿌듯함에 슬쩍 어깨가 으쓱거려지기도 했다. 무어 대단한 외출씩이나 했다고!
>> 접힌 부분 펼치기 >>
|

뒹글뒹글대며 책을 보다가... 민이 보는 책은 인어공주, 물방울로 변한게 아니라 왕자랑 잘 사는 쪽으로 결말이 바뀌었다.

여기는 예인촌, 단체 손님이 많아서 준비한 깍두기

요래 삐지는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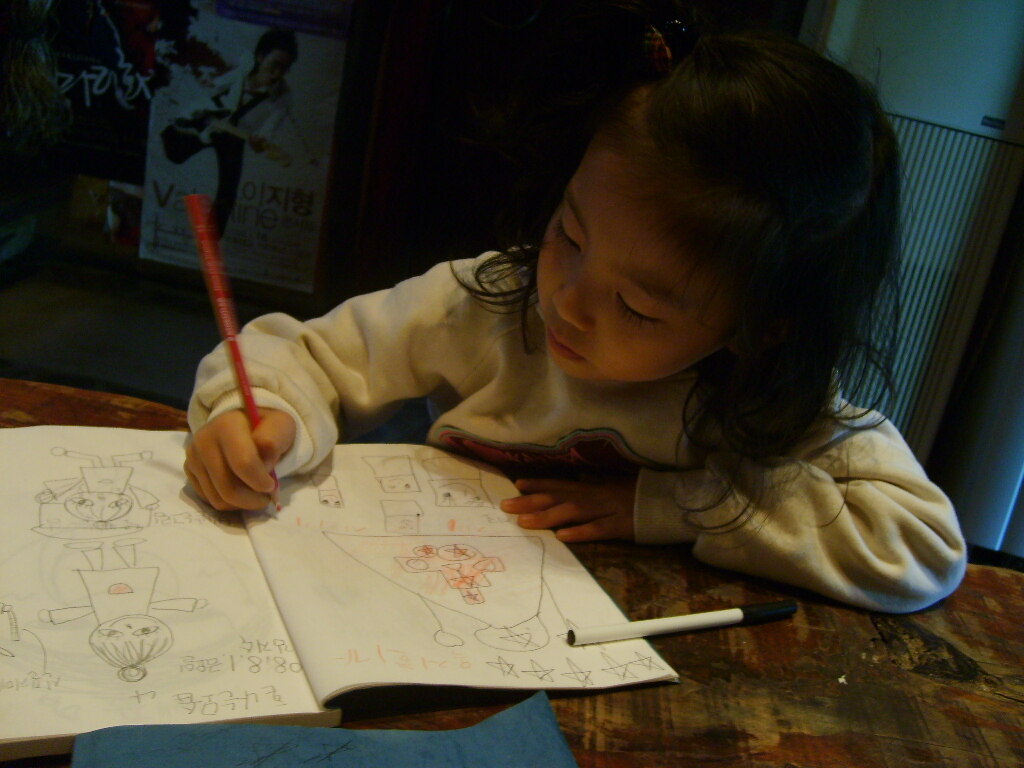
신나게 별과 하트를 그려넣는 지희

아, 레모네이드 홀릭!
|
<< 펼친 부분 접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