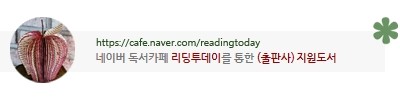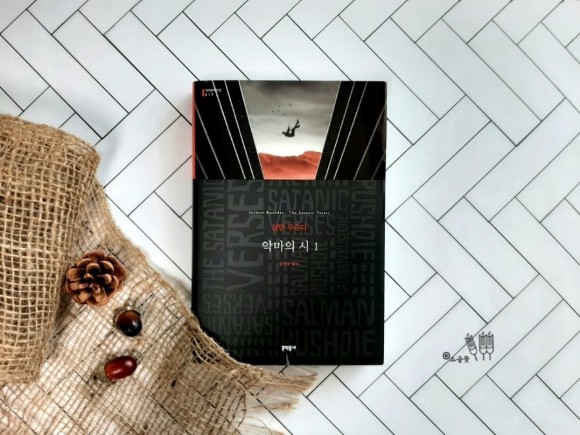
악마의 시1
살만 루슈디 (지음) | 김진준 (옮김) | 문학동네 (펴냄)
"다시 태어나려면 우선 죽어야 한다네."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생명을 되찾은들 무슨 소용인가요?"
-<악마의시1>본문 13페이지,56페이지 중에서
선한 얼굴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 악을 행하며 살아가다가도 어쩌다 선을 행하는 자들도 있다. 종교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느 종교를 막론하더라도 사랑과 평화, 용서를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과 죽음, 배척은 얼마나 많았고 얼마나 잔혹했었나. 신을 믿어야하는 종교가 신의 사자라 자처하는 사람들을 믿고 따르게 되면서 변질되는 신앙은 그들이 그토록 부르짖는 유일신이 바라는 일은 아닐텐데.
꿈을 통해 대천사 지브릴로 변한 지브릴 파리슈타와 악마로 변한 살라딘 참차를 통해 대비되는 선과 악이 가장 눈에 두드러지지만 <악마의 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선과 악만이 아니다. 남과 여, 제국과 식민지, 강자와 약자, 평등과 차별, 꿈과 현실 등 토론의 주제로도 충분한 주제들이 끝없이 나열된다.
테러리스트에 의해 폭파된 비행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두 주인공 지브릴 파리슈타와 살라딘 참차의 현실같은 꿈, 꿈같은 현실이 내용의 큰 줄기를 이루며 5부로 구성된 <악마의 시1>은 홀수부에서는 현실이, 짝수부에서는 꿈과 현실이 교차되며 그 모호한 경계에 작품을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다.
영화에서 각종 신의 역할을 맡아 연기해왔던 지브릴은 비행기 추락후 후광이 생기며 천사로, 이민국 직원들에게 수모를 당하며 배척당하는 살라딘은 외모조차도 악마로 변하게 된다.
이민자인 살라딘은 자신의 근본을 거부하고 영국인이 되고싶은 열망에 백인인 아내와 결혼하지만 이들 부부에게는 사랑도 없고 아이도 없다. 아내인 파멜라는 살라딘이 인도인이어서 자신의 인생에 반항하는 심경으로 결혼했을 뿐이다. 이민국 직원들에게 끌려가며 겪는 수모 또한 살라딘이 그토록 벗어나려 했던 자신의 정체성으로 부터 벗어나지 못한채 자신이 염원하던 영국인으로도 융화되지 못함을 상징한다.
지브릴의 꿈에서는 당시 메카 사람들이 마훈드와 신생 종교였던 이슬람을 배척하는 과정이 묘사된다. 대공 아부 심벨이 마훈드에게 라트, 미나트, 우자 세 여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요구하며 쿠란에 악마의 시를 포함하라는 요구를 한다. 이슬람의 대중적 포교를 위해 타협을 고민하던 마훈드는 자신이 암송했던 시가 악마가 대천사로 가장하여 속인 악마의 말이었다며 시의 수용을 번복하게 된다.
책 속에서 거론되는 마훈드의 인간적인 고뇌, 대중적 포교를 위한 우상숭배에 관한 교리의 타협과 이민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거부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살라딘을 악마로 표현한 것이 겹치면서 살만 루슈디를 오랜 시간 파트와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한 것 같다. 아직 1권 밖에 읽지 못했지만 살만 루슈디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슬람과 마호메드에 대한 비판은 아닌 듯 한데 일부 종교인들의 극단적인 행동과 편협한 사고가 안타깝다.
2권에서 계속될 이야기에서는 어떤 현실이 지브릴과 살라딘을 기다리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