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 같이 읽어보고 싶었다.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어떤 책을 잡는 순간에 기다렸다는 듯이 또 다른 책이 떠오르기도 하니까. 그러니 같이 읽어준다면 그 독서 여행에 대해 훨씬 더 깊이 있게 파고들 수도 있겠다. 가령, 이런 책들이다. 내가 생각하는 서로서로 잘 어울릴 듯한 책들!!



『네가 있어준다면』을 남들보다 좀 일찍 읽으면서 비슷한 류의 책을 읽은 경험이 생각났다. 『로라, 시티』도 생각났고, 리처드 매더슨의 『천국보다 아름다운』도 떠올랐다. 또 고스트들의 사랑을 다룬 『고스트 인 러브』나 이사벨 아옌데의 『파울라』가 생각나기도 했다. 물론 따지고 보면 모든 이야기는 다 다르다. 통하는 게 있다면, '영혼'이라는 것이라고나 할까.『네가 있어준다면』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에 있는 미아의 영혼(?)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선택을 하는 과정을 그린 대단히 감동적이 이야기이고(특히 엔딩이 아주 기억에 남는), 『로라, 시티』는 죽은 나를 위해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어야만 갈 수 있는 '시티'에 관한 아주 독특한 영혼의 이야기였으며, 『고스트 인 러브』는 사랑에 빠진 영혼들이라는 점에서 좀 판타스틱했고, 『천국보다 아름다운』역시 앞부분에선 『네가 있어준다면』과 비슷한 듯 했지만 결국은 죽게 된 남편이 가게 된 천국(!)과 그 남편을 잊지 못해 자살을 한 아내가 가게 된 지옥(!)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 역시 판타지가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네가 있어준다면』과 가장 잘 어울리는 책은 이사벨 아옌데의 『파울라』가 되겠다. 희귀병으로 의식불명이 된 딸에게 보내는 엄마의 사랑. 죽음이 아니라 의식불명이라는 점에서. 물론 『파울라』역시 '의식불명'을 빼면 전혀 다른 이야기이지만 말이다.


『네가 있어준다면』을 읽고 위의 책들을 떠올린 후 내가 읽기 시작한 다른 책은 『여행자의 독서』였다. 이 책은 저자가 마치 여행지에서 책을 읽기 위해 여행을 떠난 느낌을 가지게 했다. 그만큼 여행지와 함께 선택한 그의 책은 탁월했고, 여행을 떠날 때도 책을 놓지 못하는 책중독자들에게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책을 읽어보렴' 하고 알려준다. 이 책을 읽으니 김경의 『셰익스피어 배케이션』이 생각났다. '셰익스피어 휴가'라는 내게는 생소한 여행을 떠난 그녀가 여행지에서 읽어대는 책들 역시 그 여행지와 잘 어울리는 책들이다. 『리스본행 야간열차』를 읽고 28번 전차가 다니는 리스본의 언덕길로, 『몰타의 매』를 읽고는 몰타로 떠나는 여행이라니. 이 두 권의 책을 비교하며 나는 나만의 여행지에서 읽을 책들을 골라본다. 아일랜드로 간다면 『더블린 사람들』을 들고 갈 것이고, 뉴욕으로 간다면 『뉴욕 삼부작』을, 그리스로 간다면 『그리스인 조르바』를 가지고 갈 것이다. 앗, 근데 너무 편협?! 그래도 뭐.


『여행자의 독서』를 읽은 후 내가 잡은 책은 『교실 밖 아이들 책으로 만나다』였다. 삶이 힘든 아이들, 그들에게 힘이 되고 진심을 보여준 한 선생님이 들려주는 교실 밖의 아이들 이야기. 이 책을 읽으며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심리학이 어린 시절을 말하다』라는 책이 같이 읽어보고 싶어졌다. 이건 오로지 내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아이들은 최소한 어린 시절만큼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로 자라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인데 『교실 밖의 아이들 책으로 만나다』의 아이들이나 심리학이 얘기하고자 하는 어린 시절의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어린 시절들에 대해 읽고 나면 교실 밖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이해가 될 것이다. 더불어 만약 심리학 속의 아이들도 고정원 선생님처럼 훌륭한 선생님을 만난다면 유년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일따위는 없을지도 모르는데 하는 생각도 들고. 아이들에겐 그들을 믿을 수 있는 멘토와도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도 한다.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혹은 고정원 쌤 같은 선생님이든 간에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나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심리학이 어린 시절의 상처따위는 연구하지 않아도 될 텐데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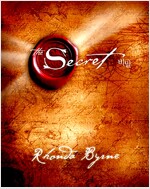
다음으로 읽은 책은 『괜찮나요, 당신』이다. 이 책은 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자기계발서라고 할 수도 있다. 살면서 한번쯤은 겪을 위기의 순간, 맘에 들지 않지만 안정된 삶을 살 것인가, 힘들겠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꿈꾸어왔던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직 경험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분명 한번쯤은 그런 고민에 빠질지도 모른다. 그 시기를 이 책은 서른으로 잡았다. 결혼을 하기에도 안 하고 살기에도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기에도 그렇다고 무작정 현재만 생각하면서 놀기에도 뭔가 걱정이 되는 시기, 아마 딱 삼십 세 정도일 것이라 나도 생각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시기가 빠른 사람은 스무 살에 겪을 수도 있고, 늦은 사람은 마흔이 되고서야 그런 고민에 빠지기도 할 테니. 물론 나 같은 사람은 두어 번 경험하기도 했다. 또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와 닿은 것은 '긍정'이다. 긍정의 힘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이다. 그런 비슷한 류의 책이 바로 떠올랐는데 그건 바로 『시크릿』이다. 와우, 우우우~ 하는 원성의 소리 들린다. 그렇다면 이건 내 얘기이므로 내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라 해두자. 어쨌든 난 『시크릿』으로 '긍정의 힘'을 가졌으니까. 그러니 만약 『괜찮나요, 당신』을 읽고 그 기운을 더 받고 싶다면 『시크릿』을 한번 가볍게 읽어보자. 뻔한 이야기 속에 살짝 감동할 수 있다면, 그건 지금 당신이 무척 힘든 상황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일테니까.



다음으로 읽고 있는 책은 『세설』이다. 현대 소설보다 근대 소설이 좋은 이유는 뭔가 통속적이고 세속적이면서도 울림이 있기 때문이다. 스토리가 있고 깊이가 있다. 요즘 나오는 일본 소설들처럼 천방지축 가볍기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미시마 유키오를 좋아하고 아리시마 다케오의 소설을, 나쓰메 소세키나 다자이 오사무를 좋아한다(헉, 글고 보니 미시마 유키오, 아리시마 다케오, 다자이 오사무 이 셋은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 암튼 『세설』을 읽기 시작하면서 떠오른 작가는 바로 아리시마 다케오였다. 내가 몇 달 전에 아리시마 다케오의 『어떤 여자』를 매우 재미있게 읽었기 때문이다. 『세설』의 주인공도 여자다. 네 명의 자매이야기다.『어떤 여자』 역시 자매들이 나온다. 또 여자 이야기다. 한데 둘은 좀 상반된다. 『어떤 여자』의 요코는 현대에서도 보기드문 캐릭터이지만 『세설』의 유키코는 지극히 근대적인 여성이다. 전혀 다른 캐릭터임에도 두 소설이 비슷한 느낌으로 끌린 것은 근대의 일본을 이야기한다는 점이다. 배경으로 나온 일본의 도시나 여자들의 생활상이 재미있다. 원래 우리나라 소설들 중에서도 일제강점기 때의 소설 중 도시를 배경으로 한 소설들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소설들을 읽으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암튼『세설』을 읽는 동안 내내 『어떤 여자』가 떠올랐으니 만약 두 권 중에 한 권을 읽는 사람이 있다면 나머지 한 권도 같이 읽어보면 매우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아, 읽는 김에 미시마 유키오의 『비틀거리는 여인』도 강추!!

처음엔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까워 그냥 간단하게 적어보려했는데, 적다 보니 근 한 달 동안 내가 읽었던 책들이고 그 책들을 읽으며 머릿속에 떠오른 또 다른 책들을 같이 적게 되었다. 사람마다 읽는 책이 다르니 내가 읽은 책을 읽으면 또 다른 책들이 떠오를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떠올린 책을 보며, 이게 왜?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책을 읽으면서 다른 책을 떠올리는 습관은 아주 좋은 것 같다. 꼬리를 물어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책에 대한 흥미가 점점 더 생길 테니 말이다.
어젯밤부터 나는 은희경 작가의 『소년을 위로해줘』를 읽고 있는데 이 책을 읽기 전부터 생각했던 것이 우리나라 작가들이 요즘 앞다투어 내고 있는 소년, 소녀에 관한 책들을 모아보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다. 한데 은희경 쌤의 책을 읽다 보니 이번엔 진짜로 한번 모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뭐, 어쨌든. 그건 천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