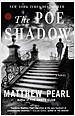이야기의 중심에는 제약사 소유주의 딸 '경'과 테러리스트/광신자 집단의 남자 '태'가 있다. 테러 이후 십수 년이 지나 경과 태가 가해자와 피해자/인질로 만난다. 경은 태를 인격적으로 성적으로 유린하며 집요하게 테러/폭발 사건의 경위를 묻는다.
<고통에 대하여>에는 고통을 지우는 약품을 탐내는 사람들과 고통을 신앙의 증거와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온다. 진통제를 개발하고 이익을 내는 제약회사는 그 신도들에게, 그리고 독자에게도 탐욕적이며 가학적으로 그려진다. (여기서 이해가 안되는게 제약사가 사장/연구소장 아들에게 신약 검사를 한다고요?) 그런데 신비로운 초강력 뉴진통제에 고통 유발제가 들어있고, 종교집단에서 이를 몰래 (강제)오용하다 참사가 벌어진다. 회사와 종교집단 양측 모두에서 진통제 남용으로 인명사고가 벌어진다.
인간사의 다양한 징그러운 요소들이 나오는데 (그만큼 익숙한 전개이지만) 경의 말투나 태도가 중반부까지 읽은 지금 꽤나 거북하다. 태를 성폭행 하는 이유가 뭔가? 고통의 반대일 쾌락을 나름 고통스럽게 그려내는 걸까. 아니면 경의 오빠가 깨친 진리대로 No body, No pain을 설파하는 걸까. 결국 정보라 작가는 <저주토끼>에서처럼 육체성, 우리의 몸에 와 닿아 있는 문제를 다루는 걸지도 모른다. (잠깐만요, 나 머리 아픈 거 같아)
알라딘 책소개 글에도 나오는 마약류 진통제 펜타닐이 떠올랐다. 마침 나의 주말 이틀을 고스란히 잡아먹어버린 넷플릭스 시리즈가 마약류 진통제를 '윤리의식 없이' 팔아제낀 제약 재벌가의 천벌 받는 이야기다. <어셔가의 몰락>. 제목처럼 내용도 에드거 앨런 포우의 시 Raven과 여러 단편들의 조합으로 만들었다.
8부로 구성된 시리즈는 "제약회사의 탐욕으로 판매되는 진통제는 중독 위험이 있고 부작용이 있는데도 비밀로 했기에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 그 책임을 져라!"고 외친다. 그런데 정작 영상에 나오는건 헐벗고 취한 흥청망청 남녀들과 돈자랑+피칠갑+칼부림. 고어한 장면도 많고 동물 학대 장면도 과하다. (애묘인 친구분들은 피하십쇼) 첫화부터 아우슈비츠 가스챔버 생각이 나버리고 인권은 커녕 인명도 소중하게 생각 안하고 그저 자극의 최극단으로 치닫는다.
자, 여러분 아찔한가요? 이런게 마약성 진통제라고. 그래서 으스스해야 할 어셔가 언니가 짠! 출현할 때 클라이막스임에도 나는 멍하니 덤덤하게 과자를 먹으면서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통증이나 잔혹한 장면이나 자극에 점점 익숙해 지는 것이다. 나 원래 섬세한 사람입니다만. 그래서 이 시리즈를 재밌게 봤다고, 추천까지는 못하겠다. 아무리 약물 남용과 모랄 해저드에 대한 통렬한 경고가 제작의도였다 하더라도 눈앞엔 18금의 얄팍한 네러티브였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1840년대에 포우가 발표한 단편들이 사실, 뭐 아주 우아한 글들은 아니었잖아요? 잔인하고 섬찟한 이야기에 깔끔한 추리나 해석이 매력적이죠. 그의 "이야기"의 재미를 즐기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 아니, 그럴 시간에 나는 포우의 원작을 찾아 다시 읽었다. 더 레이븐, 어셔가의 몰락, 검은 고양이, 붉은 죽음의 가면극, 구덩이와 추, 배반의 심장, 황금 벌레, 아몬티아도 술통, 모르그가의 살인 등이 소재로 활용되는데 극중 인물들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애너벨 리와 레노어), 아 얘는 곧 죽겠네, 알게 되는 재미(?)도 있다. 벽에 넣고 발라버리는 악당 꼭 나오고.





흥미롭게도 제약재벌의 우두머리인 어셔가의 쌍둥이 남매는 어머니의 직장 상사 (이름이 롱펠로우!!!) 성착취로 태어난 사생아들이다. 그리고 제약회사(회사 이름이 포르투나토) 직원이면서도 어머니는 고통이 구원이며 신의 은총이라 믿으며 치료를 거부하다 죽는다. 이러니 아이들에게 고통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겠다.
어쨌거나 드라마 시리즈도 다시 읽은 포우 소설들도 재미있었다. 하지만 포우 소설들이 그냥 그런 얄팍한 네러티브는 아니더라고요. 허무랭랑한 유령 이야기로 보이는 소설에서 양심의 가책이랄까 죄의식이 '약물'의 힘을 얻어 아주 생생하고 펄펄하게 터져나와 인물들과 독자를 압도한다. 그러하다. 포우가 170년 전에 만든 이야기는 제대로 약빨고 만든 것이다. 주인공들이 지레 겁먹고 도피하고 무시하고 죽여버린 '그것'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여기엔 드는 '약'도 따로 없다. 얌전히 읽어드려야지 머.
그리하야, 나는 금요일에서 일요일 밤으로 점프해버림. 이야기처럼 강렬한 시간순삭 방책이 더 있을까. 실은 오늘도 정보라 작가의 신작 소설 조금 읽다가 포우 단편 하나 읽고 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정작가가 조금 밀리는 기분.
포우 작품의 재해석 혹은 2차 팬 창작으론 이번 시리즈 말고도 몇년 전에 본 영화 <더 레이븐>이 있다. 무려 마이클 코널리 소설로 만든 작품. 그 영화에서 '진자'의 구체적 모습이 너무나 강렬했는데 이번 넷플릭스 시리즈도 그 기계 장치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더해서 몇 년 전에 읽은 소설 Poe Shadow도 있다.
10월이다. 아무리 강렬하다 해도 이야기보다 지금의 현실이 더 무섭다. 벌써 일년이 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