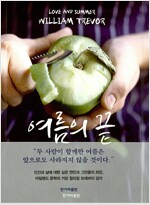
꼼꼼하고 덤덤한 묘사를 따라 읽으며 아일랜드 소도시의 주민들을 상상했다. 코널티 양의 응어리 진 마음과 목걸이, 엘리의 달걀 배달, 그 남편의 목초지 이야기, 플로리언의 방황 등을 따라가다가 지루해서 잠깐 손에서 놓아두었다. 그러다가 새파랑님의 리뷰를 읽고 아, 이것 역시 사랑 이야기구나 싶어서 다시 읽었다.
마침 가게에서 두 사람이 말을 나눈다. 그러지 말걸, 하면서 인사하고 기다리고 서성거린다. 그리고 엘리는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누군가를 욕망한다.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 최악을 각오하며 엘리는 문을 밀어 연다. 무언가가 문 뒤에 걸려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엘리 자신이 대면해야만 한다.
하지만 나는 엘리보다는 코널티 양에 더 마음이 (아무래도 나이가 ...) 갔다. 그녀의 걱정, 그리고 안심과 다정한 상상 너머에서 뜨거운 여름은 가고 순한 가을이 온다. 다음 여름은 조금 더 수월할지도 모른다.
이탈리아에서 사랑의 도피처로 아일랜드를 찾은 플로리언의 부모, 또 모든것을 뒤로하고 노르웨이로 향하는 아들. 점점 더 추운 곳을 향하는 이 가계도에도 연민을 조금 뿌려주기로 한다. 이렇게 뻔한 사랑 이야기인데 트레버의 소설은 어쩜 이렇게 우아한지. 마음이 아파 ...
덧: 표지의 저 칼 나도 있는데 안으로 당겨 깎기 보다는 밖으로 내치면서 (사과 말고) 감자 껍질 벗길 때가 더 쓰기 좋다. 사과를 저렇게 깎다가는 손을 다칠지도 모른다. 내가 그런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