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란 아이 ㅣ 창비청소년문학 50
공선옥 외 지음, 박숙경 엮음 / 창비 / 2013년 5월
평점 : 


나이 순으로 사람의 무게를 잴 순없다.
고작 열 몇살즈음에 들어선 아이들의 삶의 무게는 얼마쯤 되는 것일까.
그 아이들의 두 배 혹은 세 배쯤 살아낸 어른들은 과연 엉성하게 보이는 아이들의 세상보다
훨씬 꽉찬 인생들을 살고 있는 것일까.
참으로 특별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내가 좋아하는 작가 일곱명의 이름이 새겨진 모음집이라 반가웠다.
적어도 아이들의 가늠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해 말하기에는 충분히 자격이 있는 작가들이었다.

엄마와 스 무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경수는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을 하고 살던 집이
불이 나자 고향인 여수를 떠난다. 한 트럭분의 짐이 초라하게 실린 차를 타고 엄마가
사귀고 있는 서울 남자집으로...하지만 그는 흔적도 없고 트럭기사의 고향인 강릉으로
향한다.
"나한테는 여수건 강릉이건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정착한 강릉에서 엄마는 다시 식당일을 시작했다.
여수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강릉으로 오는 사이에 경수는 아무도 모르게 다른 아이가 되어 버렸다.
공선옥, 그녀의 색깔이 한껏 묻어나는 이야기이다. 스 무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경수의 어머니의
모습에서 문득 그녀가 느껴졌다. -공선옥의 '아무도 모르게'-
구병모의 글은 늘 이런 식이다. 깊숙한 어둠같은데서 오송송 피어나는 화려한 독버섯같은 그런.
성냥팔이소녀의 빈곤 벗어나기 프로젝트는 결국 21세기에서도 변함없이 질긴 인도의 카스트제도처럼
어느 시대이건 상위층을 떠받히는 하위층의 가여운 희생을 피를 다 빨려 사라져간 소녀를 투영해
고발한다. -구병모의 '화갑소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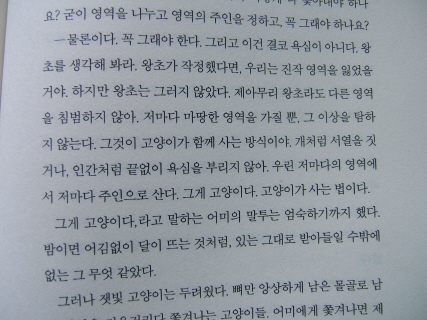
길에서 살아가는 고양이들에게도 자기 영역이 있다고 한다.
비록 거지처럼 쓰레기를 뒤지고 숨어살지만 어미 고양이는 이제 자신의 품에서
떠나야 하는 새끼고양이에게 말한다.
'두렵니? 고양이의 눈은 하늘 가까운 곳에 잊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돼.'
맞다 우린 저마다의 영역에서 저마다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
-이현의 '고양이의 날'-
죽은 딸아이를 잊지못해 뒤이어 태어난 아들에게 딸의 이름을 지어주고 딸아이처럼 아들을
키우는 에미는 파란 입술을 가진 아이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아이에게 덧씌워진 누이의 삶이 아이에게 버겁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것일까.
시골 할머니집에 다녀온 파란 아이는 엄마에게 말한다.
"엄마 이름을 바꿔 주세요. 그리고 사진...그냥 꺼내놓고 보세요, 괜찮아요.:
"많이 컸다. 우리 아들."
"중학생이잖아요."
그래 우리는 아이가 지금 어디 서있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다. 어느 새 훌쩍 자라 외로운 에미의
등을 토닥이는 걸 보면서 문득 내가 어디에 서있는지 깨닫게 된다. -김려령의 '파란아이'-
'열 여섯이면 집을 떠날 만하다.'
그럴까? 아이들의 인권이 존중된다는 미국에서도 열 여덟은 넘어야 한다는데.
수몰된 고향집을 떠나 어디론가 떠나야 하는 아이가 하는 말은 너무 일찍 세상을 알아버린 것같은
안스러움이 묻어난다. 꼭 나이만큼만 세상을 안다는 일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구나.
내품에 있는 내 아이도 이제 마음에서 떠나 보내도 되는 걸까.
뒤를 돌아다 보며 떠나는 아이의 모습에서 자꾸 아들놈의 얼굴이 겹쳐온다. -전성태의 '졸업'-
창비의 청소년문학집은 항상 특별했다.
내가 지나온 길임에도 자각하지 못했던 아픔들을 그린 아이들의 이야기가 항상 나를 부끄럽게 했었다.
50권의 기념하여 나온 이 소설집은 또 한번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달라고
말한다. 그렇다. 지나온 길이라고 그 길을 다 기억할 수는 없다.
아이들을 보면서 생경하게 다가오는 막막함이 느껴질 때,
창비의 청소년문학집은 기억나지 않은 내 사춘기를 끄집어내고 내아이가 지나는 그 길에 이정표처럼 서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