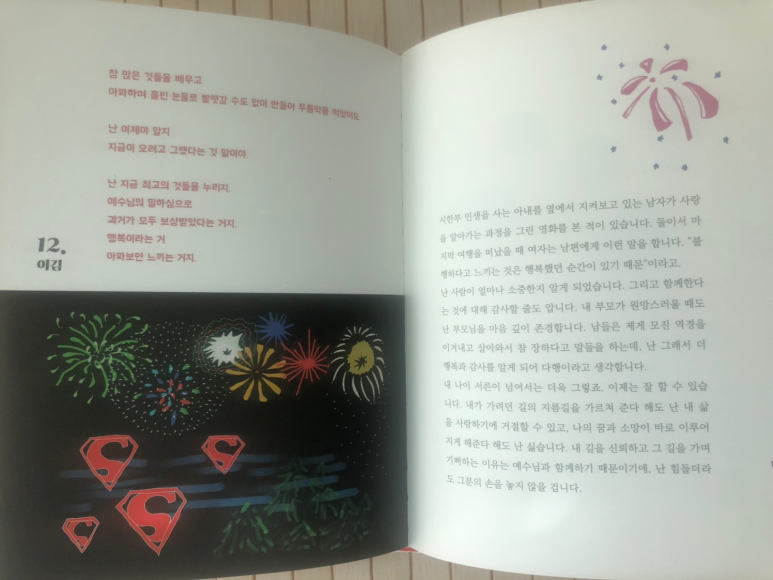어쩌면 내가 읽어본 에세이 중 가장 솔직한 에세이가 아닐까 싶다.
아기자기한 그림들과는 별개로 저자의 솔직함이 책 속에 계속 묻어나있었다.
저자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은 길수 씨, 길 수 아빠, 시골 아빠, 엄마, 친엄마로 썼고 키우준 부모님은 이층 아빠 이층 엄마, 고생했던 지미, 들 꽃 등등 등장인물들의 호칭도 동화처럼 귀여웠다.
시간이 변해감에 따라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 둘 변해간다. 엄마는 어느새 잃어버린 시간으로 집을 헤맬 때도 있었고 엄마를 찾아 헤매는 시간들도 생겼다. 저자의 그동안 있었던 짧은 이야기들도 여운을 남기는 글귀들이 마음 한편에 울림을 주기에 충분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어쩌면 마냥 안식처가 될 수만은 없겠다고 느껴지게 한 것도 책을 읽고 나서이다. 낳아준 부모님과 키워준 부모님이 따로 계시다면 가족을 느끼고 받아들이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그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을 겪게 되며 살아갈까?
저자는 자신을 표현하지 못할 때 감정을 추스르지 못할 때 대부분을 짜증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문득 나 역시도 그러했던 적이 다 반사였었는데 하고 한숨이 내쉬어졌다. 그래도 다행이다. 그럴 때마다 옆에 있어준 남편... 그녀에게 남편은 들꽃이란 호칭으로 쓰여있었다. 꼬까도 남편 들꽃이 부르는 저자의 애칭이었다. 그것이 곧 제목에도 연관된 것이었다. 저자가 살면서 겪은 무수한 이야기들 중 내 마음을 가장 슬프게 했던 건 바로 엄마에 관한 것이었다.
새벽녘 친아빠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엄마가 죽어간다는 소리. 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나도 저런 전화를 받는 순간 몸에 힘이 풀려 주저 앉지 않았을까? 엄마는 심장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기까지... 목에 호수를 달고 눈물만 계속 흘리셨던 엄마를 보는 저자의 마음이 어땠을지 고스란히 느껴지며 몇 년 전 생사를 오가며 대수술을 하셨던 엄마가 떠올랐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은 어느덧 마음의 크기도 커지고 인생의 깊이도 달라지나 보다. 지금까지 어리석게만 지내왔던 시간들을 뒤로한 채 지나간 것들에 반성하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삶을 다시 개척해 나가며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의 삶을 더 잘 들여다보라고... 지금까지 잘 살았노라고 고생했노라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다시금 일깨워주게 한 에세이집이었다. 작가님의 잘나가는 꼬까 언니 2권을 기대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