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전에 마가릿 애트우드의 소설, <그레이스>를 읽으면서 생각했다. 흠. 듣던 거보다 재미가 없군. 그래서 이 책, <시녀이야기>가 그리 호평인데도 쉽게 손이 안 갔던 게 사실이다. 그리고, 이 표지. 진정 이게 최선이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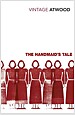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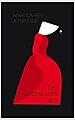




원서들 표지를 뒤지니, 색감은 대체로 붉은 색을 띈다. 하긴, 이 소설에 나오는 '시녀'의 복장이 'red'인 거다. 따라서 표지가 대체로 붉은 건 가능한 일이겠다. 그러나, 우리나라 황금가지 출판사에서 나온 표지는... 암튼 뭔가 별로다. 개취겠지만.
이 모든 난관, 이전 작품에 대한 실망감과 표지 디자인에 대한 못마땅함을 딛고 이 책은 매우 읽을 만한 책임을 내내 느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살짝 어리둥절. 이게 어느 나라 이야기야? 라는 이질감이 있었으나 전개될수록 어떻게 결말이 날 지 이넘의 세상은 왜 이리 디스토피아인 지 궁금해져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출산을 기피하는 가운데에서 불임인 남자들이 늘어나고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진다..가 배경이다. 어느날 일어난 쿠데타 비스므레한 것의 결과로 생긴 국가 '길리아드'에서는 출생률을 늘리기 위한 일환으로 임신이 가능한 여성을 통제하고 억업하여 아이를 낳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한편, 그 주변의 여성들을 계급화시킴으로써 교묘한 폭력사회를 만들게 된다. 그러니까 여성들을 구분하는 방법이라는 게 상당하다, 이거였다.
사령관의 아내이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내'들과 사령관과 그저 섹스만 해서 아이를 갖는 도구로 활용되는 '시녀'들과 그 시녀들을 감시하고 양육하고 정신교육을 시키는 '아주머니'들과 집안일이나 모든 허드렛일을 하는 '하녀'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임신도 못하는, 아무 짝에도 쓸모 없다 여겨지는 여성들은 쓰레기처럼 '콜로니'에 버려지는(非여성이라고 칭해지며) 운명에 놓인다.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는 전체주의적인 사회. 남편과 아이가 있던 주인공은 어느날 잡혀와 '시녀' 신세가 되고 최대 권력자인 사령관의 아이를 갖도록 강요받는 신세가 된다. 그러니까 권력이란 걸 쥔 남자 하나를 두고 수많은 여성들이 강요받는 삶, 억압받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세상인 것이다. 아. 정말. 이게 뭐냐고. 그리고 그 권력의 중심엔 '性'이 있다.
달걀을 깨지 않고 오믈렛을 만들 수는 없소.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오.
더 좋은 세상이라고요? 나는 조그맣게 되뇐다. 어떻게 이걸 더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더 좋은 세상이라 해서, 모두에게 더 좋으란 법은 없소. 언제나 사정이 나빠지는 사람들이 조금 있게 마련이지. (p366)
언제나 사정이 나빠지는 '여자들'이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늘 우리 부서의 동료 직원(여성)이 이야기해준 게 있다. 자기 아는 언니가 오피스텔에 사는데, 어느날 화장실에 가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막 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하더란다. 처음엔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거짓말 하지 않고 20여 분을 계속 쾅쾅 두드리는 바람에 완전히 겁에 질려 집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나타내지 않기 위해 변기물도 못 내리고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조용해지고 난 후 떨리는 손으로 관리실에 전화를 걸어서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으니 너무 무섭다, cctv를 확인하고 조치해달라.. 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관리 아저씨가 한다는 말이, "아 그런 일 종종 있어요. 그게 뭐가 무섭다고 그래. cctv 확인할 게 뭐 있어. 그냥 장난친 거거나 집을 잘못 찾았거나 술 좀 먹었겠지." 라면서 끊더라는 거다... 그렇다. 언제나 사정이 나빠지는 사람들이 '조금' 있게 마련이다. 그 아저씨는 모를 거다. 그 고통이 무엇인지. 여자 혼자 사는 집에 그런 식의 행동이, 설사 장난이거나 실수라거나 술주정이라고 해도 얼마나 큰 트라우마를 안기는 지 모를 거다. 남자들은 그런 느낌 받아보지 않고 살았을테니. 위협을 받는다는 느낌. 내가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느낌.
그는 여전히 내 팔을 붙들고 있지만, 말을 할 때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희미하게 척추를 곧추세우고 가슴을 쫙 편다. 목소리는 갈수록 청년처럼 쾌활해지고 명랑해진다. 그가 자기를 과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친다. 그는 남자들에게 나를 자랑하고 있으며, 다른 남자들도 그 점을 양해한다. 이 남자들은 꽤나 점잔 빼는 족속들이라 감히 손은 대지 않지만, 눈으로는 내 젖가슴과 두 다리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듯이 당당하게. 하지만 그는 또한 내게 자신을 과시하고 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신의 힘을 보란 듯이 내게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p410-411)
통제와 억압의 사회 속에서 고작 돌아간 과거의 모습이라는 게 이런 거다. 가슴과 엉덩이를 강조한 옷을 입힌 여자를 끌고 다니며 과시하는 것, 그리고 여자에게도 내가 너를 이렇게 데리고 다닐 만한 권력의 상징임을 과시하는 것. 남자들의 이런 유치하기 짝이 없는 행태. 지금도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여자들을 물건 취급하는. 젖가슴과 엉덩이와 다리에 눈길을 박고 그 물리적 형태 속에서 자신의 위안과 허세를 찾는 가엾은 인간들.
읽으면서, 긴장감 속에 가슴 졸이며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왠지 슬퍼졌던 건 나만일까. 이 모든 상황, 현재의 상황과 이 소설에서 그려진 디스토피아적 상황 그 모두에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