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라는 돌 ㅣ 창비시선 331
송진권 지음 / 창비 / 2011년 6월
평점 : 


시인 송진권은 처녀시집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뼛골에 박힌 선연함을 어떻게 다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 내 시들이 소를 몰고 어둑발 내리는 길을 걸어 / 느지감치 집에 돌아와 저녁상에 앉은 아이의 얼굴 같기를”
시집 제일 뒤편 <시인의 말> 부분이다. 2011년 뻐꾸기 울음 분분한 초여름에 옥천에서 썼다고 밝히는데, 옥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 뭐? 육영수? 아이고 말을 말아야지.
얇은 책 전체를 한 번 읽어보면, 시집을 상재한 21세기, 아직도 주변엔 이런 촌놈 시인이 있다는 것에 먼저 감격하고, 이미 생을 마친 이들에 대한 그리움의 시가 많다는 걸 발견하며, 세계를 제패한 그놈의 충청도 사투리, 오지게도 썼다고 학을 뗀다. 옥천 출신 시인. 자기도 알게 모르게 동향의 거인 정지용을 일종의 표식돌로 했을지도 모른다. 하여간 다른 고장 출신 시인들 평균보다는 더 많이 정지용을 읽고 외우고, 똑같이 써보고 뭐 그랬겠지. 이런 행위를 다 합쳐 우리는 그걸 ‘영향을 받다’라고 한다. 그래서 처녀시집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시의 제목이 <딸레>. 이 시는 정지용이 쓴 제목의 것을 읽어보지 않았으면 감상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 다행히 난 정지용 전집이 있어 시를 찾아 읽어……보는 대신(요새 세상에 누가 복잡한 책장 뒤져 저 깊숙한 곳 어딘가에 있을 걸 찾겠어!) 간편하게 인터넷 검색해서 먼저 봤다.
딸레
정지용
딸레와 쬐그만 아주머니,
앵도 나무 밑에서
우리는 늘 셋동무.
딸레는 잘못하다
눈이 멀어 나갔네.
눈먼 딸레 찾으러 갔다 오니,
쬐그만 아주머니 마자
누가 다려 갔네.
방을 혼자 흔들다
나는 싫여 울었다.
시는 구두점 하나도 중요한 장르. 인터넷에 떠도는 숱한 시들이 정확한지 믿을 수 없어, 결국 책꽂이에서 책 막 빼내고 기어이 저 뒤쪽에 숨은 <정지용 전집> 꺼내 확인했다. 역시 인터넷 자료들, 전적으로는 믿을 수 없다. 띄어쓰기하고 구두점에 오류. 다시 고쳐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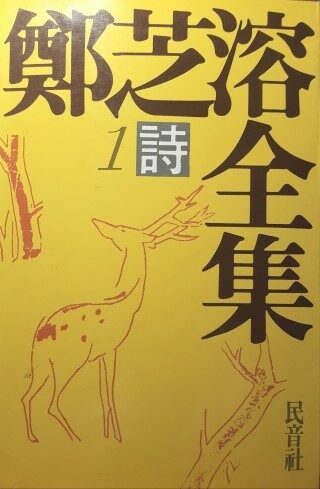
정지용의 <딸레>는 이렇다. 먼저 ‘딸레’라는 이름이 참. 이런 것도 공명이다. 앵도, 즉 앵두를 딸래, 라는 듯한 발음의 이름. 하여간 그런데 어찌어찌하여 눈이 멀어 나와 딸레와 쬐그만 아주머니, 세 명으로 이룬 동무 가운데 사라졌고, 딸레가 어디 갔나 싶어 내가 찾으러 갔다 오니 그 사이에 또 쬐그만 아주머니까지 없어져, 이제 혼자가 된 나는 그게 싫어 울었다는 시. 이 정지용의 <딸레>는 송진권에 의해 이렇게 변주된다.
딸레
송진권
앵두나무 아래서
딸레를 데리고 가자
쬐그만 아주머니는 두고 가자
바구니에 담아둔 앵두는 뒤엎고
물크러지기 시작한 앵두는 흔들어 떨구고
앵두나무 그늘도 흩어버리자
바늘로 딸레 눈을 찌르고
딸레를 안고 어르며
머리를 빗겨주고
곱게 화장을 시켜 내 각시를 삼자
방울을 흔들면
딸레는 노래하고 춤을 추고
딸레는 눈이 먼 채 밥을 짓고
딸레는 눈이 먼 채 빨래를 하고
그래그래 착하지
딸레는 얼굴도 곱고
딸레는 마음도 이쁘고
딸레는 이제 집에도 못 가고 어떡하나 어떡하나 (후략)
변주도 변주 나름이지, 지용의 간결한 시를 풀어 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말았다. 좀 섬뜩하다. 딸레를 내 각시를 삼기 위해 쬐그만 아주머니를 두고 가서, 혹시 나 싫어 도망갈까 바늘로 눈을 콕 찔러 눈을 멀게 한다니, 나 이런 참혹한 우화가 어딨어. 있다, 있어. 손자 하나하고 같이 저 산골 화전 가꾸며 살던 노파가, 이제 손자가 다 커서 암내 나는 아가씨한테 가려고 날 버릴까 두려워져 손자 눈을 후벼 앞을 못 보게 만든, 박상륭의 책 <열명길> 가운데 한 편. 그러나 송진권의 우화는 ‘내’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둘이는 아들 낳고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더래 / 하는 이야기의 끝처럼 살았으면 싶었지만 / 아무 날 아무 때 어딘가로 나갔다 돌아오니 / 딸레도 없고 아이들도 없고 / 옛날의 앵두나무 아래로 가니 / 앵두나무는 베어지고 / 쬐그만 아주머니도 누가 데려갔는지 없고 / 앵두나무 아래서 / 방물 혼자 흔들다 나는 울었다”가 돼버리고 만다.
정지용의 깔끔하고 아름다운 시를 이렇게 만들었다. 결과가 좋든 싫든 간에 하여간. 이걸 만약 정지용의 시를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감상이 되겠느냐 말이지. 그래서,
“* 정지용 「딸레」 변용.”
간단하게 각주를 달고 말 것이 아니라,
“* 정지용 「딸레」를 먼저 보지 않고 시를 읽으면 독자는 오리무중일 걸?”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자, 송진권의 <딸레>는 위, 아래 다 합쳐 전문을 다 옮긴 셈이니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으면 정지용 먼저, 이어서 송진권의 <딸레>를 한 번 더 구경하시압. 근데 많은 시 가운데 하필 이 시 <딸레>를 제일 앞에다 소개했을까? 하긴 뭐, 시인 마음이긴 하지만.
이 시집 가운데 불만 한 가지를 꼽으라면 다섯 편의 단편으로 구성된 시 <산골 엽서> 중에서 두 번째 노래 ‘우렁이 핥고 가는 더운 논물에’를 들겠다. 읽어보자.
우렁이 핥고 가는 더운 논물에
종일 들일하고 들어온 늙은이 둘
하나는 밥을 안치고
하나는 쇠죽을 끓인다
찬장엔 사기대접
파리똥 앉은 백열등
켜켜 그을음 묻은 서까래
밤송이 막아놓은 쥐구멍
이 정지에서 일곱이나 되는 것들이
밥을 먹고 몸을 키워 대처로 나갔다고
김나는 더운 쇠죽 구유에 부어주며
욕봤다 욕봤다
짐승 먼저 먹이고
사람이 먹어야 한다고
상추쌈 싸 공손히 입으로 가져가는 두 늙은이
우렁이 핥고 가는 더운 논물에
노는 쌀방개 등허리에
반짝 모이는 달빛 별빛
짧은 노래의 제목 ‘우렁이 핥고 가는 더운 논물에’는 박목월 「사행시(四行詩) 한 수(首)」에서 따왔다고 각주가 달려있다. 일단 시인이 남의 시에서 제목이 됐건 부분이 됐건 이리 자주 따온 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무엇보다 노래를 다시 읽어보시라. 종일 들일 하고 집에 들어와 밥 짓고 쇠죽 끓여 짐승들 먹인 다음 크게 상추쌈 싸 먹는, 복도 많지, 이(齒牙) 좋은 두 늙은이, 이 늙은이들하고 ‘우렁이 핥고 가는 더운 논물’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지? 나는 모르겠다. 두 늙은이가 쌀방개 등허리에서 반짝이는, 할매는 달빛, 할배는 별빛, 이런 거야? 안다, 알아. 늦도록 들에 나갔다가 돌아와 밥짓고 쇠죽 끓여 소 먹인 다음에 상추쌈으로 저녁 먹은 할매 할배들, 그리하여 이제 밤이 된 풍경을 그렸다는 거. 여기서 쌀방개가 뭔지 아셔? 그냥 ‘방개’를 가리키는 말이다. 더 친절하게 얘기하면 예전 논에서 흔하게 보던 물방개. 검은 연미복을 쪽 빼입은 ‘통통한’ 검은 신사 같은 곤충, 기억나시지? 짙은 연미복처럼 반짝반짝 빛을 반사하는 등허리, 위의 달빛 별빛이 두 이 좋은 늙은이라서 우렁이 핥고 가는 더운 논물 안에서 노는 쌀방개 운운했나 싶기도 하다. 그러나, 시인이 목월의 시집을 읽다보니 “우렁이 핥고 가는 더운 논물”이란 기막힌 구절이 머리에 팍, 박혀서 자기 시 어딘가에 써먹고 싶은 마음이 과했다, 라는 생각은 왜 드는지 모르겠다. 정말 절창이잖은가. ‘우렁이가 핥고 가는 더운 논물’이라니. 그래서 박목월이지, 박목월. 맞아, 다음번엔 목월 한 번 읽어야겠다!
여태 까탈을 잡기만 했는데, 사실 지금 시절에 이처럼 시골스럽게 시를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송진권을 발견했다는 건 행복한 일이다. 동시에, 조만간 이이의 뒤를 이어 (교과서 시 해석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을 빈다면) 토속적 이미지를 이야기로 만들면서 뛰어난 시적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게 쓰는 시인이 또 언제 등장해 맥을 잇겠는지 답답한 생각도 들었다. 지금 시는 너무 현대화, 도시화, 삭막한 비통과 감상의 과잉분비 또는 배설, 또는 추상 이미지, 기호학적 해석 유발 등으로 내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이러다가 느닷없이 읽어본 송진권이 반갑지 않았겠는가. 그의 데뷔 시 전문을 옮기면서 독후감을 끝낸다.
절골
못골 5
고종내미 갸가 큰딸 여우살이 시길 때 엇송아지 쇠전에 넘기구 정자옥서 술국에 탁배기꺼정 한잔 걸치고 나올 때는 벌써 하늘이 잔뜩 으등그러졌더랴 바람도 없는디 싸래기눈이 풀풀 날리기 시작혔는디 구장터 지나면서부터는 날비지 거튼 함박눈이 눈도 못 뜨게 퍼붓드라는구만
금매 쇠물재 밑이까지 와서는 눈이 무릎꺼정 차고 술도 얼근히 오르고 날도 어두워져오는디 희한하게 몸이 뭉근히 달아오르는디 기분이 참 쵸하드라네 술도 얼근허겄다 노래 한자락 사래질까지 해가며 갔다네 눈발은 점점 그치고 못독 얼음 갈라지는 소리만 떠르르하니 똑 귀신 우는 거거치 들리드라는구만
그래 갔다네 시상이 왼통 허연디 가도 가도 거기여 아무리 용을 쓰고 가두 똑 지나온 자리만 밟고 뺑뺑이를 도는겨 이런단 죽겄다 싶어 기를 쓰며 가는디두 똑 그 자리란 말여 설상가상으로 또 눈이 오는디 자꾸만 졸리드라네 한 걸음 띠다 꾸벅 또 한 걸을 띠다 꾸벅 이러면 안된다 안된다 하믄서두 졸았는디
근디 말여 저수지 한가운디서 누가 자꾸 불러 보니께 웬 여자가 음석을 진수성찬으로 차려놓고 자꾸 불른단 말여 너비아니 육포에 갖은 실과며 듣도 보도 못한 술냄새꺼정 그래 한 걸음씩 들어갔다네 눈은 퍼붓는디 거기만 눈이 안 오구 훤하드랴 시상에 그런 여자가 웂겄다 싶이 이쁘게 생긴 여자가 사래질하며 불른께 허발대신 갔다네
똑 꿈속거치 둥둥 뜬 거거치 싸목싸목 가는디 그 여자 있는디 다 왔다 싶은디 뒤에서 벼락 거튼 소리가 들리거든 종내마 이눔아 거가 워디라고 가냐 돌아본께 죽은 할아버지가 호랭이 거튼 눈을 부릅뜨고 지팽이를 휘두르며 부르는겨 무춤하고 있응께 지팽이루다가 등짝을 후려치며 냉큼 못 나가겄냐 뒈질 줄 모르구 워딜 가는겨
얼마나 잤으까 등짝을 뭐가 후려쳐 일어서본께 둥구나무에 쌓인 눈을 못 이겨 가지가 부러지며 등짝을 친겨 등에 눈이 얼마나 쌓였는지 시상이 왼통 훤헌디 눈은 그치고 달이 떴는디 집이 가는 길이 화안하게 열렸거든 울컥 무서운 생각이 들어 똑 주먹강생이거치 집으루 내달렸는다는디 종내미 갸가 요새두 둥구나무 저치 가믄서는 절해가매 아이구 할아버지 할아버지 헌다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