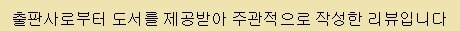-

-
상사는 싫지만 내 일은 잘합니다 - 별난 리더를 만나도 행복하게 일하는 법
후루카와 히로노리 지음, 이해란 옮김 / 현대지성 / 2020년 10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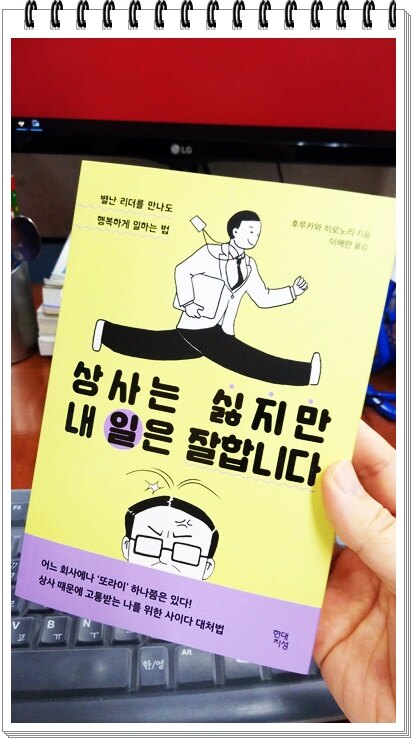
상사는 싫지만 내 일은 잘합니다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들어본 적 있는가?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언제나 어디서나, 일정 수의 또라이가 존재한다는 법칙이다. 내 위에 상또라이가 있다해서 팀을 옮기면 그 팀에도 똑같은 또라이가 있는 식이다. 이직을 해도 마찬가지다. 만약 우리 회사엔 또라이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자신이 그 또라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다. 그 또라이가 나의 상사라면 골치 아파진다. 오늘 읽은 책 <상사는 싫지만 내 일은 잘합니다>에선 나쁜상사의 3가지 유형을 비롯해 그들의 문제점과 우리의 대책을 자세히 다뤘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다. 우린 나쁜 상사를 적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3가지 유형을 살펴보자. 거만하거나 야비한, 주로 ‘성격’에 문제 있는 ‘싫은 상사’,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 에 문제가 있는 ‘무능한 상사’, 마지막으론 책임감이 없는 등 업무를 대하는 ‘태도’ 에 문제 있는 ‘불량 상사’를 크게 꼽을 수 있겠다. 3가지 유형 모두 힘들지만 첫 번째의 경우는 부하 직원을 비롯한 주변인들이 싫어하느냐 마느냐로 주로 결정된다. 두 번째 경우 무능한 상사는 부하 직원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케이스다. 연공서열제의 씁쓸한 부산물인 듯 유감스럽게도 회사엔 이런 유형의 상사가 많다. 연차만 쌓여 과분한 직책을 맡는 것이다. 마지막 불량 상사가 제일 힘들다. 성격이나 능력이 아닌, 태도에 문제가 있으면 회사 운영을 방해하고 업무 환경을 악화하는데 탁월하다. 권력만 좇거나 자기 입장이 불리해질까봐 부하 직원을 교육하지 않는 상사 등이 모두 세 번째 유형에 해당된다. 저자는 싫은 상사와 무능한 상사는 인내심을 갖고 이겨내는 편이 낫지만 불량 상사에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는 척만 한다, 발끈한다, 지시를 자꾸 번복한다, 자기 경험에만 의존한다. 모두 골치 아픈 상황이다. 이런 상사의 행동에 부하직원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라떼는 말이야~” 시전하며 번번이 옛날이야기를 꺼내는 꼰대를 상상해보라. 이런 경험주의자는 한 직종에 오래 종사해 나름대로 나스시시시트이기도 한데 자기 일 외엔 문외한인 경우가 많다. 이들에겐 공신력 있는 통계, 기사 등의 근거자료를 동원해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비스마르크의 명언을 한번 되새기며. “어리석은 자는 경험에서 배우고, 지혜로운 자는 역사에서 배운다.”
똥이 무서워 피하나, 더러워 피하지란 심정으로 이직을 해도 어딜 가나 마찬가지다. 결론적으론 자신의 실력을 키워 상사가 이러쿵저러쿵 참견하지 못하게 하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며, 스스로를 지켜 행복하게 일하는 법이 중요하다. 그것의 일환으로 항상 예의바르게 행동할 것, 상사에게 ‘내줄 살’을 준비할 것, 나쁜 상사도 춤추게 하는 칭찬의 힘을 활용할 것 등을 주문했다. 특히 내줄 살을 준비한다는 건, 상사가 논쟁에서 패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이다. 즉, 작은 일은 타협하되 뼈(결과)만 취할 수 있다면 논쟁에서 이기고 지고는 크게 상관없는 것이다.
또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선 미리 해자를 메우고, 증거를 모으며 혼자서는 덤비지 말라는 조언도 했다. 동료를 늘리고 증거를 남기는 것 등은 상사와 싸우기 전 해자를 메우는 작업과 같다.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단지 개인적으로 후련해지기 위한 싸움이 되어선 안 된다. 회사에서 벌이는 싸움은 나의 의견을 통과시키려는 싸움이어야 하기에. 물론 머릿속에 상사나 간부뿐인 상사도 있어 해자를 메우는 것 자체를 눈치 채지 못하는 상사도 있을 터. 이런 유형이라면 해자를 메우고 다음번 전투에 성을 함락시키는 수밖에 없다.
스트레스가 일종의 향신료라 생각하면 어떨까? 나에게 두통을 주는, 나쁜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예 없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니 나의 실력을 갈고닦아 조직에 도움이 되는 중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쁜 상사와 상관없이 주위에선 나를 인정해주고 난 휘둘리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다. 퇴사를 고민 중인 직장인이라면 실행 전 한 번 이 책을 읽어보길 추천 드린다.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유용한 스킬을 적용해보고 고민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