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벌집과 꿀
폴 윤 지음, 서제인 옮김 / 엘리 / 2025년 6월
평점 :



“삼십 년 전, 1950년. 그 때 주연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 줄 시간이 없었다.”
가장 행복한 꿈의 배경으로도 울고 마는 반복되는 악몽의 배경으로도 어릴 적 살던 집과 동네가 나온다. 환골탈태 수준으로 변한 장소들이라서 현실에선 그 시절과 닮은 면면을 이제 찾을 수 없어도, 꿈속에서는 동네 이웃들의 일상까지 무섭도록 복제된 세팅이다.
나는 오래 전 그곳을 떠났지만, 나의 일부는 그 공간에 깊은 뿌리를 내려서 내가 소멸할 때까지 붙어 있을 작정인지도 모르겠다. 생명은 현실에서도 추억 속에서도 살아갈 ‘장소’가 필요한 걸까. 그 장소가 때론 ‘누군가’가 되기도 한다. 반백이 넘어서야 인간의 생존에 ‘장소’가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가는 중이다.
“저는 지금 당신이 어디 계신지 상상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도요.”
그러니 그 뿌리가 뜯겨나가고 찢겨나가고 떠돌며 살아야하거나 강제로 떠돌게 되는 일,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삶인 일상이 느닷없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이들의 이야기에 소스라치는 격통을 느낀다.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평생 꾼 악몽보다 두려울 때가 있다.
“언제나 이런 식이었을까요? 이 모든 세월 내내, 제가 오기 훨씬 전부터?”
조금은 겁을 먹은 채로 펼친 작품, 반가운 반전처럼 간명하고 속도감 있는 문장들이 걱정도 불안도 잊고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진짜 삶에 감정과잉은 사족이라고, 고통과 상실이 가득한 삶을 안전한 장소에서 담담하게 경험해보라고 다정하게 권한다. 덕분에 즐겁게(?) 다 읽었다.

‘계속 살아가기’로 했다면, 한방 해결, 영원한 해피엔딩, 지속되는 행운, 상쾌한 결말 같은 건 없는, 삶이라는 과다업무를 받아 들여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그 삶을 버티고 견디게 해주는 조건들이 없진 않다. 작품들 속에서 너무 담담한 힌트처럼 드러나 있어서 뭉툭한 울림처럼 톡톡 알아차리는 기쁨에 고맙다.
“신기하지 않니? 우린 이 생을 살다가 또 다른 무언가가 되는 거야. (...) 그런 변화를 두려워해선 안 되는 거야.”
의지도 계획도 운명도 아니기에 눈치를 챌 수도 없는 현실의 수많은 함정들을 마주치며 사는 건 언제든 발목 정도는 접질리는 사고를 감당하는 용기를 요구한다. 어떤 함정은 자력으로는 빠져나오지 못한다. 삶은 시작부터 원망스러울 정도로 운에 달려 있다. 온전한 상실이 태평한 아침 풍경처럼 닥치기도 한다.
“그 광기로부터 안전해질 수만 있다면 전 일평생 기꺼이 추방당해 사는 삶을 택할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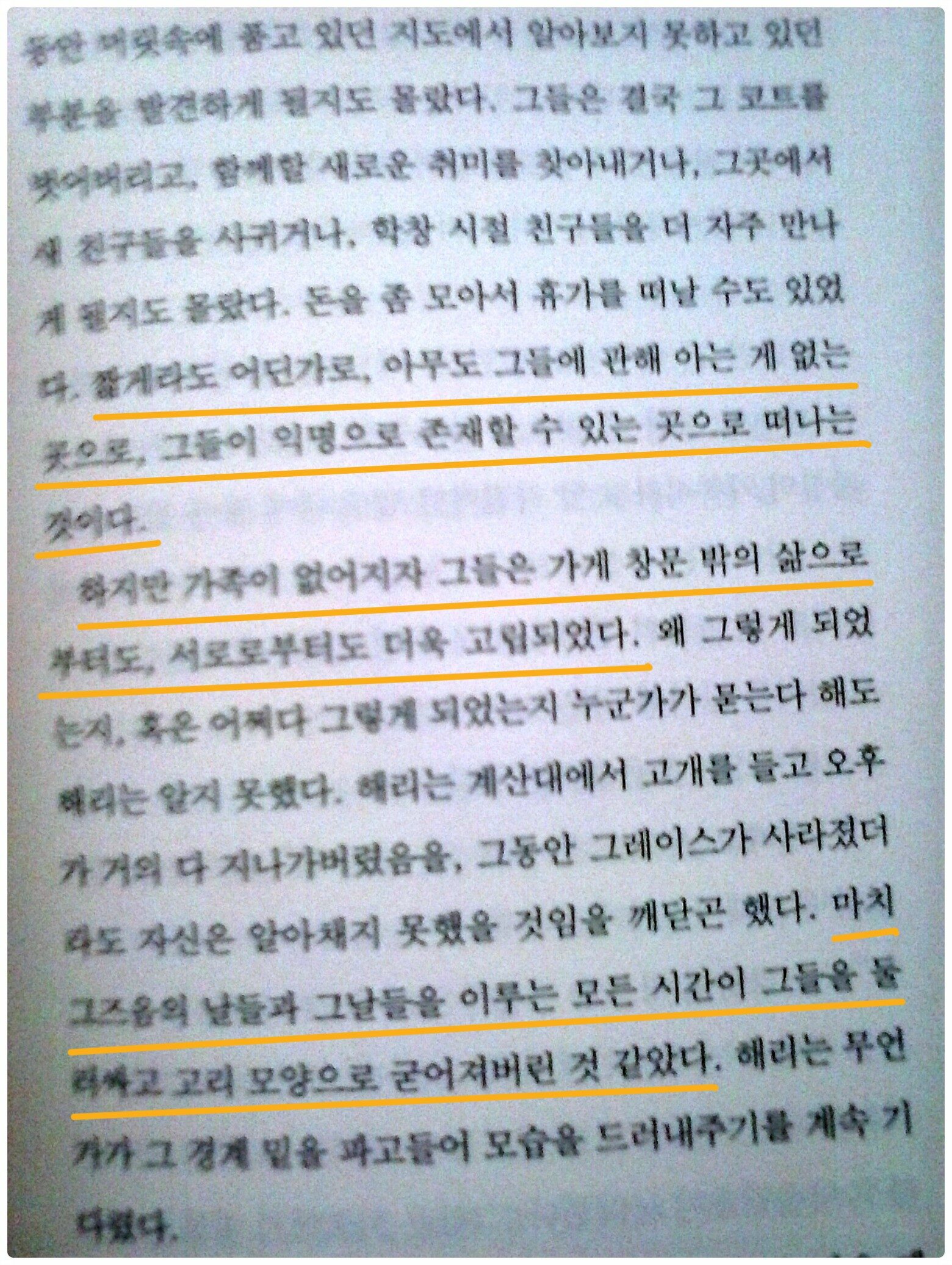
아주 오래 한 문장을 자문했다. 하나도 벅찬 두 문제를 반드시 동시에 해결해야하는 해괴한 저주 같았다. “어디에서 살 것인가”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와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다. ‘미정’을 변명 삼아 지치도록 방황했다. 결정적 손해는 무릅쓰지 않는 겁쟁이 저항이었지만.
해법은 없었지만, 질문이 멈췄다. 늙고 지쳤다. 풀 수 없는 수수께끼와 동행하는 고집스런 방황은 길지 않은 인간의 수명에 조바심을 내며 주저앉았다. 그렇게 그때의 ‘지금 이 자리’가 내 집과 직장과 국적이 되었다. 끝을 끝내 보지 못해서일까. 불면과 악몽은 고발과 질책을 일삼았다.
“이 만남을 둘러싼 오랜 환상을 떠올렸다. (...) 연기하고 있을지 모르는 역할을. 그 갈망을. 갈망으로 채워진 그 모든 세월을.”
그래서일까. 적당한 제정신으로 멀쩡한 척 살다가도, 불빛이 흐리게 하나둘 켜지는 저녁 무렵이면, ‘내가 돌아가는 곳이 내 집인가’하는 서늘한 물음이 경광등처럼 머릿속에 켜질 때가 있다. 마지막 집을 찾거나 새 집을 짓거나 이사 가는 내용으로 겨우 잠든 의식의 에너지를 소진하곤 한다.
생존의 조건과 고비를 넘나드는 이야기들 속에서 어쨌든 살아남기로 결정한 나의 순간들을 떠올리며, 꿈과 기대란 허공을 잠시 울리는 기도와 같다는 생각을 한다. 최선의 최선은 멈추지 않는 다짐과 결심에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운이 좋다면,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결말에 축하나 찬사나 성공이 없을 지라도 살기 위한 모든 선택은 경건하다. 폴 윤 작가의 이야기들은 완독 후 양념처럼 섞인다. 기억과 상상이 복귀를 모르는 전진을 한다. 덕분에 읽는 동안, 이름도 없이 살아남은 아이들과 무덤도 없이 묻힌 사람들 사이를 안전하게 떠돌며, 오래된 나를 기억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