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솜대리의 한식탐험 - 내가 궁금해서 찾아 본 생활 속 우리 음식 이야기
솜대리 지음 / 올라(HOLA) / 2021년 3월
평점 :



솜대리의 한식탐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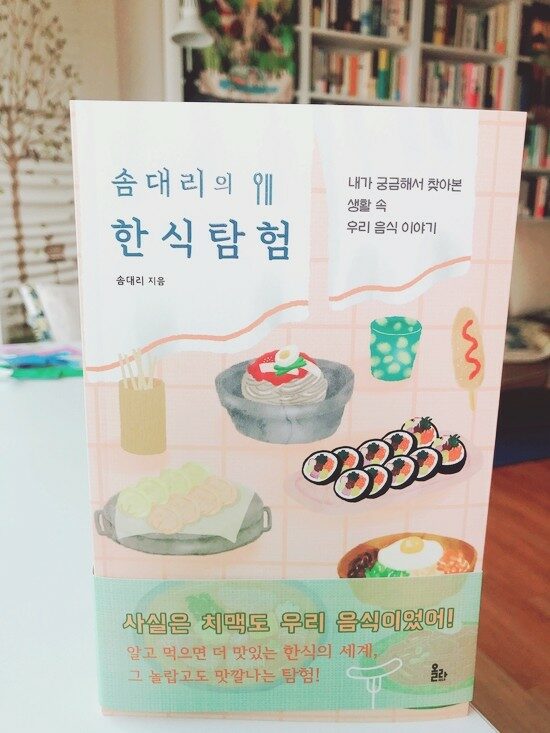
이 책을 살펴보기 전에..
솜대리
저자 : 솜대리
본격 음식 탐험가. 돌 지나서부터 혼자 밥을 먹으며 밥 한 톨 남기는 법이 없었다고 하니 맛있는 음식을 쫓아다닌 지도 30년이 훌쩍 넘었다. 10년 차 직장인이기도 하다. 대리 시절, 나 같은 보통 사람도 재밌게 읽을 만한 음식 이야기를 쓰겠다며 솜대리라는 필명을 짓고 본격적으로 글쓰기에 돌입했다. 어느덧 대리는 한참 지났지만 (만약) 부장이 되고 (혹시) 임원이 돼도 누구나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음식 이야기를 쓰려고 한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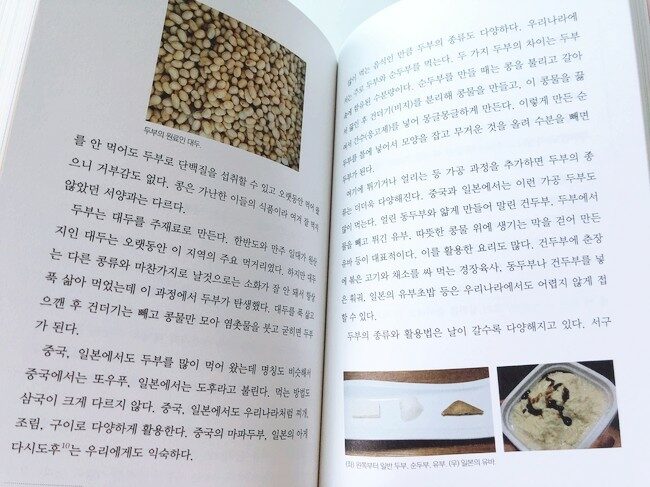
음식과 관련된 책과 영화는
일상의 가벼운 애피타이저로 딱이다.
맛 기행 프로그램을 즐겨 보기도 하고
동네에 새로 생긴 음식점에 대해 궁금증이 많다.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관심있어 하는 '음식'이 주제인지라
이 책에 끌리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특히나 우리 한식에 대한 더 많은 궁금증과
미식의 즐거움을 이 책 안에 고스란히 담고 있어
아침밥을 가득 먹고도 출출함이 몰려온다.
어떤 걸 먼저 읽어볼지 목차를 쭉 보고 있자니
당장의 식사 메뉴에 대한 고민에 휩싸인다.
이토록 맛있는 한식의 매력에
빠지지 않고서는 못 배기니 당장 간단히 김밥에 라면으로라도 허기를 채워야 할까 싶다.
치맥은 이제 어엿한 우리의 문화다.
치킨과 맥주의 조합을 두고 이름을 붙인 곳도, 스포츠 경기를 볼 때마다
당연하게 치맥을 하는 곳도 우리나라뿐이다.
우리나라 치맥의 세계적인 흥행은 음식의 운명에 있어 음식 그 외의 요소,
즉 그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과 그 음식을 둘러싼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p59
치킨과 맥주의 조합은 환상적이다.
야식 배달 음식으로 자주 시켜 먹는 치틴의 메뉴가 다양하고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
어제도 간장, 마늘 치킨을 시켜 먹은 나로서는
불금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쉬움을 치맥으로 괜찮은 마무리를 지었다.
두 음식의 조합이 어찌나 기가 막힌지
치킨의 기름짐을 맥주로 깔끔하게 마무리 할 수 있어
끝도 없이 질리지 않게 들어간다는 표현이 틀리지 않다.
하나의 문화 현상처럼 자리 잡게 된 치맥.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도 즐기는 치맥을
내가 앉은 집에서 편하게 배달해 시켜 먹을 수 있어
행복한 고민으로 후라이드와 양념을 고민하다 반반을 주문하게 되는 마성의 매력에
오늘도 두 손 두 발을 들게 만든다.
젓갈과 식해는 밥반찬으로 많이 먹는다.
짭쪼름한 젓갈을 밥에 곁들이면 그야말로 밥도둑이다.
젓갈 한 종지만으로도 밥 한공기를 뚝딱할 수 있다.
젓갈과 액젓은 요리할 때도 자주 쓴다.
소금 대신 쓰면 음식에 간도 되고 감칠맛도 높아진다.
p249
쌀밥에 짭짤한 젓갈을 올려 먹으면
입맛이 없다고 하면서 밥 한그릇 뚝딱하게 된다.
오징어, 창란, 낙지젓을 좋아하는 우리 가족은
가까운 건어물상회에 단골 집을 가서
떨어질 때마다 가서 다양한 젓을 사와서 먹는 편이다.
명란 파스타, 바게뜨를 최근 먹어 보게 되었는데
젓갈의 향이 살아 있어 좋아하는 음식과 곁들여 먹을 수 있다는 게
독특하면서도 이색적인 경험을 한 기분이었다.
다양한 젓갈과 형태가 바뀌면서
우리 식생활 문화도 변하고 있다는 걸 새삼 느낀다.
김은 대표적인 수출 식품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과 함께 세계 3대 김 생산국이다.
전 세계 물량의 99%을 한,중,일에서 생산한다.
이 중 55%가 한국 김이다. 식품업계 대표 수출 상품이다.
식품업계의 반도체라고 불릴 정도다.
p271
가장 오랜 시간 밑반찬으로 식탁 위를 차지하고 있는 김.
요즘은 김부각에 푹 빠져서 찹쌀 풀을 묻혀 튀긴
그 바삭함에 스낵으로 즐긴다.
그냥 생김 그 자체로 즐기기도 한다.
담백하게 간장양념장에 올려 싸서 먹으면
밥을 먹는 든든함이 채워진다.
곱창김은 다른 김보다 씹는 맛이 좋아서
때마다 공수해서 사먹곤 한다.
재배가 까다롭고 생산량이 적어 가격이 좀 비싼게 흠이지만
자주 먹을 수 있는 김이 아니라
곱창김이 밥상에 오를 땐 다들 김 먹방 삼매경이다.
보관이 좋고 다양한 형태로 김을 사용해 요리할 수 있어
대용량 조미김을 마트에서 사놓으면
든든한 기분이 들어 아쉽지 않게 구비해놓는다.
익숙하게 먹고 있는 음식들의 사연들을
이 책 속에서 더 명확히 풀어놓아 쉽게 재미있게
음식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
친숙한 우리 음식에 대해 더 가까이 다가가
읽고 즐기며 보고 맛보는 재미까지 다양한 감각을
책과 우리집 식탁에서 느낄 수 있어 유쾌했다.
장봐온 봄나물들로 저녁은 비빔밥을 준비할 생각이라
계절의 맛과 향을 음식 속에서 먹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