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걷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 소설가의 쓰는 일, 걷는 일, 사랑하는 일
오가와 요코 지음, 김난주 옮김 / 티라미수 더북 / 2021년 4월
평점 :

절판

걷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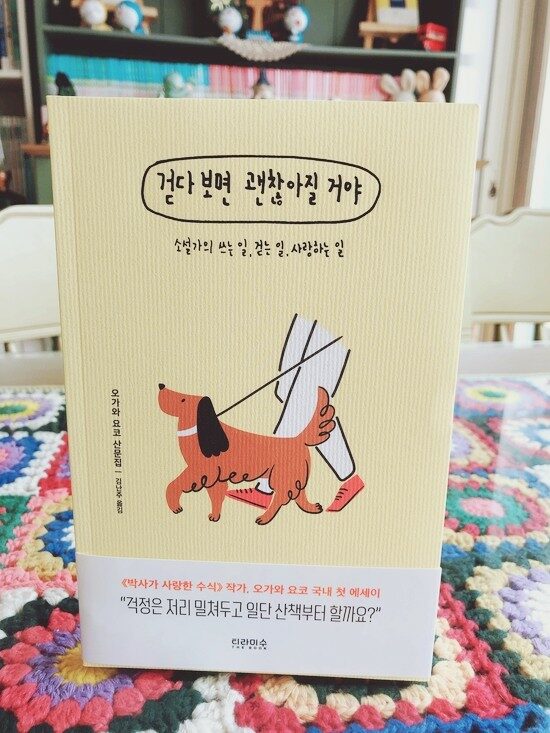
이 책을 살펴보기 전에..
오가와 요코
정적이면서도 기품이 있고, 관능적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는 일본의 여류 소설가. 1962년 오카야마 시에서 태어나 와세다 대학 제1문학부 문예과를 졸업한 오가와 요코는 『상처 입은 호랑나비』로 1988년 가이엔 신인문학상을 거머쥐며 일본 문단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이후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선보이며 독자와 평론가들로부터 꾸준히 사랑 받아온 그녀는 1991년 『임신 캘린더』로 일본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아쿠타가와 상을 수상하고, 2003년에는 『박사가 사랑한 수식』으로 제55회 요미우리 문학상 소설상, 제1회 서점대상 등을 수상하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일본의 대표적인 여류 작가로 자리 잡았다. 2004년 『브라흐만의 매장』으로 이즈미교카문학상을, 2006년 『미나의 행진』으로 다니자키준이치로상을, 2012년 『작은 새』로 문부과학대신상을 수상하였으며, 작품들이 해외 10개국에서 출간되었다. 그 중 『약지의 표본』, 『침묵박물관』, 『호텔 아이리스』는 프랑스에서, 『박사가 사랑한 수식』, 『인질의 낭독회』는 일본에서 각각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되었다. 『약지의 표본』은 1999년 ‘프랑스에서 발간된 가장 훌륭한 소설 20’에 선정되었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지에서는 “일본 문학계에서 실험 정신이 돋보이는 새로운 세대의 작가.”로 호평한 바 있다. 2007년 프랑스로부터 문화예술공로훈장 슈발리에를 수여받기도 했다.
2007년 7월 제137회부터 아쿠타가와 상 심사위원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미시마 유키오 상(三島由紀夫賞) 심사위원, 다자이 오사무 상(太宰治賞) 심사위원, 신초 신인상(新潮新人賞) 심사위원 등을 맡게 되는 등, 일본 문단에서 중견의 지위를 굳히고 있다.
저서로는 『완벽한 병실』, 『바다』, 『고양이를 안고 코끼리와 헤엄치다』, 『원고 영매 일기』, 『미나의 행진』, 『언제나 그들은 어딘가에』, 『상처 입은 호랑나비』(1988), 『완벽한 병실』(1989), 『식지 않은 홍차』(1990), 『슈거 타임』(1991) 『임신 캘린더』(1991), 『여백의 사랑』(1991), 『안젤리나』(1993), 『요정이 내려오는 밤』(1993), 『은밀한 결정』(1994), 『약지의 표본』(1994), 『안네 프랑크의 기억』(1995), 『수를 놓는 여자』(1996), 『호텔 아이리스』(1996), 『상냥한 호소』(1996), 『얼어붙은 향기』(1998), 『과묵한 사체 음란한 장례식』(1998), 『마음 깊은 곳에서』(1999), 『침묵 박물관』(2000), 『우연한 축복』(2000), 『눈꺼풀』(2001), 『귀부인 A의 소생』(2002), 『박사가 사랑한 수식』(2003), 『브라흐만의 매장』(2004)이 있다.
[예스24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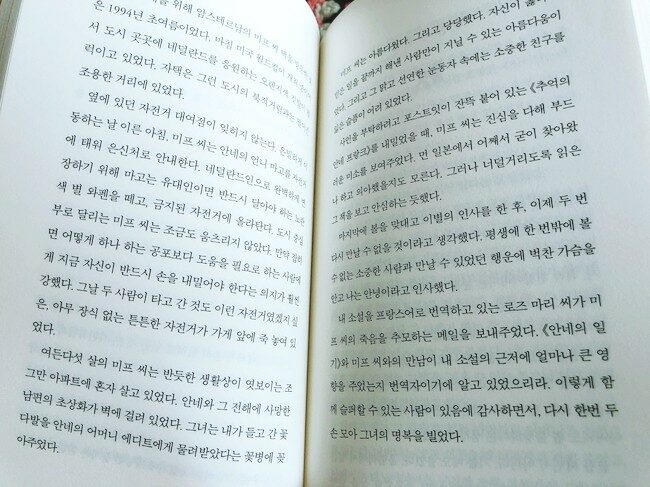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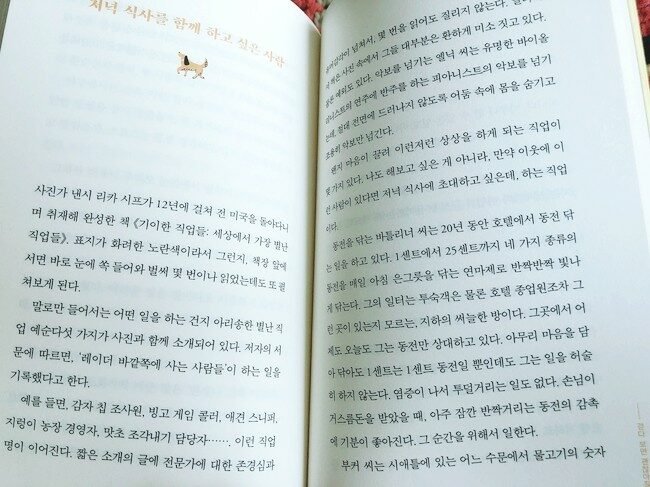
틈을 내서 쉬는 시간이 더없이 필요한 때를 보내고 있다.
몸의 피로보다도 더 누적된 애쓰는 마음을
환기시킬 다른 무엇들 보다도 가벼운 걷기가
나에겐 잡념으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이라 좋다.
그리 잘 걷거나 뛰는 편은 아니지만
집 앞 마실을 나갈 정도의 체력 정도는 있기에
생각이 많아질 때면 아무 생각없이 걷는다.
저자 역시 반려견과 가벼운 산책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완성된 글에 집중하며 산다.
느린 걸음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은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꽤나 효율적인 시간으로 여겨진다.
원고의 마감에 쫓기거나 매번 같은 마음으로
글을 써내려가지 못하는 힘겨운 자기만의 싸움 속에서 지치기도 하고
자기 검열 안에 깊이 빠져 고된 시간을 지속하기도 한다.
그때마다 <곰돌이 푸>에 나오는 이요르 생각을 한다는 건
굉장히 엉뚱한 발상같지만 꽤나 공감이 간다.
한구석에서 조용히 혼자서 생각에 잠겨 있는
다소 어눌해보이는 늙은 당나귀 이요르 말이다.
친구들이 놀러와도 시큰둥하며
자기 꼬리가 떨어질 것 같아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미련스러움이
웬지 모를 안도감과 위로가 되는 건 뭘까.
빡빡하게 나를 코너로 몰지 않는 샘솟는 에너지가 없어서
나를 다그칠 일도 나를 애써 위로한답시고 충고하지 않는
고요하리만큼 잔잔한 상태가 가만히 나를 위로해주는 듯하다.
산책할 때, 몸은 당연히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기분도 같이 따라가고 있는지 의문이 남곤 한다.
오히려 기분은 한 점에 머물러 몸이 지나치는 흔적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다.
p27
몸이 움직이는 만큼 기분 또한 그 속도를 따라가지 않고 있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그냥 멈춰있는 듯 정지 상태라고 해도 나쁜 것이 없다.
적당한 분리됨이 나쁘지 않고
아무런 생각을 해내지 못해도 망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저자 역시 10년동안 하루 두 번 개와 산책하며
좋은 글을 쓰기 위한 아이디어를 떠올려보는 기대감을 가져보지만
번번히 실패하는 헛된 꿈이라고 비유해도 나쁠 것이 없다.
걸을 때조차도 일에 신경 써야 하는
자신이 비참하기도 하지만 별 성과없는 별 소득없는
생각들로부터 내가 좀 더 별개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면 좋겠다.
특별히 주어진 한순간이라고 고맙게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다.
저 아빠처럼 그 순간을 진심으로 즐겼던가.
일상의 하잘것없는 일거리에 마음을 빼앗겨 귀중한 시간을 그냥 지나쳐버린 건 아닐까.
p29
돌이킬 수 없는 한탄과 어리석음이
문득 별 것 아닌 상황 속에서 떠오를 때가 있다.
아무 생각없이 열심히 땀 흘리면 아이를 보다가도
내가 붙잡았던 애씀이 그렇게 괜찮아보이지도
더 나아보이지도 않은 것 같아
그저 해맑게 웃고 노는 아이처럼 살고 싶다란 생각을 해본다.
저렇게 활짝 웃어본 적이 언제였는지..
무탈하게 지내는 오늘에 감사하며
내일 또 걷게 될 걸 생각하면 마음이 가볍다.
생각이 가지런해진다.
쓰다만 소설 앞에 앉아 묵묵히 쓰고 앉아 있을 저자의 모습과
매일 걷는 산책 길에서 좋은 소설을 쓰게 될 기대를 버리지 못하는 모습 또한
나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아 보여 왠지 모를 위로가 된다.
살짝이 땀이 나 비누 거품 마사지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면서
곤히 잠들 밤시간이 포근하게 느껴져서 좋다.
불완전한 모습과 생각을 이끌고
내일도 걷겠지만, 아무렴 오늘도 무사히 보내게 된 일에 다행으로 생각하며
가벼운 산책을 나또한 오래도록 지속하고 싶어진다.
삶의 균형을 적절히 지키는 무리하지 않는 선을 찾아서.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