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토 ㅣ 에디터스 컬렉션 10
장 폴 사르트르 지음, 임호경 옮김 / 문예출판사 / 2020년 12월
평점 :



구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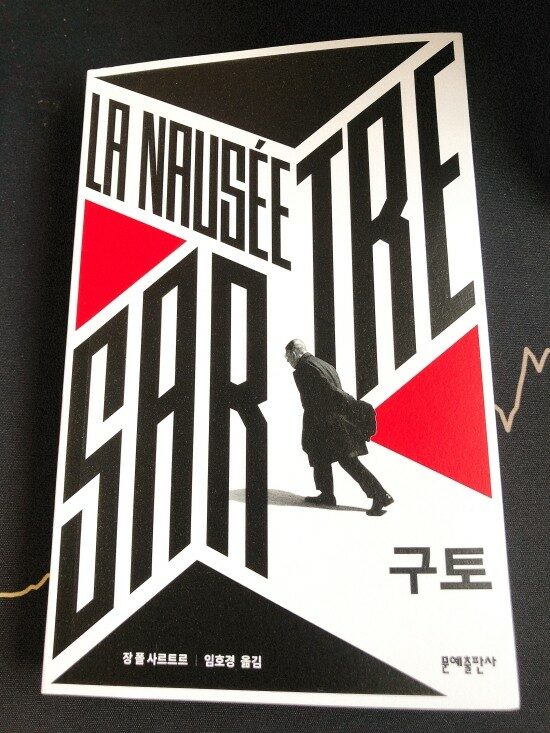
이 책을 살펴보기 전에..
장 폴 사르트르
파리에서 태어나 1929년 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1931-46년에는 교사 생활을 하였다. 학창시절 결합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 1908-1986)와 평생 동반자 관계를 유지했으며, 전쟁 중인 1939년 징집되어 1940년 포로가 되었다가 1년 만에 석방된다. 교사 시절 발표한 일기체 소설 「구토」(La Nausee, 1938)로 첫 명성을 얻은 뒤 여러 편의 철학적 작품들을 집필하는데 그 중 대표는 “인간 의식 또는 비사물성(neant, 無)을 존재, 즉 객관적 사물성(etre, 存在)과 대비시킨” 「존재와 무」(L’Etre et le neant, 1943)일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옹호한 그는 종전 후 사회적 책임에 눈을 돌려 소설과 희곡으로 윤리적 메시지를 전한다. “자유의지와 선택, 그리고 행동”이란 주제는 「파리떼」(Les Mouches, 1943), 「닫힌 방」(Huis-clos, 1944), 「더러운 손」(Les Mains sales, 1948), 「악마와 선신」(Le Diable et le bon dieu, 1951) 등 희곡은 물론 그가 장 주네(Jean Genet, 1910-1986)에 대해 쓴 「성(聖) 주네, 희극배우와 순교자」(Saint Genet, comedien et martyr, 1952)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정치적으로는 분명 좌파였으나 화석화한 현실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며 “공산주의는 다른 구체적 실존상황을 인정하는 법과 인간의 개인적 자유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충고한다. 1964년 자전적 소설 「말」(Les Mots, 1963)이 노벨상을 받게 되지만 수상을 거부한다.
[알라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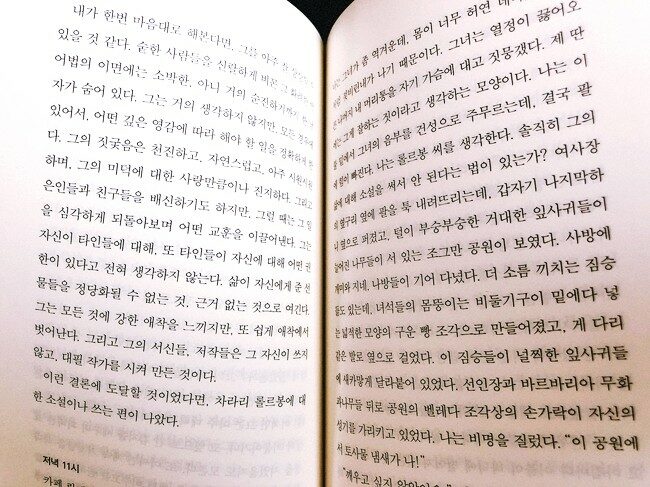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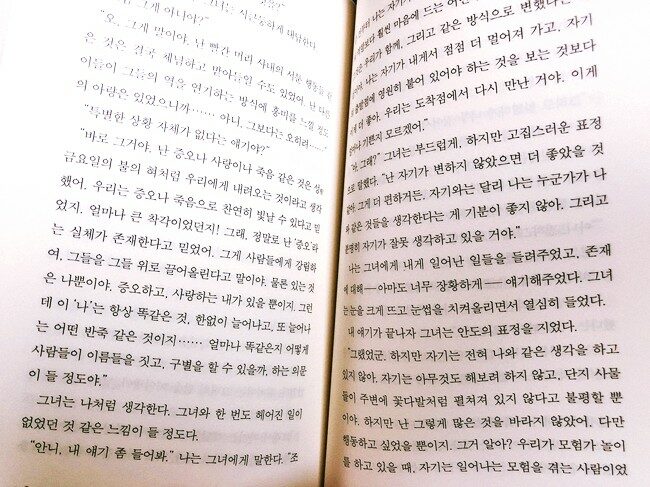
혐오와 공포심.. 인간 실존..
그 근원을 찾아 떠돌다 만나게 된 책 <구토>
본질에 앞서는 실존이란 철학적 개념을 대표하는 작품이 바로 이 책이다.
현대 철학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의 책을
읽게 되는 건 여러번 주저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
철학적 관념과 심리 묘사가 다소 난해 하기에
쉽게 읽히진 않는 책이긴 하다.
그럼에도 한번쯤 읽어봐야 할 책임에 분명하다.
주인공 로캉탱은 현실에 부적응 하며
예민하게 사물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서 구토 증세를 드러낸다.
공허하고 덧업는 자유가 구토 유발의 원인으로 보인다.
구역질을 하며 인간 존재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모습이 책 이곳 저곳에서 나타난다.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친 사회학자이자 휴머니스트인 독학자와
옛 연인 안니의 존재는 이후 쓸쓸한 고독감을 안겨준다.
무언가가 시작되는 것은 끝나기 위해서다.
모험은 한정 없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죽어야만 의미를 갖는다.
이 죽음을 향해 그것은 어쩌면 나 자신의 죽음일 수도 있는데 나는 돌이킬 수 없이 이끌려간다.
p96
안개 속에 잠겨있는 커다란 형태의 전조를 우린 예상치 못한다.
단지 시작되는 듯한 느낌을 알고 있지만 그 끝을 향해 달려가는 건
시작과 동시에 이미 시작되고 있는 일임에 분명하다.
삶과 죽음, 만남과 이별 또한 흘러가버리고 마는 것이다.
붙잡으려 하는 것보다 그냥 지나가게 두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존재의 이유를 찾기 위해 떠난 '모험' 또한
일상적인 느슨함을 되찾을 일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사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나아가는 변주 정도로 보이긴한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
이것을 정확히는 설명하지 못하겠다.
이것은 구토와도 같지만, 또 그와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드디어 모험의 순간이 찾아왔고, 이게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니,
지금 나는 나고, 나는 여기에 있다.
p132
조용한 바스 드 비에유가의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의 삶의 시작을 느낀다.
어두운 현상이 점차 밝아짐을 느낄 때 모험의 시작점이라 생각하는 모습은
행복의 정점에 놓인 것처럼 보여진다.
공허함의 끝자락에서 충일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
그가 애쓰고 있었다는 것에 한껏 예민해져 있다.
그런 그는 주변 사물과 풍경을 장황하게 그려내고 있다.
그래서인지 읽으면서 가속이 붙기보다 조금의 피로감이 쌓이긴 하지만
손에서 놓치긴 아까운 책이다.
이제 내가 '나'라고 말할 때, 이 말은 공허하게 느껴진다.
난 더 이상 나 자신을 잘 느낄 수 없다.
그 정도로 나는 잊혀버린 것이다.
내 안에 실제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자신이 존재하는 것을 느끼는 존재뿐이다.
p391
모든 사물은 '존재'하는 것으로 구속 받는다.
이는 사람의 존재 또한 마찬가지다.
그런 공허함이 자신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행위라 하면
존재자의 존재를 가끔 잊고 사는 나에게 강한 의문을 남기게 한다.
수줍은 구토가 숨어 있는 망쳐버린 삶 같긴 하지만
침울 속에 평온함을 찾아가는 형태가 불편한듯 편해진다.
무질서 해보이는 삶이 낡은 축음기 음반들 뒤편에 기대어박자에 맞춰 고통받고 있는 이 세계를
그는 느린 전율 속에서 흐느끼며 살고 있었다.
이 책을 읽었다 해도 사르트르를 정복하지 못했다는 패배감도 맛보게 되는 건
중간 중간 생각이 잘 정리 되지 못해 배열을 맞추기가 힘들었고 조금은 난해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지루하고 피곤했을 이 작업을
카페에서 빈둥대며 썼던 앙투안 로캉탱을 떠올리며
차마 시원하게 덮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남는 책이다.
실존주의의 서양 철학사를 좀 더 관심있게 꼬리물기하며 읽을 책으로
다음 코스의 책들을 몇 권 더 구비해
보충해 나갈 수 있는 자료들과 함께 이 책을 재독해보고 싶은 마음이 선다.
실존의 개념과 함께 철학적 사고와 함께 구현되었다는 것에
세상에 던져진 인간의 존재를 풀어냈다는 것에 놀라운 작품임에 분명하다.
크게 심호흡하고 존재의 의미를 찾아 천천히 걸음을 떼어 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