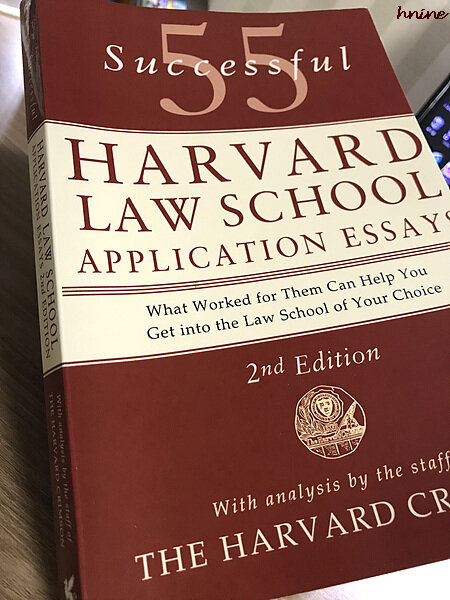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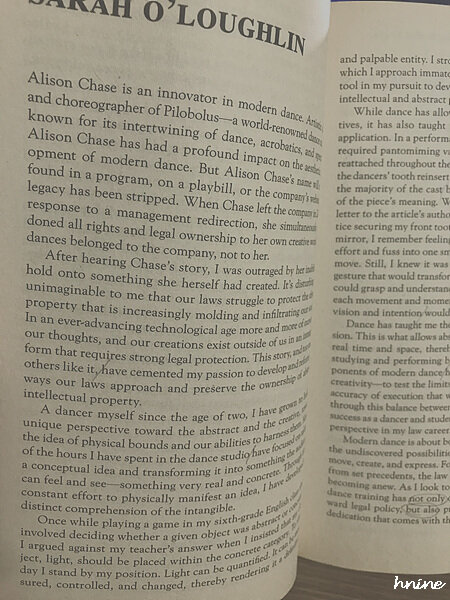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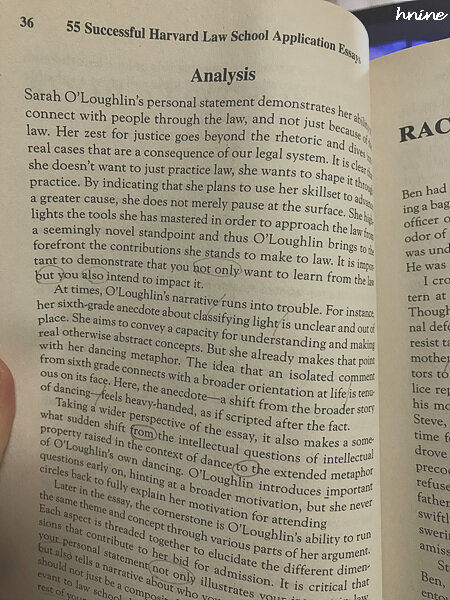
하버드 로스쿨 지원을 위해 쓴 자기 소개 에세이 (Personal statement) 55편과 그에 대한 심사평 모음집이다.
심사를 담당한 사람들은 하버드 대학 일간지인 The Harvard Crimpson의 Staff 들이다.
로스쿨 지원자들이기 때문에 대학은 이미 졸업을 하였거나 졸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인지 대학 지원을 목적으로 쓰는 Personal Statement보다 더 다듬어지고 구체적인 내용의 에세이였다.
지원자 에세이가 지원자의 이름 아래 약 두 페이지 분량으로 실려있고 바로 이어 한 페이지 정도로 심사관의 분석 평가문이 Analysis 라는 제목으로 뒤따르는 구성이다.
예상은 했었지만 읽는 내내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자기 소개서는 없었다. 어떤 글은 한편의 소설 같았고, 어떤 글은 영화의 한 장면 처럼 생생하게 시작하여 진행도 영화같이 흘러갔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하든 모든 에세이의 결말은 하나였다. 내가 여기 (하버드 로스쿨)에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를 분명히 하고 맺는 것. 또한 시작을 끝과 연결시키는 것.
그런데 정작 55편을 차례로 읽어나갈수록 감탄은 지원자의 에세이보다 심사관의 분석글로 더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충실하고 정성스런 조언의 글이 있을까. 네 글이 어디가 잘되고 어디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닌, 그야말로 건설적인 조언이란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는 평가글이었다. 이런 에세이에 꼭 필요한 사항들이 무엇인지 상기시키면서 그런 면에서 이점은 아쉬웠고 이점은 너무 지나쳤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해놓았다. 평가문, 심사평이라기보다 글 읽은 소감이라고 해야하나. 그러기엔 촌철살인의 대목이 많기는 하다.
몇가지 기억해둘만한 조언이 담긴 문장들을 옮겨본다.
1. Use your personal statement to say what the rest of your application cannot. (36쪽)
(너의 자기소개글이 네 지원서의 다른 서류들이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게 이용해라.)
2. For applicants struggling to communicate their reason for applying to Harvard Law School, an anecdote may be the answer. Instead of talking about yourself, let the story speak of you. (45쪽)
(하버드 로스쿨에 지원하는 이유를 전달시키려고 애쓰는 지원자들에게 있어 하나의 일화를 보여주는 것은 그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너에 대해 얘기하려 하지 말고, 그 이야기가 너에 대해 이야기하게 하라.)
3. It can be difficult to portray confidence without coming off as fake. (48쪽)
(가식으로 끝나지 않으면서 자신감을 표현하기란 어려울 수 있다.) - 지원자가 이런 위험을 피해서 잘 썼다고 칭찬하는 대목
4. Without simply presenting a laundry list of accolades. (96쪽)
(자화자찬 목록으로 도배하지 말것이며,)
제일 자주 언급되는 조언은 resume (이력서)에 있는 사항들을 굳이 Personal Statement 에 반복할 필요없다는 것이다. 그러는대신, resume에 드러낼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사용하라고 한다.
에세이의 형식이나 구성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대신 하나의 단어나 문구의 정확도에 대한 지적은 날카로왔다.
예를 들어 한 지원자가 자기가 법학에 끌리는 이유를 쓰면서 It celebrates difference making. 이라고 했기에 나는 멋진 표현이라고 밑줄까지 치고 넘어갔는데 바로 다음에 심사관은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difference making 같은 nebulous concepts (막연한 개념) 은 좀더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써놓았다. 어떤 형식, 어떤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글의 목적과 읽는 대상을 잊으면 안된다는 일침이다.
목적상 내용이 분명하고 잘 다듬어진 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읽기 어렵지 않다.
내가 당장 자기소개서를 쓸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버드 로스쿨은 더구나 아니다. 그럼에도 글쓰기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책이다. 보너스로서, 요즘 자주 쓰는 어휘나 표현도 감을 잡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글쓰기란 논리가 작용해야하는 과정임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