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프로이트의 여동생
고체 스밀레프스키 지음, 문희경 옮김 / 북폴리오 / 2013년 12월
평점 : 
절판

《프로이트의 여동생》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누이 중 '아돌피나'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이야기는 나치 독일시대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의 희생양이 된 네 자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첫째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네 자매가 살았던 오스트리아 비엔나.
독일군이 점령해 오스트리아를 떠나려면 출국사무소에 신고해야 하고 실제로 비자를 받아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제법 학계에 유명인사였던 지그문트는 비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같이 데려갈 가까운 사람들 명단에 누이들은 없었다. 그의 가족은 물론 처제, 주치의 가족, 가정부, 심지어 강아지 요피까지 포함했으면서도...... 유대인 지구에는 로자, 파울리나, 마리, 아돌피나 네 자매가 남아있게 된다. 런던으로 간 오빠 지그문트는 이내 사망하게 되고, 네 자매는 유대인에게 내린 규제령속에서 두려움을 안고 사는 법에 익숙해졌다.

그리고......1942년 죽음의 수용소행.
그 과정에서 작가 프란츠 카프카가 생전에 아꼈던 누이동생 오틀라 카프카와의 짧은 인연도 가지게 되지만 어린이 호송열차의 호송인으로 자원한 오틀라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이내 네 자매도 죽음이 코앞에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구스타프 클림프의 <죽음과 삶> 작품이 실린 이 소설의 표지, 매 챕터마다 앞부분에 실린 뒤러의 <멜랑콜리아> 작품은 삶과 죽음, 삶의 그림자, 우울을 나타내고 있어 격정의 세월을 홀로 외롭게 살다 간 아돌피나의 삶과 무척이나 닮아있다. 소설 《프로이트의 여동생》은 프로이트 가족사는 물론 아돌피나와의 인연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문제, 철학적 문제를 다루고 있어 그저 실화를 바탕으로 한 흥미 위주의 스토리가 아닌 삶, 사랑, 모성애 등에 관한 의미를 끄집어내고 있어 묵직한 소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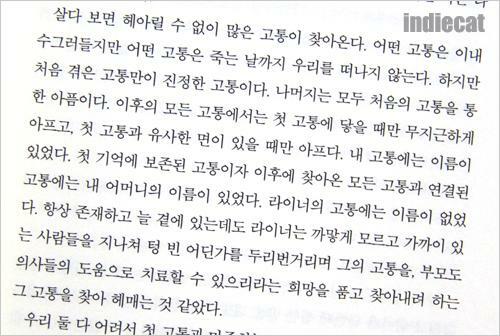
"널 낳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존재하지 않으니만 못한 지긋지긋한 현실에 대한 미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미움,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는 '엄마'라는 존재는 아돌피나에게 가장 아픈 상처다. 무슨 죄를 지은 지도 모른 채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아돌피나.
'오빠는 이성과 감정이 교차하는 지점에 그 비밀이 암호처럼 숨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오빠는 생각과 감정 모두 인간의 본성을 이룬다면서 두 가지가 '협력'해야만 한 인간이 자기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등 지그문트가 인간의 정신에 관해 빠져드는 과정도 그녀의 시선으로 이야기한다.
미술 수업으로 만난 아돌피나와 동갑인 구스타프 클림프와의 인연은 구스타프의 누나 클라라 클림프와의 오랜 인연으로도 이어진다. 그녀와는 여성의 권리에 관한 대화가 주를 이루는데 세상과 시대가 허락하지 않는 권리 쟁취에 관한 노력을 해 온 클라라는 결국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정신병원으로 들어간다.
사랑하는 연인 라이너와의 만남, 그의 자살, 그의 아이를 지우게 되는 일은 아돌피나가 더더욱 세계와 대화의 밖에 머무는 존재로 남아있게 한다. 항상 결핍되어 있었고 이런 결핍과 부족, 공허함 때문에 무력해진 아돌피나. 어린 시절의 절망에서 시작한 통증은 현재까지도 이어진다. 사랑과 미움이 커질수록 절망은 깊어질 뿐이었다.
『나는 거울을 피해 다녔는데 뒤러의 판화 한 점을 볼 때마다 나와 마주하는 느낌이었다. (중략) 살아야 하나, 죽어야 하나? 판화에서 그늘 속에 파묻혀 흰자위를 반짝이는 얼굴에 떠오른 질문이다. (중략) 뒤러의 멜랑콜리아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듯한 질문인 '살아야 하나, 죽어야 하나?'라는 질문을 나에게 나의 존재를 묻는 질문이 되었다. 나는 내 안의 어둠이 던지는 그 질문을 거울을 피해 다니듯이 피하고 싶었다. 』 - p139-142
『 어느 한순간에 잃어버린 건 두 번 다시 돌려받지 못해. 잃어버린 그것이 사라진 순간에 필요했던 거니까. 그러니 우리가 죽고 다른 세상에서 다시 산다고 해도 다른 세상에 사는 존재는 그저 위안일 뿐일 거야. 어차피 물질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부당하고 사후에 우리가 다른 현실에서 어떤 위안이 되는 존재로 계속 살아갈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은 세상의 아름다움이야. 』 - p155
『 살아있으니까 아픈 거야. 다 지나갈 거야. 』 - p161
스스로 정신병원으로 들어간 아돌피나는 원장 괴테 박사와 우울증, 정상과 광기의 구분 등 인간 본질과 정신에 관한 대화를 나눈다. 바깥세상에서 도망쳐 들어와 정신병원이란 감옥에서 오히려 자유를 얻는 아돌피나. 7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온 아돌피나는 모녀의 쓰디쓴 기억과 미움을 삼키지만, 그녀의 모습은 절망으로 가벼워진 영혼의 무게만큼이나 공허해 보인다.

참 외로운 사람이다.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사람처럼, 여기도 없고 저기에도 없는 사람처럼,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사람...아돌피나의 이야기는 단지 한 여성의 삶 외에도 인간 존재의 철학적 의미,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어 진중하고 가슴 아린 느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