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첫째 날(9월 27일 수요일). 홍대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숙소로 정했다. 숙소 역시 열차 예매표와 같이 화요일에 예약했다. 다행히 수요일 1인실 방 하나 있어서 예약할 수 있었다. 단점이라면 게스트하우스가 식당과 술집들이 모인 골목 근처에 있다는 것이다. 내 방 바로 옆에 밤새도록 네온사인 빛을 뿜어대는 술집이 있었다. 젊음에 취해 왁자지껄 떠드는 사람들의 소리가 내 방의 작은 창문을 뚫고 들어왔다. 어쩔 수 없었다. 홍대 게스트하우스가 수요일 저녁에 가야 할 곳과 그리 멀지 않은 위치에 있었다. 책이 가득한 가방을 방에 내려놓고, 망원동에 있는 ‘칵테일 바’로 향했다.

내가 간 곳은 술 마시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책 바>(Chaeg Bar)다. <책 바>는 연희동에 처음 터를 잡은 칵테일 바였고, 올해 망원동으로 옮겼다. 이곳을 이용하려면 예약해야 한다. 나는 혼자서 조용히 책 읽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사적인 좌석 1인’을 예약했다. 이용 시간은 2시간이다. 저녁 7~9시 이용 좌석과 9시 30분~11시 30분 이용 좌석이 있다. 나는 9시 30분~11시 30분 이용 좌석을 선택했다.


‘사적인 좌석’은 3면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정면에 보이는 벽에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의 그림 <빛의 제국>이 나를 환대했다. 책상 오른쪽에 로트레크(Lautrec)의 그림 <침대>가 벽에 기대어 자고 있었다.

<책 바>에서만 마실 수 있는 각종 술과 칵테일 이름은 술을 사랑했던 작가와 유명 소설 제목에서 따왔다. 내 혀를 첫 번째로 적신 술은 ‘달과 6펜스’다. 화가 폴 고갱(Paul Gauguin)의 삶을 모델로 한 서머싯 몸(Somerset Maugham)의 소설 제목이다. 술이 된 ‘달과 6펜스’는 순한 맛이 나는 압생트다. 도수는 6%다.

두 번째로 맛본 술은 ‘대도시의 사랑법’이다. 박상영의 소설 제목이기도 하다. 도수 9%의 테킬라 칵테일이다.


세 번째 술은 녹색 빛이 나는 ‘압생트’다. 앞에 마신 술들은 혀의 취기를 돋기 위한 애피타이저다. 작가와 예술가들은 입에 술 내음이 날 정도로 압생트를 찬양했다. 도수가 엄청 강한 술로 유명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압생트를 유명하게 만든 건 압생트의 주재료인 향쑥의 독성 성분이다.

<책 바>가 제조한 압생트는 도수 18%로 꽤 높지만, 몸과 정신 건강에 해로운 옛날 압생트를 똑같이 재현한 술은 아니다. 압생트는 원래 향쑥 특유의 쓴맛이 강하게 난다. 압생트의 독한 맛에 혀가 화들짝 놀라면 달래주기 위해 안주로 닭튀김과 방울토마토를 주문했다. 하지만 안주가 없어도 되었다. 내가 마신 압생트는 혀를 안심시키는 보드라운 허브 맛이 났다. <책 바> 압생트가 너무 좋아서 앞에 마신 술맛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사실 안주 없이 압생트 한 잔 더 마시고 싶었다. 아쉽게도 시곗바늘이 11시 10분을 가리키면서 내게 술을 음미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넌지시 알려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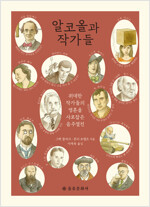
* 그렉 클라크, 몬티 보챔프 공저, 이재욱 옮김 《알코올과 작가들: 위대한 작가들의 영혼을 사로잡은 음주 열전》 (을유문화사, 2020년)
[책 소개] 책은 포도주, 맥주, 위스키, 압생트 등 여러 종류의 술의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시작한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술꾼 작가들의 술과 관련된 어록과 일화다.
19세기 중반 유럽에 압생트가 유행했는데 이 술을 즐겨 마시면 환각을 일으키고, 신경이 손상되는 부작용이 일어났다. 작가와 예술가들은 창작을 위해 압생트의 환각 효과를 이용했다. 그들은 압생트의 녹색 빛에 매료되었다. 그래서 압생트를 음미하는 순간을 ‘녹색 빛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다. 애주가인 프랑스의 시인 폴 베를렌(Paul Verlaine)은 압생트를 ‘녹색 빛 요정’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로트레크는 파리의 카바레 물랭루주를 놀이터로 삼아서 활동했다. 로트레크의 친구들은 유흥가에서 일하는 여성이다. 그녀들은 무희, 술집 종업원, 매춘부가 되어 근근이 살아갔다. 술 역시 로트레크의 친한 친구다. 로트레크는 어린 시절에 두 다리를 크게 다쳐 장애인이 되었다. 그의 몸집은 상당히 작았고, 지팡이 없으면 걸을 수 없었다. 지팡이의 속은 비어 있는데, 그 안에 압생트가 담긴 유리병이 있었다고 한다.

* [절판] 알렉상드르 라크루아, 백선희 옮김 《알코올과 예술가》 (마음산책, 2002년)
[책 소개] 이 책의 ‘예술가’는 작가, 화가, 음악가를 아우른다. 당연히 《알코올과 작가들》에 소개된 술꾼 작가들이 《알코올과 예술가》에도 나온다.
과연 술에 일절 입에 담지 않은 작가와 예술가가 있을까? 분명히 있기 한데, 금주가로 유명한 작가와 예술가가 단 한 명도 생각나지 않는다. 솔직하게 말하면 잘 모르겠다. 술을 즐겨 마시고, 술을 사랑한 작가와 예술가는 수두룩하다. 《알코올과 예술가》 서문의 첫 문장을 빌리자면, 문학과 예술은 술에 절여 있다. 술꾼 작가들은 술에 취할 때마다 하얀 종이 위에 글 한 편을 토해냈다.
미국의 소설가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는 자신이 일할 때 필요한 도구는 ‘펜, 종이, 음식, 담배 그리고 약간의 위스키’라고 말했다. 포크 너, 뭘 좀 아네.

나는 일할 때 책, 노트북, 음식 그리고 술이 있으면 된다. 한 주의 마지막 평일인 금요일이 지나가고, 이어서 조용히 찾아오는 토요일 새벽에 책을 읽거나 글을 쓸 때가 좋다. 새벽에 재미있는 일을 하기 전에 야식으로 막걸리를 반주 삼아 돼지국밥을 먹는다. 글 한 편 다 쓰고 나면 피곤함을 쫓아내기 위해 시원한 맥주를 마신다. 취기가 적당히 올라와서 컨디션이 좋으면 책을 더 읽는다. 나는 ‘주책잡기(酒冊雜記)’의 달인이다. 술 마시면서 책을 읽고, 잡문(雜文)을 쓰는 밤은 달짝지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