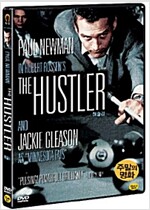
해가 짧아졌다. 하지가 지난지도 한달이 넘었으니 당연하다. 전에는 5시만 되어도 날이 밝아 오려고 했지만 지금은 아직도 어둑하다. 저녁에도 8시 정도까지만 해도 해가 살아있었지만 지금은 완전 밤이다. 하지만 잘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밤이고 낮이고 날씨가 더우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면 실감하겠지. 그래도 며칠 전부터는 열대야라도 잘만하다. 그렇게 가을은 아주 천천히 오고 있는 거겠지.
얼마 전 월테 테비스의 소설 <허슬러>를 읽었다. 읽기 시작하면서 영화도 보았다. 여기서 주의 해야할 것은 선택을 잘 해야한다는 것. 지금까지 동명의 영화는 세 번 정도 만들어 졌다. 내가 본 건 폴 뉴먼이 나왔던 오리지널 영화다. 폴 뉴먼하면 로버트 레드포드와 함께 나왔던 <스팅>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영화는 <스팅>만 못하지 않나 싶다.
내가 영화를 볼 생각을 했던 건 책을 잘 이해하고 빨리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본 건데 중간 정도만 원작과 비슷하게 나가지 결말은 좀 다르다. 개인적으로 영화가 좀 불만스러웠다. 특히 주인공 에디의 애인 새라의 설정이 마음에 안 든다. 새라를 금발에 나중에는 자살한다는 설정은 좀 극단적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 영화가 1961년도 산인 것을 감안한다면 감독이 왜 금발의 배우를 기용 했는지 이해할 것도 같다. 그때는 금발의 전성 시대였으니까.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마를린 먼로는 금발에 백치미로 유명했고 그녀가 이루어 놓은 이미지 때문에 이 영화에서도 그 이미지를 반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추측해 본다. 그런데 왠지 그게 석연치가 않다. 여자를 완전 호구로 그랬다는 것. 책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 좀 더 당당하고 자율적인 인간으로 그렸다. 영화가 꼭 원작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는 하지만 엇나가도 너무 엇나갔다 싶다.

아무래도 올림픽 특수 때문일까? 오랜만에 프랑스 영화 한 편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딱 걸렸다. <장미의 이름>, <티벳에서의 7년> 등으로 유명한 장 자크 아노 감독이 언제 또 이런 영화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지난 2019년 노트르담 대성당에 화재 사건이 일어났다는 건 나도 알고 있었는데 이걸 영화화 했다니 좀 대단하다 싶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소방관과 성당 관계자들간의 활약상을 그렸다. 덕분에 이번 생엔 프랑스에 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노트르담 성당 내부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알게 되었다. 놀라운 건 그곳에 예수님이 쓰셨다는 가시관이 보관되어 있는데 알고 봤더니 모조품이라는 것.(이건 사실인지 영화적 상상인지 알 수가 없다.) 화재는 어느 개념없는 성당 관계자가 첨탑 어디쯤에서 버린 담배 꽁초와 역시 생각없는 비둘기 한 마리가 전선을 쪼다 일어난 것. 비둘기야 인간계가 아니니 원망하거나 나무랄 수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 그런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은 적어도 일하는 동안만큼은 금연하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처음엔 분명 화재경보기가 작동되지만 정말 화재가 난 건지 아닌지 반신반의하고 그렇게 우물쭈물한 사이 불은 자츰번져 간다. 역시 사람은 엄청난 사실일수록 설마하며 잘 믿고 싶어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성당의 첨탑까지 올라 가는 계단이 300개라는 것도 이 영화를 보고 새롭게 알았다. 그렇지 않아도 어느 나이들고 뚱뚱한 아저씨가 화재를 확인하기 위해 그곳을 헉헉대며 올라가던데 바로 거기에서만이라도 확인했더라면 더 빨리 진압을 했을 것이다. 분명 자기 옆에서 화재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데도 못 보고 올라 온 계단을 다시 내려간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육안으로도 화재가 났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야 비로소 소방관이 출동을 한다. 얼마 뒤 화재 현장에 도착하지만 긴 소방호스를 어깨에 매고 또 예의 300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건 보는 것만으로도 답답하고 안타깝다. 겉으로만 화려하고 웅장했지 워낙 오래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그런지 내부 골조는 다소 허술해 보이기도 한다. 유럽 사람들이 옛 건물에 대한 가치 보존 때문에 여간해서 손 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또 그런 생각이 화재를 더 키운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영화는 긴박하면서도 나름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긴 하는데 만일 우리나라 소방관이 저 일을 맡았다면 어땠을까를 생각을 해 보게도 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같으면 헬기부터 띄우지 않았을까? 영화가 뭐 하나가 빠졌다 했더니 헬기가 한 대도 안 떴다. 물론 나중에 우왕좌왕하다 드론을 띄우긴 하는데 그것도 적극 활용하지 않고 그냥 정찰을 위한 목적으로 한 번 띄우고 만다. 이미 화재에 드론이 사용된다고 들었는데 말이다.
영화가 약간은 클리셰가 있는데, 그런 영화에 꼭 사람 애간장을 녹이거나 전혀 뜬금없는 사람 꼭 있다. 예를들면 대피 명령이 떨어져 다들 성당 밖을 나가는데 엄마 손 잡고 대피한 아이가 돌연 엄마 손을 뿌리치고 다시 성당에 들어가 촛불 하나 더 밝히고(하나라도 꺼야할 때) 기도까지 하고 나오는 걸 어떻게 봐 줘야할지 모르겠다. 또 어떤 아줌마는 모두 성당의 화마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혼자 고양이가 지붕에 올라가 떨어지기 일보직전인데 구조를 요청하면서 안타까워 찔찔 울고 있다. 물론 그런 것을 통해 대비 효과를 주는 것이겠지만 약간의 짜증이 유발됐다. 그러고 보면 쟝 감독이 좀 옛날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그래도 존경스럽단 생각이 든다.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 우리나라도 숭례문이 불에 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지만 누구가 영화로 만들 생각은 못했다. 그냥 어느 술주정뱅이가 벌인 헤프닝 정도로 취급하는 분위기였다. 그나마 복원도 매끄럽지가 못해 잡음이 일었고.
개인적으로 영어를 제외하고 가장 아름다운 외국어를 뽑으라면 프랑스어고, 다음으론 이태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한 마디도 못하지만. 누가 우리나라 언어를 칭찬하던데 나쁘지 않지만 약간 각진 느낌이 있어서 난 그닥 좋은 줄 모르겠다. 딱딱 떨어지는 것으로야 일본어 따라갈 언어가 있나. 중국어는 너무 찡찡거린다. 다음 생이 있다면 프랑스인으로 태어나 보고 싶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림픽이 어느덧 내일이 폐막이다. 크게 이변이 없는 한 우리나라가 10위 안에서 드는 성적을 거두고 마무리를 지을 모양인데 230개국 중 그 정도면 상당히 잘 싸운 거라 여한은 없다. 그래도 사람의 욕심은 한도 없어서 이번엔 일본을 이기지 않을까 했는데 그 점은 살짝 아쉬움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