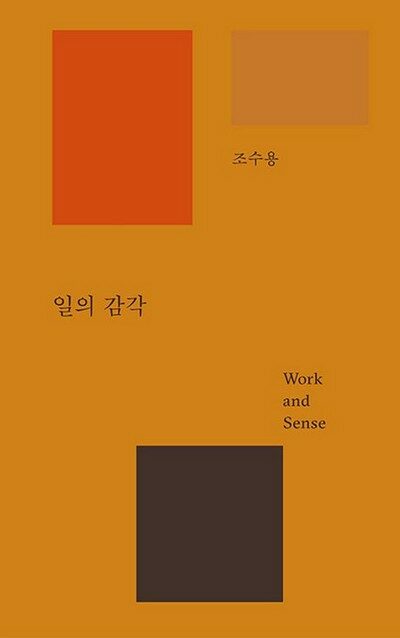-

-
일의 감각
조수용 지음 / B Media Company / 2024년 11월
평점 :



까칠읽기 . 숲노래 책읽기 / 인문책시렁 2025.6.28.
까칠읽기 78
《일의 감각》
조수용
B Media Company
2024.11.10.
“일의 감각”이라고 하면 우리말이 아니다. 우리말로는 ‘일결’이나 ‘일느낌’이나 “일하는 결”이다. ‘일빛’이나 ‘일매무새’나 ‘일새’나 ‘일느낌’이나 ‘일늧’이라 할 수도 있다. 《일의 감각》을 읽는 내내 ‘지기’가 아닌 ‘오너(owner)’라는 자리와 벼슬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줄거리를 느낀다. 글쓴이가 ‘오너’로 오래 일하는 터라 스스로 선 자리에서 말할 수밖에 없기는 하겠는데, 이 책을 누가 읽으라고 썼는지 모르겠다. ‘지기(오너)’라는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읽으라고 썼을까? ‘지기를 따르는 밑자리 일꾼’이 읽으라고 썼을까? 또는 ‘지기’로서 돈과 이름과 힘을 거머쥔 글쓴이가 여태 걸어온 길을 자랑하거나 내세우려고 썼을까? 글쓴이만큼 거머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면 나처럼 돈도 잘 벌고 이름도 날리고 힘도 쥘 수 있어!” 하고 가르치려고 썼을까?
일터를 이끄는 사람을 보면 하나같이 매우 바빠 보인다. 일터지기 가운데 집안일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좀처럼 못 보거나 거의 못 본다고 할 만하고, 아예 없다고 해도 될 만하다고까지 느낀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일터지기뿐 아니라 ‘수수한 일꾼’마저 일터에서 힘을 다 쏟아내느라 지쳐서 집안일을 할 몸이 아니다. 지치고 고단해서 손전화를 톡톡 눌러서 시켜먹기 일쑤요, 설거지를 손으로 하는 일도 드물며, 솥밥을 날마다 손수 지어서 누리는 사람도 그야말로 드물다.
이뿐 아니다. 이제 어린이와 푸름이는 밥차림을 아예 모르다시피 한다. 집에서는 으레 엄마가 다 차려주고, 배움터에서는 모둠밥(급식)을 받는다. 오늘날 어린이와 푸름이는 ‘설거지’라는 낱말조차 잊어버릴 판이다. ‘수세미’라는 낱말도 잊어버릴 수 있다. ‘비’와 ‘걸레’를 손에 쥘 일이나 틈조차 없다고 할 만하다.
일터지기라면, 언제나 밑바닥부터 일하는 사람일 노릇이라고 본다. 일터지기라면, 맨 먼저 할 일이란 누구보다 일터에 일찍 나와서 빗자루를 쥐고서 마당부터 쓸 노릇이라고 본다. 골마루도 쓸고, 걸레를 빨아서 미닫이도 닦는다면 더욱 알뜰하다. 일터지기란 일터사람한테 ‘일빛’을 몸소 보이는 사람이게 마련이라, 비질과 걸레질부터 아침에 보여주면서 가볍게 수다로 하루를 열 노릇이라고 본다.
일터는 온힘을 쏟아낼 곳이 아닌, 알맞게 힘을 기울여서 일을 함께 맡고서, 이제 저녁에 집으로 느긋이 돌아가서 “집살림을 사랑으로 가꾸는 힘을 기쁘게 쏟도록 북돋우”는 자리일 노릇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일터지기(오너)라는 자랑이 너무나 넘실대는 《일의 감각》은 누구한테 읽히려고 쓴 책인지 도무지 모를 노릇이다. 이렇게 꾸미고(디자인), 저렇게 덧입혔다(구상·재현)는 여러 열매를 보여주는 줄거리는 안 나쁘되, 이런 열매를 왜 누구한테 보여주려는 마음인지 아리송하다.
부디 빗자루와 수세미를 쥐기를 빈다. 마을 한켠 작은책집으로 마실을 뚜벅뚜벅 다니면서 날마다 새롭게 작은책 한 자락으로 삶을 돌아보는 이야기를 누려 보기를 빈다. 어린이하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어진 마음을 찾아나서 보기를 빈다. 굳이 자꾸 영어로 씌우지 말고, 어린이 눈높이를 헤아리면서 어린이 마음밭을 일구는 길에 이바지할 쉬운 우리말결을 찾아보기를 빈다.
+
《일의 감각》(조수용, B Media Company, 2024)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 어떻게 그렇게 여러 길을 쌓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 어떻게 그렇게 여러 발걸음을 쌓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20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매 순간 정말 운이 좋았다는 겁니다
→ 늘 길이 잘 풀렸다고만 생각합니다
→ 언제나 술술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20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집념을 가지고 노력한 적은 없습니다
→ 꼼꼼히 그려서 이루려고 마음을 다한 적은 없습니다
→ 차곡차곡 꿈을 세워서 이루려고 용쓴 적은 없습니다
20
모든 일에는 오너가 있기 마련입니다
→ 모든 일에는 기둥이 있게 마련입니다
→ 모든 일에는 들보가 있게 마련입니다
→ 모든 일에는 지킴이가 있습니다
24
오랫동안 공을 들였다고 해도 그게 드러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 오랫동안 품을 들였다고 해도 이를 드러내면 안 되는 줄 알아야 합니다
→ 오랫동안 땀을 들였다고 해도 이를 드러내면 안 되는 줄 되새겨야 합니다
90
이 일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매일 고민해야 비즈니스의 본질이 드러나고, 그 결과 기획이 선명해져서 디자인 결정이 용이해집니다
→ 이 일을 왜 하는지 날마다 헤아려야 왜 돈을 버는지 드러나고, 어떻게 짜야 하는지 뚜렷해서 밑동을 그리기 쉽습니다
→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늘 돌아봐야 밑그림이 드러나고, 어떻게 꾸려야 하는지 또렷하니 쉽게 앞그림을 그립니다
141
그저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한 직장인이었고
→ 그저 가장 나은 길을 이루려고 애쓴 일꾼이었고
→ 그저 땀흘린 달삯쟁이였고
186
글 : 숲노래·파란놀(최종규). 낱말책을 쓴다. 《새로 쓰는 말밑 꾸러미 사전》,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말과 문해력》, 《들꽃내음 따라 걷다가 작은책집을 보았습니다》, 《우리말꽃》, 《쉬운 말이 평화》, 《곁말》, 《책숲마실》, 《우리말 수수께끼 동시》, 《시골에서 살림 짓는 즐거움》, 《이오덕 마음 읽기》을 썼다. blog.naver.com/hbooklove